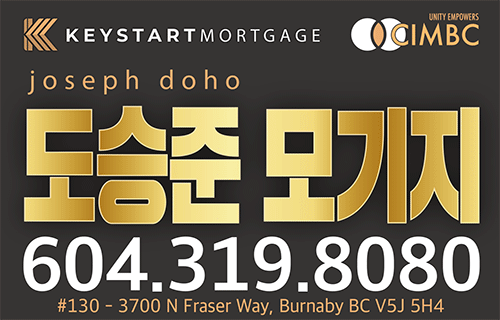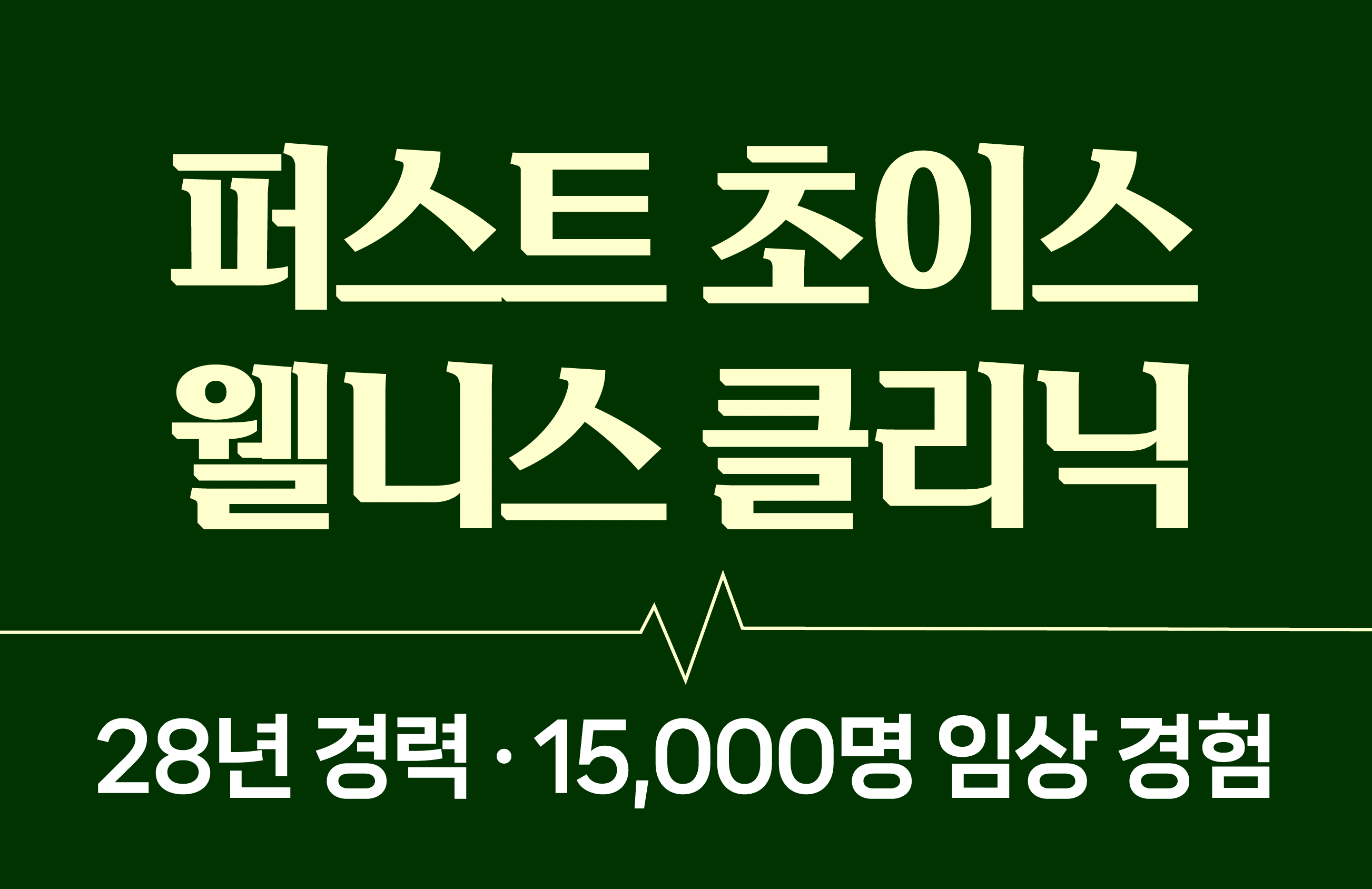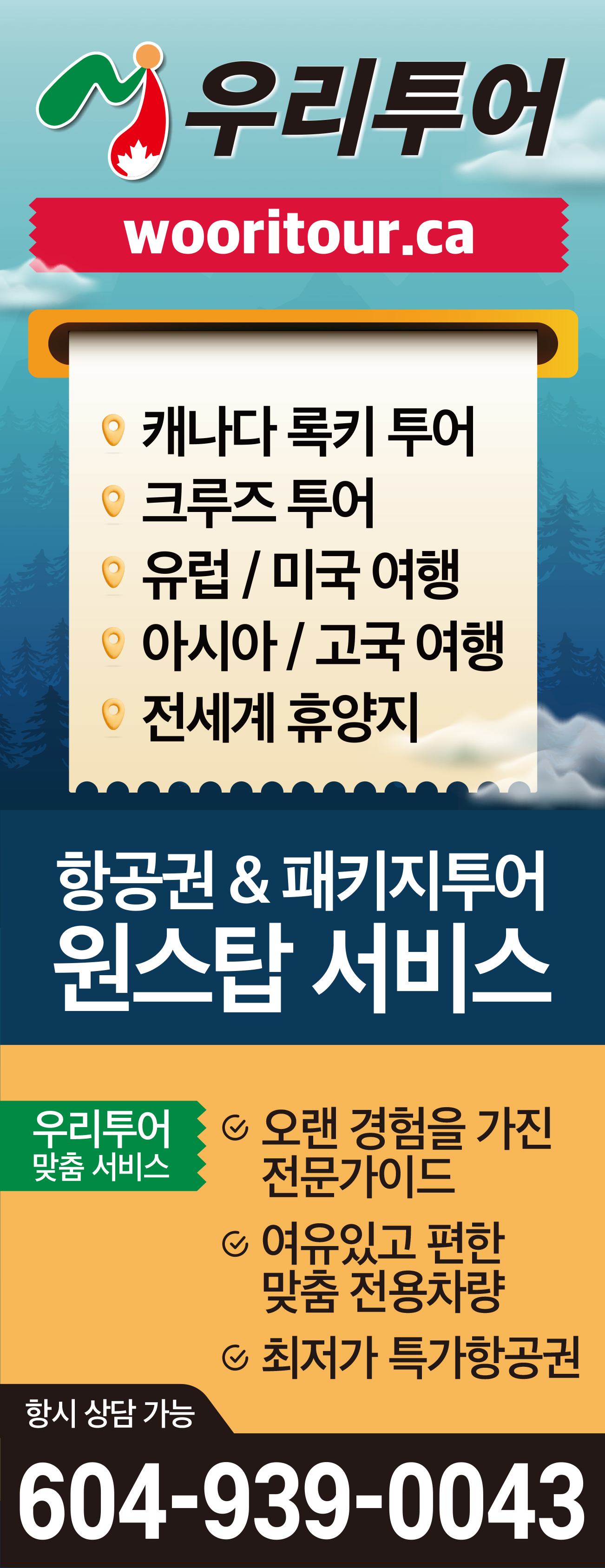허정희 / (사)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눈 내린 도시는 숨을 죽인 듯 고요하다. 일 년에 한두 번 내리는 눈은 계절의 흐름을 잊지 않게 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눈에 덮여 서서히 윤곽을 잃어가고, 햇살은 구름에 가려 흐릿한 시간 속으로 스며든다.
평일인데도 주말처럼 느슨한 오전이었다. 커피를 내리고 시아버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적막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단단하고 낯선 기운이 가슴을 눌렀다. 조심스레 스위치를 켰지만, 희미한 불빛만이 방을 밝혔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늘 자리하던 온기는 사라진 채 냉기만 남아 있었다. 열린 방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낯선 공기가 빠르게 흘렀다. 서둘러 방을 나와 문 앞에 놓여있던 신발장으로 달려갔다. 아버님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바깥 기온은 영하로 내려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묘한 불안이 일었다.
급히 위치 추적기를 켜고 남편을 깨웠다. 치매가 시작된 아버님을 대비해 우리는 서로의 휴대 전화에 위치를 공유해 두었다. 차를 운전할 때 남편은 나보다 내비게이션의 말을 더 잘 들었고, 사라진 시아버님을 찾아야 할 때는 내 직감보다 위치 추적기를 더 믿었다. 둘은 위치 추적기 움직임에 온 신경을 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가 멈춘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다. 두꺼운 외투를 챙겨 서둘러 나설 채비를 했다.
쿵ㅡ.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시아버님이 서 계셨다. 잠옷 차림에 낯선 모자를 쓰고 있었다. 순간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다가섰다. 이 추위에, 아무 말 없이, 왜 여기 계신 걸까. 두려움과 안도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내 목소리가 긴 복도에 흩어졌다. “아버님, 이 모자는요?” 내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애야, 이 모자를 쓰면 천 리 길도 갈 수 있단다.”라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했다. 해마다 왜소해진 그의 얼굴이 헐렁한 모자 밑으로 파묻혔다. 짧아진 숨을 고르는 그의 숨결이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나는 그제야, 그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음을 느꼈다. 모자가 빌려 쓴 것처럼 기울어졌다. 벗어놓은 모자에서 손끝으로 전해오는 거친 질감이 아버님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은 고요한 피로가 번져 있었다. 모자 밑으로는 붉은 핏줄처럼 살아 있는 시간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아버님은 피곤하시다며 “쉬었다 가세…”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시아버님이 늘 즐겨 쓰시던 것은 진초록 베레모였다. 모자의 안쪽에는 빛바랜 이름표와 영연방 마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참전용사 행사 때마다 그는 단정히 모자를 고쳐 쓰셨다. 세월이 흘러 함께하던 전우들이 하나둘 떠날수록, 모자는 기억의 조각이 되어갔다. 그에게 베레모는 젊은 날의 명예이자 삶의 증표였다. 모자에 달린 훈장의 색은 바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생의 열기가 숨 쉬었다.
모자에는 한국전쟁의 역사가, 그리고 한 인간이 지나온 세월이 묻어 있었다.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이 실처럼 엮여 있었고, 기억은 오래된 노래처럼 아버님의 삶 속에서 이어졌다. 전쟁의 기억은 먼 이야기로 남았지만, 모자를 쓰는 순간 그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는 듯했다. 6.25가 휴전된 지 어느덧 72년이 지난 지금도, 밤이 되면 모자 속의 기억은 그를 흔들었다. 꿈속에서는 적군의 총소리가 들리고, 전우의 아우성이 들려왔다. 낮이면 소리는 바람이 되어 거리를 헤맸다. 어디론지 알 수 없는 길 위로, 쉼 없이 힘차게 걸었다. 그의 뒷모습은 95세의 노인이 아닌, 그때 그 청년이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바라본다. 불빛이 비어 있던 거리를 채운다. 헛헛한 도시가 내 앞에 다가선다. 마음이 먹먹하다. 불 꺼진 방문 틈 사이로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가면 어떠하리, 저 세월. 가면 어떠하리, 이 청춘.
저 빛나던 날들도, 어둠 내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세'
그가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불 꺼진 도시의 어둠 속으로 흘러나왔다. 흐르는 노랫말처럼, 삶이 잠시 쉬어가는 듯했다.
시아버님의 베레모에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듯, 사람의 시간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는 것인지도 모른다. 진하기도 하고 흐릿하기도 한 무늬로, 저마다의 기억 속에 삶을 지탱하는 문양으로. 나는 그가 단정히 쓰던 모자를 떠올릴 때마다, 그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붙드는 의지를 잃지 않는 일임을 깨닫는다.
나는 문득, 내게 남은 나의 모자를 생각해 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낡아 가는 것들. 과거의 기억이 내 손끝에 스미듯 남아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 지나온 시간이 어른거린다. 세월이 흘러 나의 젊음도 어느덧 노년의 문턱에 서 있다. 이제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며, 특별한 것 없이 지내온 삶이 감사하다. 노년의 백발이 흩어질 때마다 바람을 맞아주는 모자를 상상해 본다. 내 모자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쌓인다.
조용히 베레모를 옷장에 걸어 두었다. 세월이 흘러 빛은 바래겠지만, 그 안에 새겨진 시간과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훗날 누군가 이 모자를 본다면, 그가 걸었던 길과 남긴 숨결을 떠올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가 걸어가던 뒷모습이 문득 그리워질 것이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허정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허정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