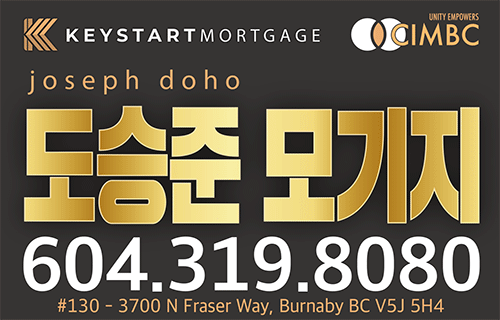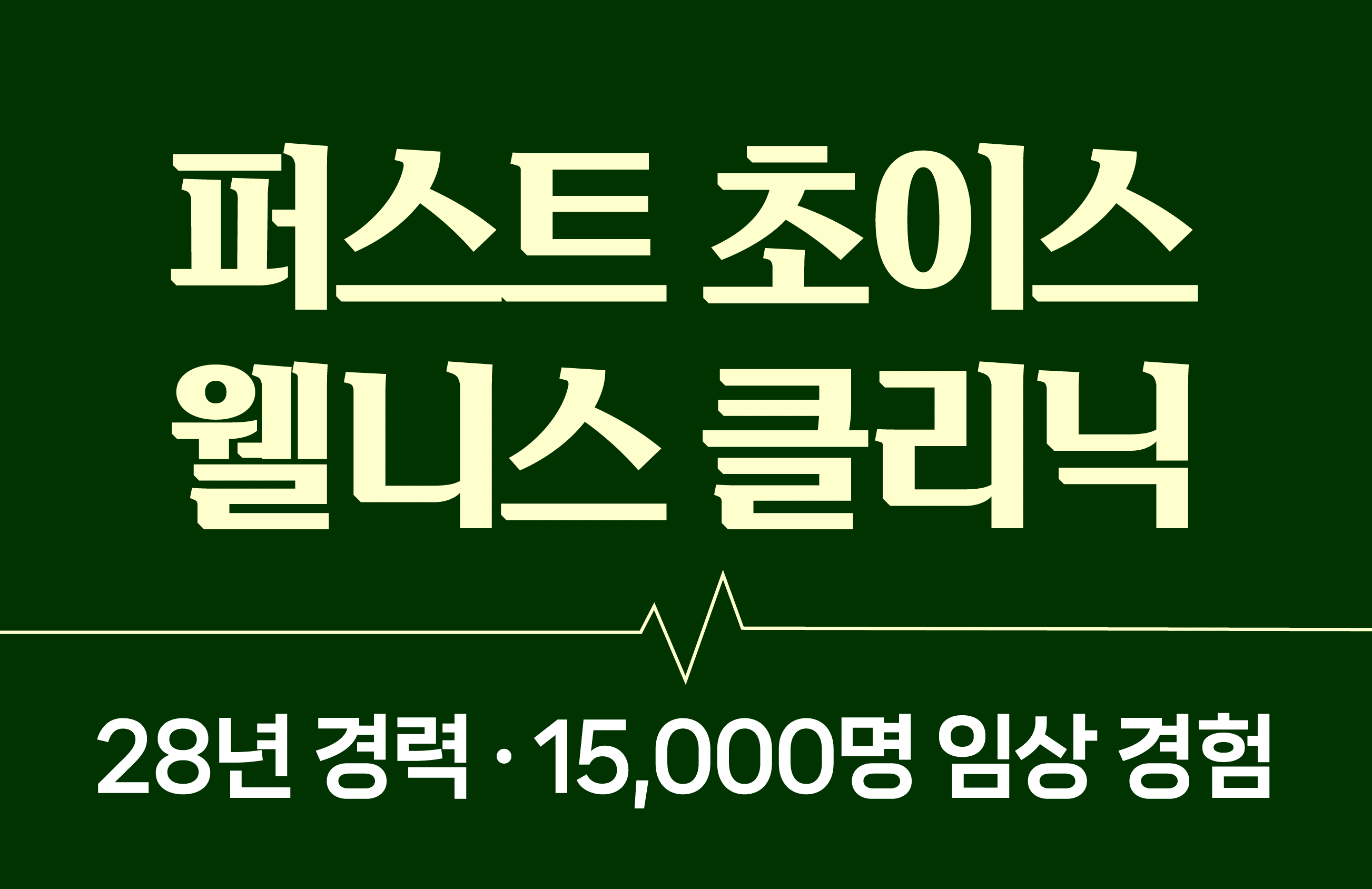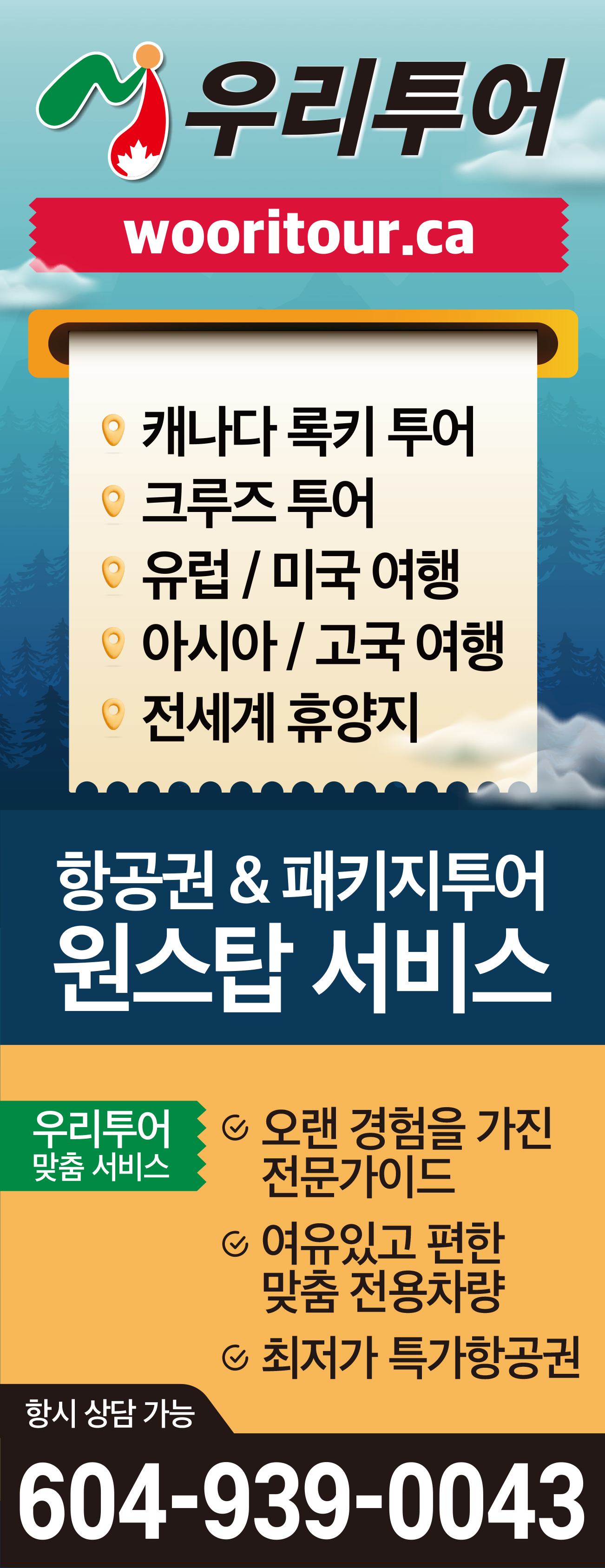민정희 / 사) 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가을빛 향연에 이끌려 길을 나선다.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는 단풍나무 숲을 지나 산책길 끝의 공원묘지로 향한다. 캐나다의 공원묘지는 삶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에도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나뭇가지 사이로 드리운 햇살과 잘 가꿔진 잔디와 꽃들 사이를 거닐며, 죽음 또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깨달음이 자연스레 스며들기 때문일 것이다.
‘툭’ 하고 단풍잎 하나가 어깨 위로 떨어진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를 몸으로 말하려는가. 주검은 땅속에서 잠들고 그 위에 초록빛 생명들이 살아 숨 쉰다. 그들이 세상에 다녀간 흔적은 동판위에 새겨져 있다. 이름 석자와 생애의 햇수. 그들 역시 먼 바다를 건너온 이들이었을까
부모님의 산소를 미국으로 옮기자고 했다. 미국에 사는 조카의 제안이었다. 가족 납골당을 마련해 후손들이 쉽게 찾아 뵙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었다. 경비와 수고는 자신이 맡겠다며 동의만 해 달라고 했다. 조부모를 생각하는 조카의 효심이 고맙고도 감동스러웠다. 어릴 적 엄마 없이 조부모님 손에서 자란 터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아이다. 다섯 오빠 중 세 분은 이미 미국에 묻혔고, 남은 오빠들도 사후를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그 제안이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편히 계시는 부모님을 굳이 바다 건너까지 모셔야 할지. 두 오빠도, 나 역시도 선뜻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이제 조카도, 나도 나이가 들었고, 부모님을 기억하는 이 또한 많지 않다. 묘지는 죽은 이의 집이기도 하지만, 산 이를 위한 기억의 집이 아닐까.
용인 산 중턱에 자리한 부모님의 묘소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친히 고른 장소였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오래도록 누워 계실 때, 아버지는 나를 앞세워 산을 오르며 묫자리를 보았다. 엄마를 묻고 그곳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전망이 좋구나" 하시던 아버지의 쓸쓸한 미소가 아직 눈에 선하다. 부모님의 묘소는 나에게 남겨진 유산의 실체였다. 명절뿐 아니라 마음이 허하거나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고향같이 찾아가곤 했다. 청주 한 잔 음복하고 북어를 뜯으며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던 그날, 가슴 속에 고이던 막연한 슬픔의 정체를 들여다보곤 했다. 슬픔의 감정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가랑비처럼 조금씩 몸을 적시며 그리움으로 스며들었다. 그곳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록새록 돋아나는 그리움의 뭉치를 풀어놓는 위무의 장소였다.
이민 온 후부터는 자주 갈 수 없었기에 문득문득 그곳에 남겨진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나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에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늘 그곳에 가 닿았다.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면 고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고, 내가 태어난 땅에 묻히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이국에 남겨둔 채 돌아간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예감이 마음을 눌렀다. 부모가 자식의 고향이라면 자식도 부모의 의지처가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에게 위안과 안식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뿌리가 되기로 했다.
토론토에 묘지를 마련했다. 아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정신적 수고를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그때만 해도 토론토를 떠나 타 주로 이사하게 되리라곤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딸아이는 시애틀로 떠났고 아들아이는 밴쿠버에 정착했다. 아들은 조만간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했다. 돌이켜보니 이민을 온 것도, 이십여 년간 살았던 토론토를 떠나 밴쿠버에 온 것도 내 의지보다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끌림이 더 컸다. 내가 살아온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차선의 방법일 때가 더 많았다. 흐르는 물의 줄기를 내 뜻대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마련했던 사후의 집이 부질없는 욕심이었음을 깨닫는다. 어차피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 결국 뿌리는 흙이 아니라 마음 속에 묻히는 것을. 어쩌면 아이들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삶에 족쇄를 채우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세계는 점점 더 가까워 지고 있다. 이제 어느 곳에 묻히든, 어떤 형태이든 더는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다가 가볍게 떠나리라. 사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쌓아 두고 아름다운 기억을 물려주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 아닐까. 죽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놓고 간 국화 한 다발에서 노란 그리움이 피어오른다. 남아 있는 이의 기억과 그리움 속에 있다면 그들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리라. 바쁠 일 하나 없다는 듯 거위들이 느릿느릿 걸어간다. 나 역시 상념을 털어내고 단풍잎 쌓인 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민정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민정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