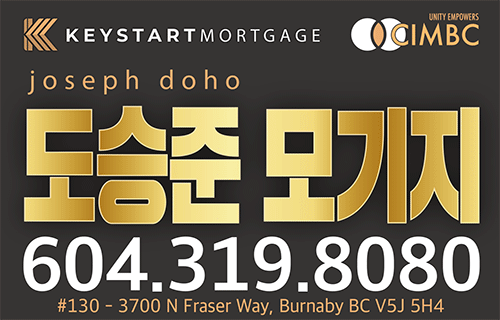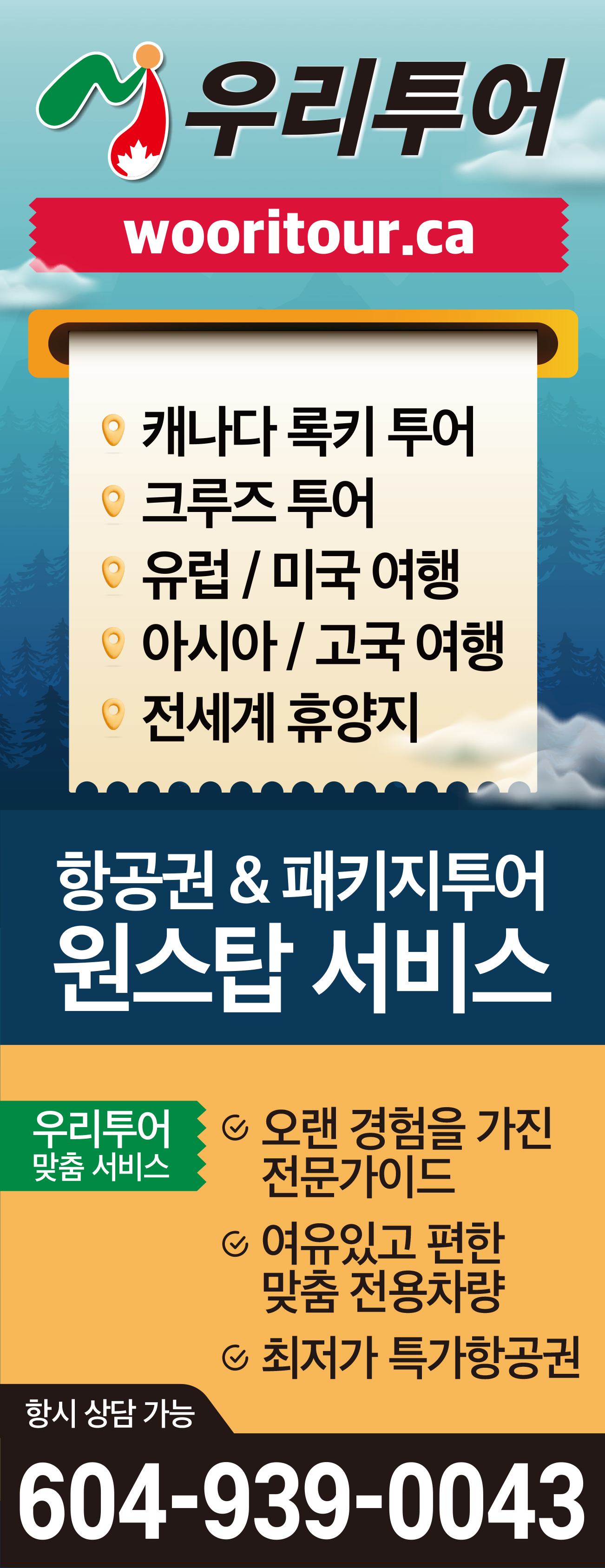박광일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여행은 언제나 기대와 설렘, 낯섦과 불안이 함께하는 여정이다. 페루의 쿠스코에서 한국에서 오는 일행을 만나기 위해 하루 먼저 출발한 나는, 여유롭게 호텔에 체크인하고 시내를 둘러보며 그들을 기다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행은 종종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밴쿠버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지연되며 계획은 엇나가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리마로 가는 연결편을 놓칠 위기에, 탑승 안내 직원은 일정을 변경해 주며 LA에서 하룻밤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수화물은 LA에서 찾아 다시 부치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LA 수화물 창구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짐은 나오지 않았다. 한 직원은 그것이 이미 리마행 LATAM 항공편으로 넘어갔다며 제3터미널로 가보라 했다. 그러나 그날의 LATAM 항공편은 이미 모두 떠난 뒤였고, 체크인 창구도 텅 비어 있었다. 돌아간 제자리에도 사람은 없었다. 결국 다음 날 아침에서야 짐을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리마를 거쳐 쿠스코로 향하는 길. 이번엔 매니저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짐이 쿠스코까지 가도록 해달라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하지만 쿠스코 공항의 컨베이어 벨트는 나의 짐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
영어를 못하는 공항 직원과 번역기를 통해 간신히 대화했다. 전화로 여기저기 확인하던 그는 결국 말했다. “가방은 리마에 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짐은 숙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공항을 나섰다.
새벽 1시. 공항 앞 풍경은 고요함과 불안이 뒤섞인 기묘한 분위기였다. 그 많던 사람도, 택시도 보이지 않았고 조명은 사물의 윤곽만 겨우 드러낼 정도였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도시, 공항 외부에선 와이파이도 닿지 않아 번역기마저 무용지물이었다.
공항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택시를 타야 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몇 번이고 손짓발짓을 반복했다. 다행히 그는 상황을 이해했고, 마침내 택시를 불러주었으며 공항 출입 철문을 열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공항 밖에 도착한 택시는 목적지까지 15달러를 요구했다. 나중에 보니 그 요금은 통상 요금의 세 배였다. 호텔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때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내려 함께 벨을 눌러주고 문을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공항 직원이며 호텔을 구하러 왔다고 했다. 그의 휴대전화로 호텔에 전화를 걸었고, 호텔 문이 열렸다. 호텔은 유럽의 집단주택처럼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 출입문을 닫으면 외부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호텔직원이 방이 없다고 하자 그는 떠났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야 택시는 조용히 떠났다. 나는 호텔 출입문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광장은 대낮처럼 밝고 경찰들이 있었지만, 골목길은 어둡고 사람의 그림자만 아득했다.
그 순간에는 무섭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찔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고요한 새벽. 호텔은 닫혀 있었고, 공항 직원이라던 남자의 정체도 의심스러웠다. 진짜 공항 직원이었다면 새벽에 방을 찾아 헤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 택시 기사가 나를 홀로 두고 떠났다면,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지 알 수 없다. 그는 바가지요금을 받았지만, 내게는 안전을 지켜준 ‘작은 불빛’이었다.
그날 밤, 내가 지급한 것은 단순한 교통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낯선 이의 책임감이자 배려였다. 언어보다 깊고, 돈보다 값진 것이었다. 나는 이방의 도시에서, 바가지를 쓴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켜준 한 사람을 만났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박광일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박광일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