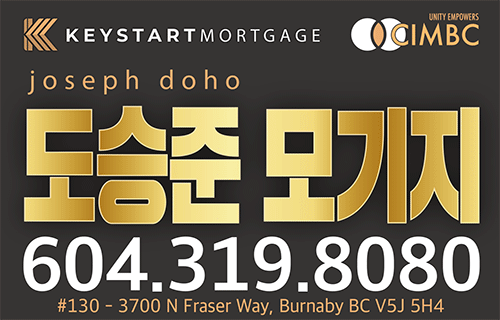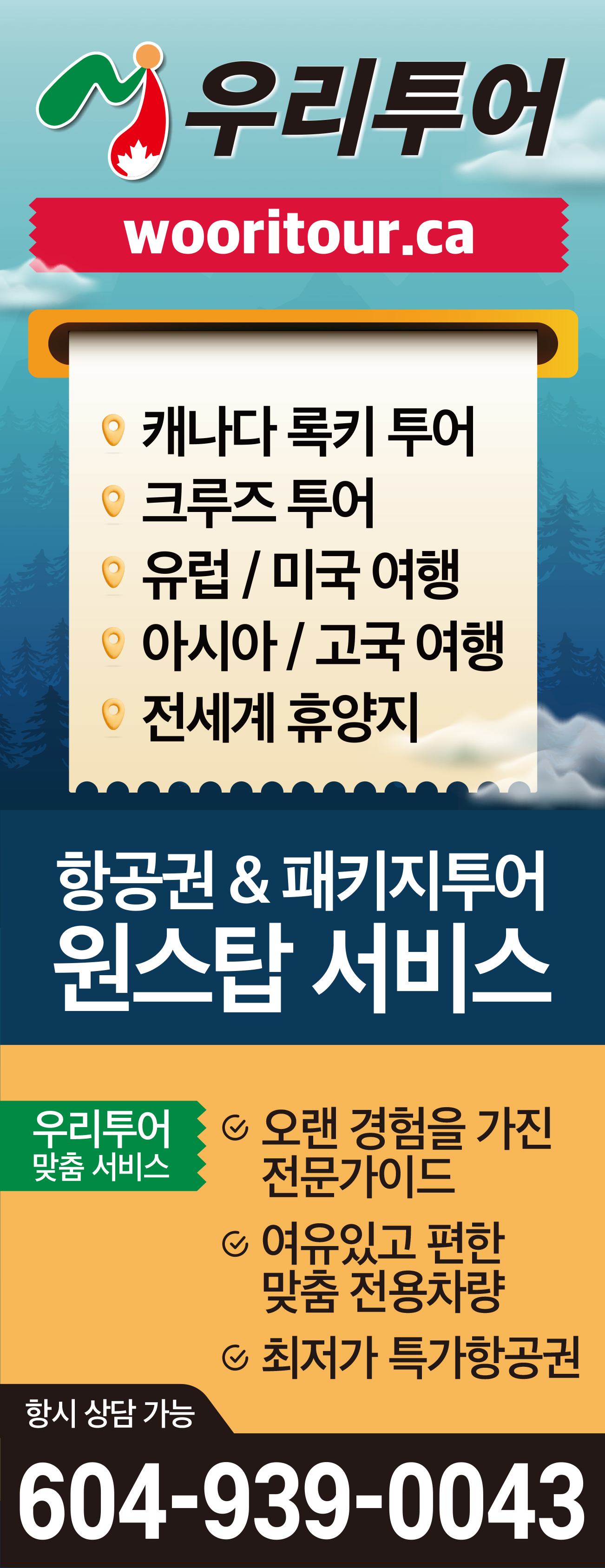심정석 (사)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나는 한국을 방문할 때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호텔 신세를 지곤한다. 강남보다는 강북에 있는 호텔을 선호한다. 강남은 남에 나라에 온 것 같아 낯설다. 그래서 강북에 머문다. 60년대 모습과 정감이 조금은 남아 있어 길 찾기가 편하다. 또 혹시나 내가 남긴 옛 추억하나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해서다. 50년대 후반 주경야독, 신문팔이, 고학시절, 자주 찾던 신문사들이 아직도 현존하는 광화문 근처에 머물고 있다. 석간 신문을 박아내는 우렁찬 윤전기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광화문 광장을 천천히 유람한다. “사랑하는 고국이여, 안녕하셨습니까!”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대한민국이 작금 겪고 있는 모두를 한데 아울러 읽을 수 있는 심장 고와도 같다. 오늘도 세종은 광화문 그 자리에 계셨다. 세종은 자비의 눈으로 내려다보시며, 미소로 말씀하신다. “우리말은 중국말과 달라 한자를 가지고는 잘 표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고유 글자가 없어서 문자생활이 불편하여 새 글자를 만드니 일상생활에 편하게 쓰라” 자비스러운 말씀의 소리가 북악에 메아리 쳐 내 귀에 와 닿는다.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든 세종이 오늘도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든 말이 아름답구나. 내가 만든 글자가 살아 있구나. 한글은 기술이 아닌 사랑이었단다. 그것을 기억한 너희가 참 고맙구나.” 한글은 시요, 사랑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축복이란다.” 하신다.
그런데 나는 산수(傘壽)를 넘겨 이제야 한글의 참 얼굴을 뵙게 되니 어찌 억울 타 아니하겠는가?! 나는 한글이 금해 있던 일제 강점기에 3학년까지 한글 문맹으로 자랐다. 8.15 해방 후에야 한글을 깨쳐 간신히 중학교 입학을 했다. 2개월도 채 못 채우고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후 피난 사리로 3년 반을 무학의 머슴애로 자랐다. 서울 수복 후 주경야독하며 검정 고시 덕으로 간신히 대학에 진학을 했다. 그것도 과학도의 길을 걸어왔다. 간신히 한글을 읽고 쓰는 수준, 한글의 참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대학 재학중 유학의 길이 열려 조국을 떠났다. 처음에는 몇 년 일 줄 알았던 떠남이 육십 년이 훌쩍 흘렀다. 영어권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모국어와 문자는 잊어 갔다. 이민자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생존과 적응이 우선이었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 믿었던 마음도 점차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라는 체념으로 바뀌어 갔다. 그렇게 한글은 내 일상의 언어가 아닌, ‘기억의 언어 ’로 녹슬어 있었다. 그러던 내가 한글을 다시 붙잡게 된 데는 아주 사소한 계기가 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외국인 친구가 어느 날 물었다. “한국어는 왜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까요? 글자는 그림 같고, 소리도 음악 같아요”.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다. 순간 나는 당황했다. 나는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에 대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 본 적도 들어 본 적도 없었다. 아니, 실은… 너무 당연해서, 깊이 생각해본 적조차 없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무언 가에 이끌리듯 다시 한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 어릴 적 당연하게 배우고 썼던 그 글자들이, 알고 보니 얼마나 과학적이고 정교하며, 동시에 미학적으로도 멋있는 문자였는지를!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天地人)의 원리를 담아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나는 어린아이처럼 흥분한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
한글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시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 다가와 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옛 친구처럼 말이다. 나는 다시 자음과 모음을 따라 써 내려갔다. ‘ㄱ’의 강직함과 ‘ㅇ’의 넉넉함, ‘ㅏ’의 단호함과 ‘ㅜ’의 온순함… 각 글자가 살아 숨 쉬듯 내 손끝에서 피어났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단어 하나를 써 내려갈 때마다, 내 안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문장으로 피어났다.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조국의 냄새, 어머니의 말투, 어린 시절 놀던 골목의 소리까지 담겨 있었다.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시도 써보고 싶었다. 오래된 일기를 한글로 다시 정리해보기도 했다. 그러다 문학 동호회를 알게 되었고, 문학인으로 글을 쓰는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 나는 한글로 마음을 쓴다. 영어로는 표현되지 않던 내면의 결을, 한글은 정확하고도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어 좋다. 예전에는 ‘I’m fine.’이라는 말로 덮어두었던 감정도, 한글로는 ‘괜찮은 척했을 뿐 이에요.’라고 솔직히 적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한글에 빠진 이유이기도 하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백발의 나이, 내 안의 언어는 다시 젊어졌다. 잊혔던 한글이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속에서 내 정체성과 뿌리를 새롭게 만난다. 마치 먼 길을 돌고 돌아 고향집 마루에 다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기분이다. 한글은 여전히 따뜻했다. 여전히 나를 알아보아 주었다.
지금 나는 매일 아침, 한 문장이라도 한글로 적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때론 짧은 시 한 편, 때론 그리운 이름 하나.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속삭인다. “한글아, 고마워. 나를 잊지 않아줘서.” 영어로 삶을 지탱하며 한글을 멀리하든 “한글 문맹자”, 88세에 한글의 맛에 푹 취해본다. 꼭 멋있는 글 하나 써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전하께 올리고 싶다. 나는 한글에 흠뻑 취해 춤 춘다고---
《 한글의 무도장 》
닷 소리, 홀소리/자음과 모음이 손잡고/첫 발을 뗀다.
ㄴ 은 조용히 팔을 들고/ㅏ 는 가볍게 허리를 감는다
그렇게 ‘나’ 가 된다.
소리 하나, 뜻 하나/춤추며 피어나는 글자들 /나도 거기서 한 걸음 내딛는다.
부끄러움은 접고/어눌함은 끌어안고/내 안에 한글이
비로소 춤을 추기 시작한다.
피천득 교수님 말처럼/“누에가 토해낸 실크 물/시어들이 나왔으면”
나도 내 마음의 누에가 되고 싶어.
한 글자 한 글자/정성으로 뽑아 낸/내 삶의 실크 물로
내 남은 삶/명주 같이 부드러운 시 한편 짜 보고 싶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심정석의 다른 기사
(더보기.)
심정석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