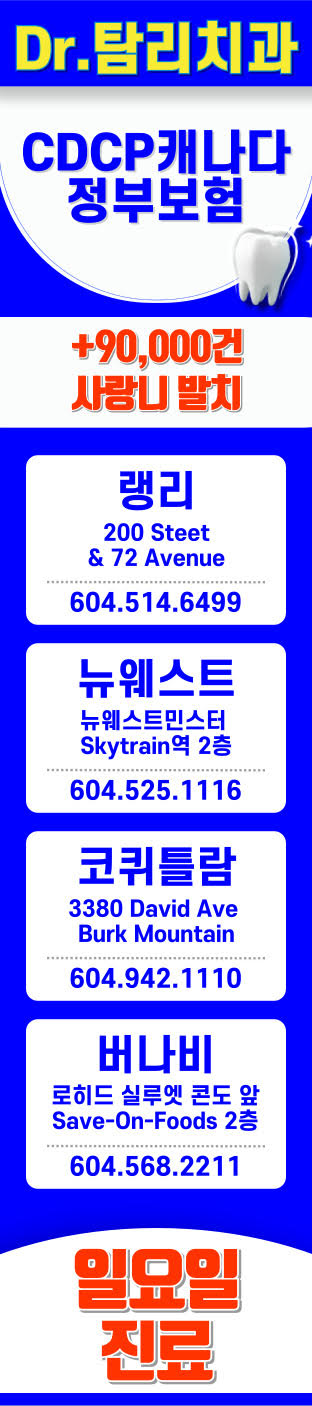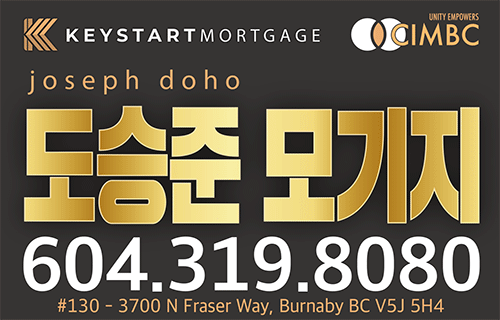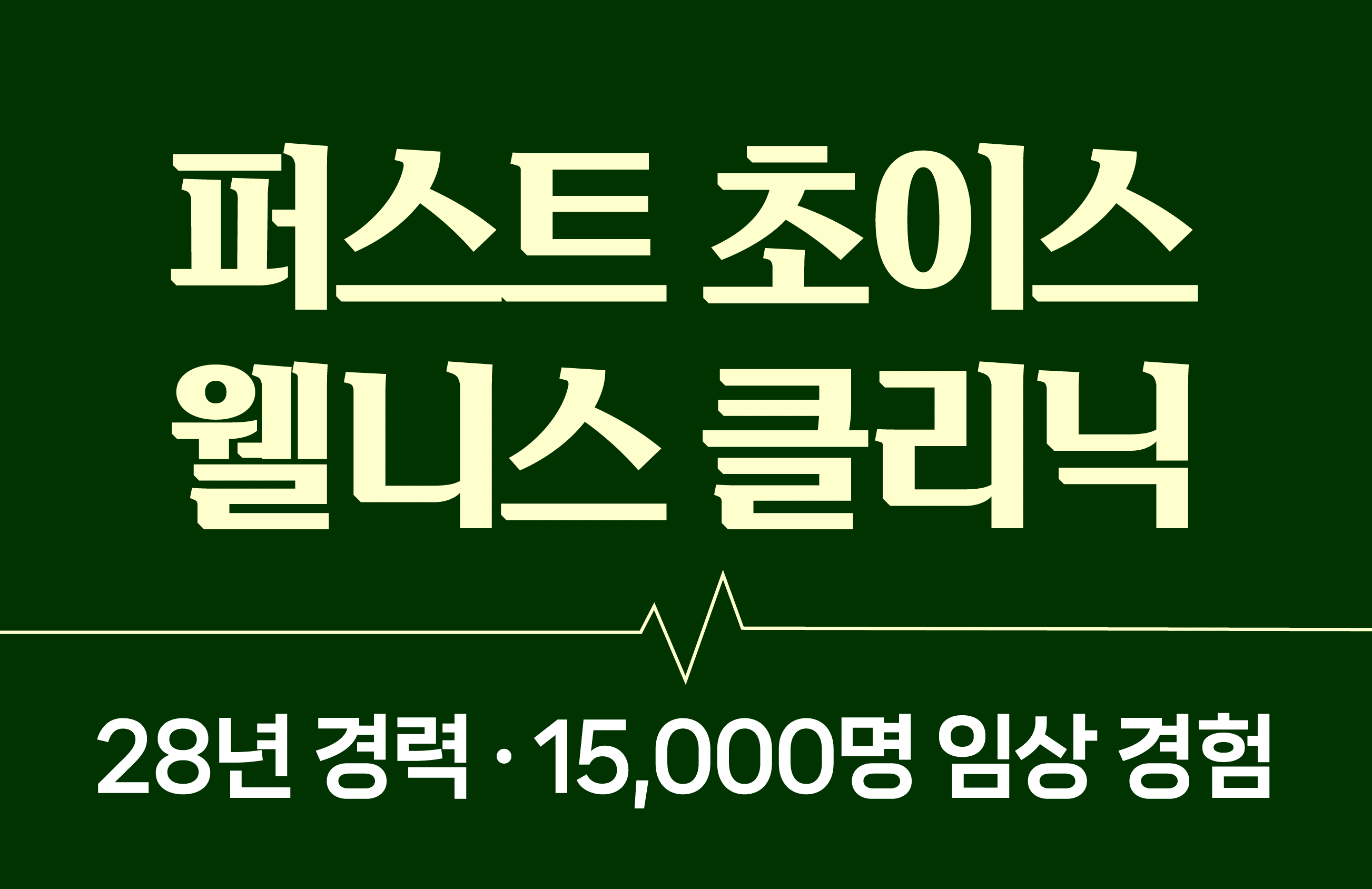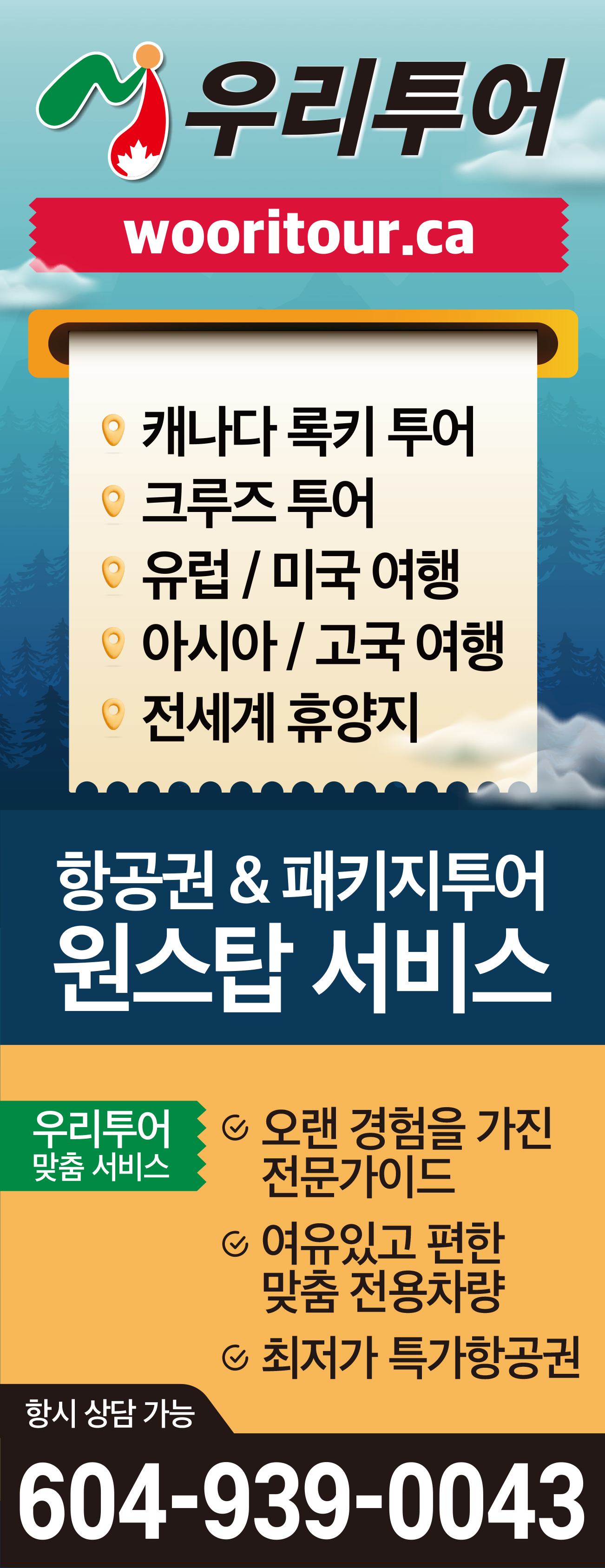허정희 (사) 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햇살이 따뜻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가 차가운 피부를 어루만진다.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물러간 자리에는 포근한 기운이 스며든다.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듯, 굳어 있던 몸을 천천히 늘여 본다. 산기슭에 머문 햇살 아래로 안개처럼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물기를 머금은 흙에서는 희미한 풀 냄새가 올라온다. 얼어있던 강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가볍게 흔든다. 새가 가지를 툭 치며 날아오르고, 어딘가에서는 새싹이 조심스럽게 숨을 틔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한다.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에는 아직도 희끗희끗한 눈이 남아 있다. 겨울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햇살이 머문 산자락 아래에는 연둣빛 새순이 움트고 있다. 어린잎들이 몸을 펴며 봄바람에 가볍게 흔들린다. 계절은 단숨에 바뀌지 않는다. 겨울과 봄이 잠시 공존하듯, 내 안의 오래된 감정과 새롭게 돋아나는 감정이 마주 선다. 앞산을 바라보다가 나도 잠시 걸음을 멈춘다. 내 마음속에도 아직 녹지 않은 겨울이 남아 있을까. 차가운 시간 속에 얼어붙은 감정들, 붙잡고 싶은 기억과 놓아주어야 할 기억들. 오래된 그리움과 새로운 기대가 함께 머무르는 이 순간, 나는 천천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거리를 걷는다. 두꺼운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눈에 띈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여유롭게 걷는 직장인,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는 노인. 가게 앞 화분에도 봄 햇살이 닿는다. 길모퉁이마다 남아 있던 겨울의 그림자가 햇살에 녹아내린다. 어제까지 움츠렸던 어깨들이 하나둘 펴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겨울의 침묵을 깨운다. 따뜻한 햇살을 담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연인,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엄마, 음악을 들으며 걷는 사람들. 봄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봄의 소리는 언제나 조용하고 부드럽다.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들어 마음을 감싸듯이 녹아든다. 겨우내 얼었던 물줄기가 세상을 향해 얼굴을 내밀고, 봄바람은 어린잎을 살며시 쓰다듬는다. 그렇게 피어나는 소리는 고요한 선율이 되어 마음에 닿는다.
자연이 소리를 내며 계절을 바꾸듯, 우리 몸도 소리를 내며 변화를 맞이한다. 내 몸에서도 소리가 난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무릎은 ‘뚝’ 소리를 내고, 허리를 펼 때면 저절로 ‘휴’ 하는 소리가 새어 나온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는 방바닥을 짚고 조심스레 일어나며 탄식을 내곤 하셨다. ‘나이 들면, 몸이 소리를 내는 거란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는 마음 깊이 와닿는다. 내 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세월의 흔적임을. 외할머니의 작고 여린 몸에서는 해마다 깊어지던 탄식은, 삶의 무게였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남겨진 딸을 향한 마음은 마지막 숨결에 애틋하게 배어 있었다. 이제는 외할머니도, 엄마도 없는 친정집. 그곳에 들를 때마다 내 몸에서도 삶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헉’하고 터지는, 오래 참아왔던 그리움의 소리. 그 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나를 흔든다.
햇살이 비추는 언덕에는 노란 개나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건 언제나 식물들이다. 계절의 변화를 눈치채고 말없이 꽃을 피운다. 사람들은 여전히 겨울의 그림자 속에 있지만, 봄은 이미 틈마다 자리를 잡고 있다. 거리의 상점 문은 활짝 열리고,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스쳐 간다. 그 속에서 나는 ‘봄을 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본다. 그들의 얼굴엔 겨울이 남긴 잔상과 봄이 불러온 기대가 희미하게 겹쳐있다.
봄은 귀보다 마음에 먼저 닿는다. 계절과 함께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고, 내 안의 풍경도 서서히 봄빛으로 물들어 간다. 겨울과 봄 사이, 이 짧은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 지나온 시간의 흔적과 새로운 계절의 설렘이 포개지는 지금. 나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봄의 소리를 듣는다. 겨울의 침묵이 걷히고, 생명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봄이 오는 향기가 바람을 타고 스며든다.
계절이 바뀌듯, 내 마음도 어느새 풀려나고 있다. 내일은 봄볕이 더 따스할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따뜻함이 내 마음에도 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고,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도 조금씩 펴진다.
겨울이 지나면 정말 봄이 오는 걸까. 때때로 겨울은 너무 길게 느껴져, 따뜻한 계절이 다시 올 거라는 확신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들, 얼어붙은 감정들, 끝이 보이지 않던 긴 밤들. 그런데도 봄은 늘 찾아왔다. 같은 햇살, 같은 자리에서. 찬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피듯. 결국, 피어날 순간은 다시 찾아온다.
봄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나는 그 고요한 시작 앞에서 깊은숨을 들이마신다. 바람에 실려 오는 봄의 향기, 햇살 한 줌이 공기 속에 녹아 내 폐를 가득 채운다. 나는 어깨를 펴고, 마음에 먼저 오는 봄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허정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허정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