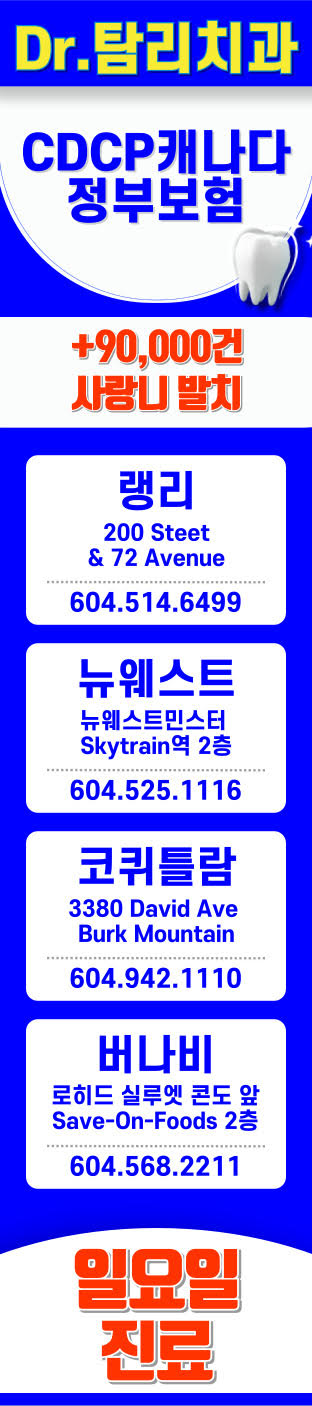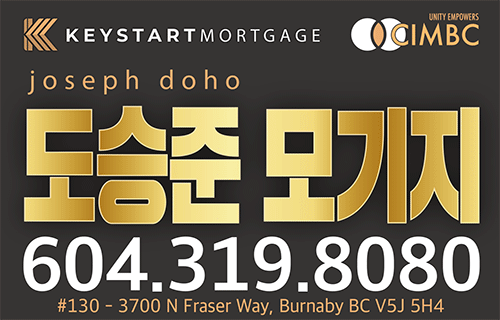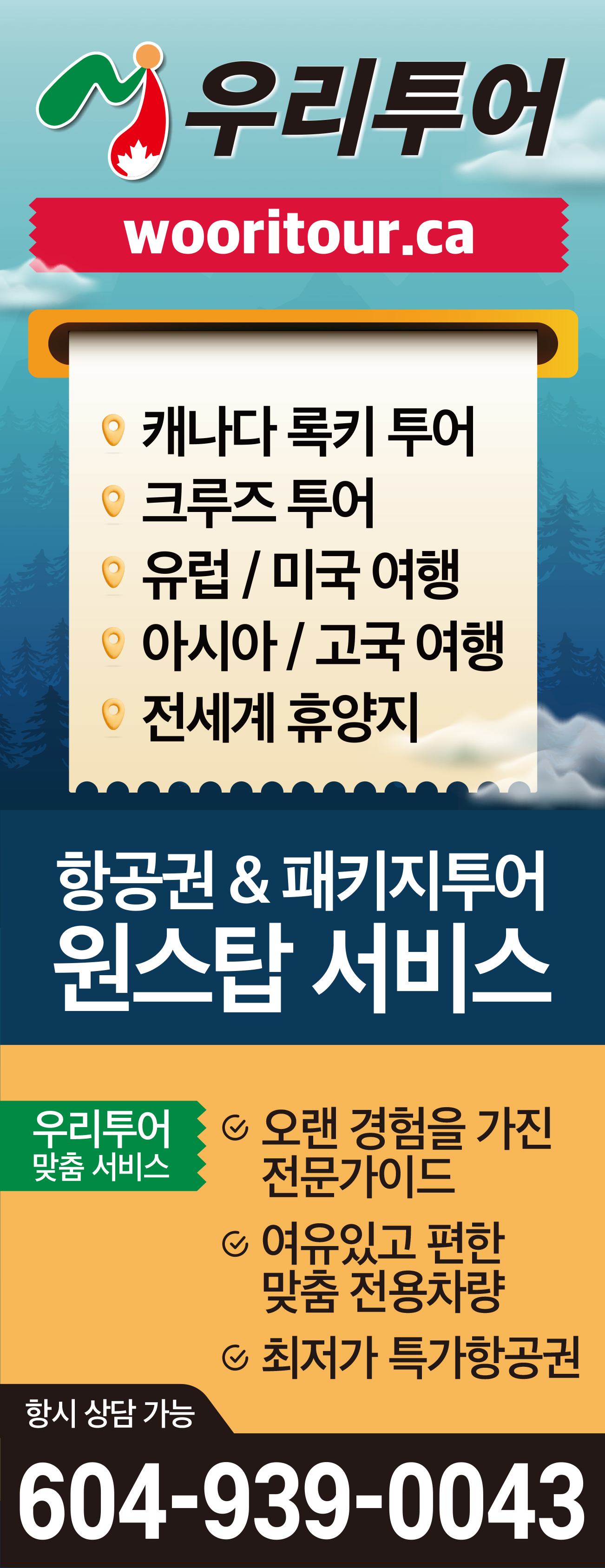이은세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누구나 트라우마를 하나쯤 가지고 살지 싶다. 남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듯해도 심한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마음의 병이다.
국민학교때 동네 집집마다 상달 고사 떡을 돌리러 다니다가 개에게 종아리를 제대로 물려 피를
흘렸다.
반창고, 붕대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라 그 댁 아주머님이 이불 호청같이 천을 찢어 싸매 주고
아저씨에게 업혀 집까지 왔다. 그때의 순간적인 공포와 고통이 트라우마로 평생 따라다녔다.
중고 6년을 시오리 산길을 걸어 상여집을 지나야 해도 혼자 꿋꿋이 다녀 독하다는 소릴 들었다.
동구까지 버스가 오자, 6.25때 총살당해 묻힌 30명 사상범들의 원혼이 나온다는 고개너머
이웃마을 여자 후배들이 가끔 막차를 타게 되었다.
데려다 주고 혼자 그 고개를 넘어 돌아 와야 하는 10리길이 많이 두렵고 무섭기는 해도 수시로
대하는 개에 대한 트라우마 같지는 않았다.
환갑을 훌쩍 넘겨서도 개가 있으면 가던 길을 되돌아오거나 멀리 돌아 피해 다녔다.
워낙 개를 좋아하는 나라에 오니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조깅하다가 송아지만큼 큰 도사견을
만나면 꿈에 나올까 두려울 정도다. 주위 분들이 일명 개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보내서
괜찮다고 해도 늘 불안했다.
특수학교를 나왔다는 군견이나 장애인 안내견들의 점잖고 절제된 행동과 주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다.
코로나 무렵부터 대만 출신 남매 청년들이 경영하는 대형 양란 농장에 꽃을 픽업하러 갔다가 덩치
큰 콜리인가 하는 개가 짖으며 달려들어 기겁을 하고 말았다.
꼼짝도 못하다가 달려온 사장 아가씨가 그 녀석의 인사법이라고 웃어 댔다. 그녀의 한 마디에 옆에
와 얌전하게 기대는 녀석을 보고 개에도 격이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 녀석 덕분에 트라우마가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농장의 꽃 픽업을 전담하며, 기다리는 동안 반겨주는 녀석과 친해지고
있다.
의사 선생님들이 배꼽 잡을 일이지만, 광견병에 걸리면 안된다고 내 종아리를 물어 뜯은 개의 털을
잘라다 불에 태운 재를 기름에 개어 발라 주셨었다. 그 댁 할머님의 처방과 간절한 기도 같은
처방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이은세의 다른 기사
(더보기.)
이은세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