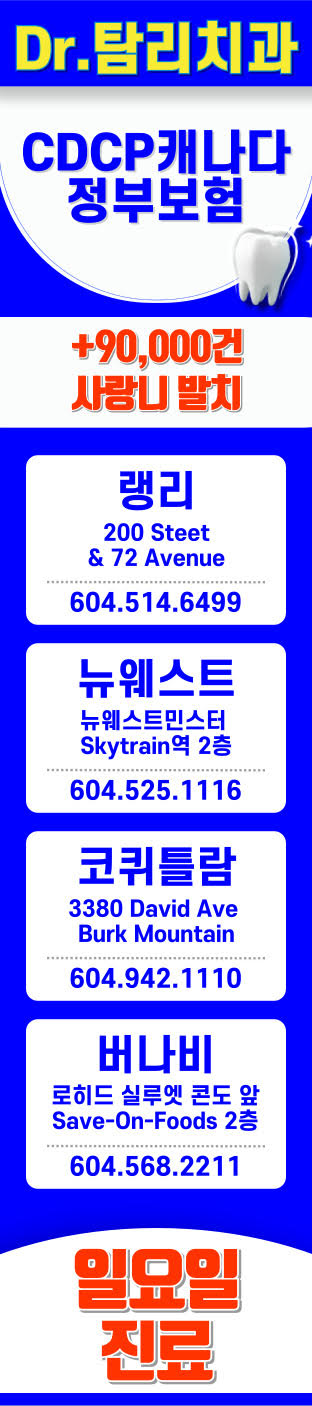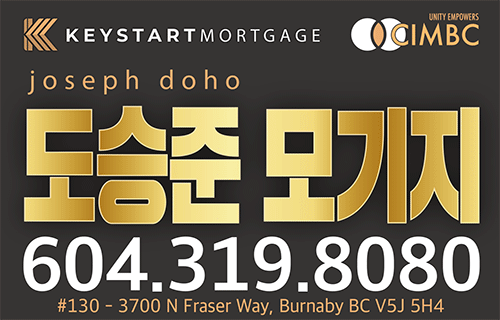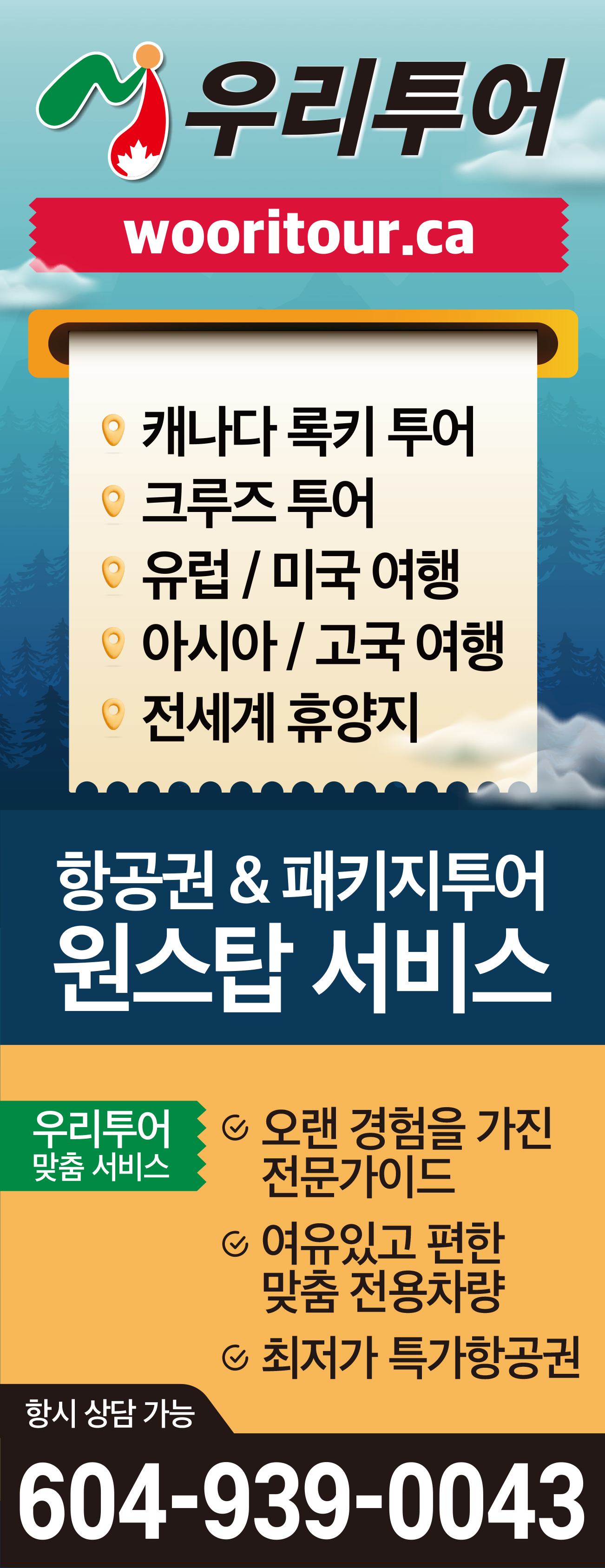전재민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이민자 낯선 땅에 뿌리내리려 할 때마다
사람들은 내게 보이지 않는 눈금을 들이민다
고향이라는 눈금, 학교라는 치수
그들은 나의 과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밟고 올라설 사다리의 높이를 가늠하는 중이다
골목마다 교회 숲을 이루는 도시
절 향기는 댓돌처럼 차고 문지방처럼 높다
교회의 찬송은 매끄러운 비단처럼 반짝인다
사람들은 나를 그 화려한 그물 속으로 초대한다
거절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 앉은 식탁 위에서
나는 비로소 이방인의 허기를 지우고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칸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손바닥 안에는 빛의 도시가 있다
전화기 액정 너머로 흐르는 타인들의 계절
수백 명의 이름이 별자리처럼 박혀 있어도
비가 내리면 마음에 갈라진 골은 더 깊어진다
그들은 나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읽어내지만
내 눈동자에 맺힌 눈물자국은 아무도 닦아주지 못한다
한국 누나 통화 목소리는 되감기는 테이프처럼
지나온 시간의 모서리를 반복해서 훑고 지나가고
직장 동료라는 이름의 섬들은
서로의 근심은 묻지 않은 채 굿모닝으로 평온하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와 나 사이엔
말하지 못한 말들이 침묵의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다
나는 이제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 대신
창가에 앉아 조잘대는 산새 노래가 그립다
서로의 과오를 캐묻지 않고도
그저 빗소리를 지워낼 투명한 수다
내 메마른 정적 속에 볕을 들여줄
여동생 같은 그 재잘거림이 그립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전재민 의 다른 기사
(더보기.)
전재민 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