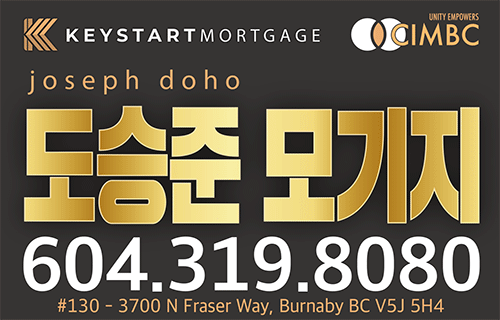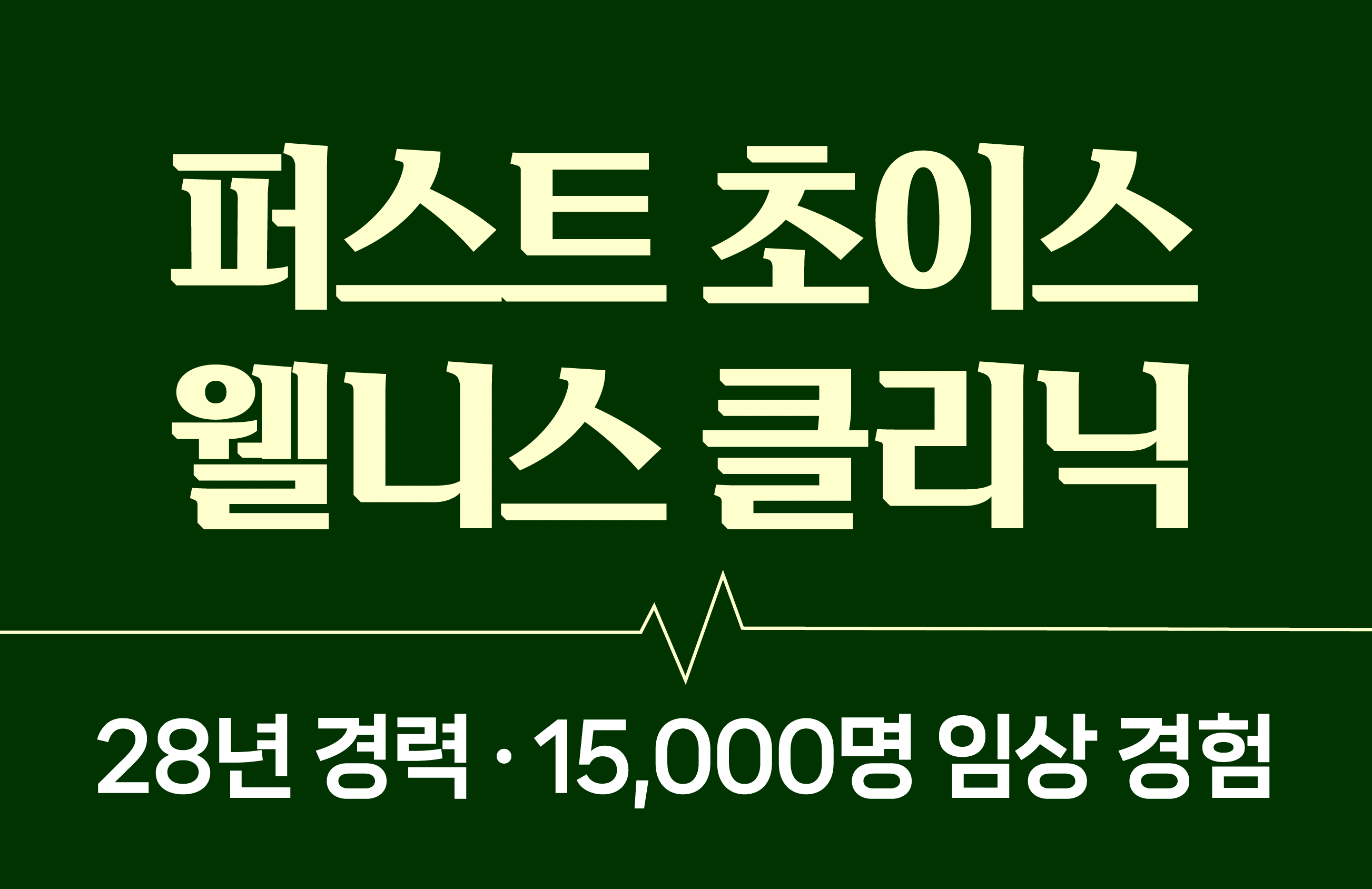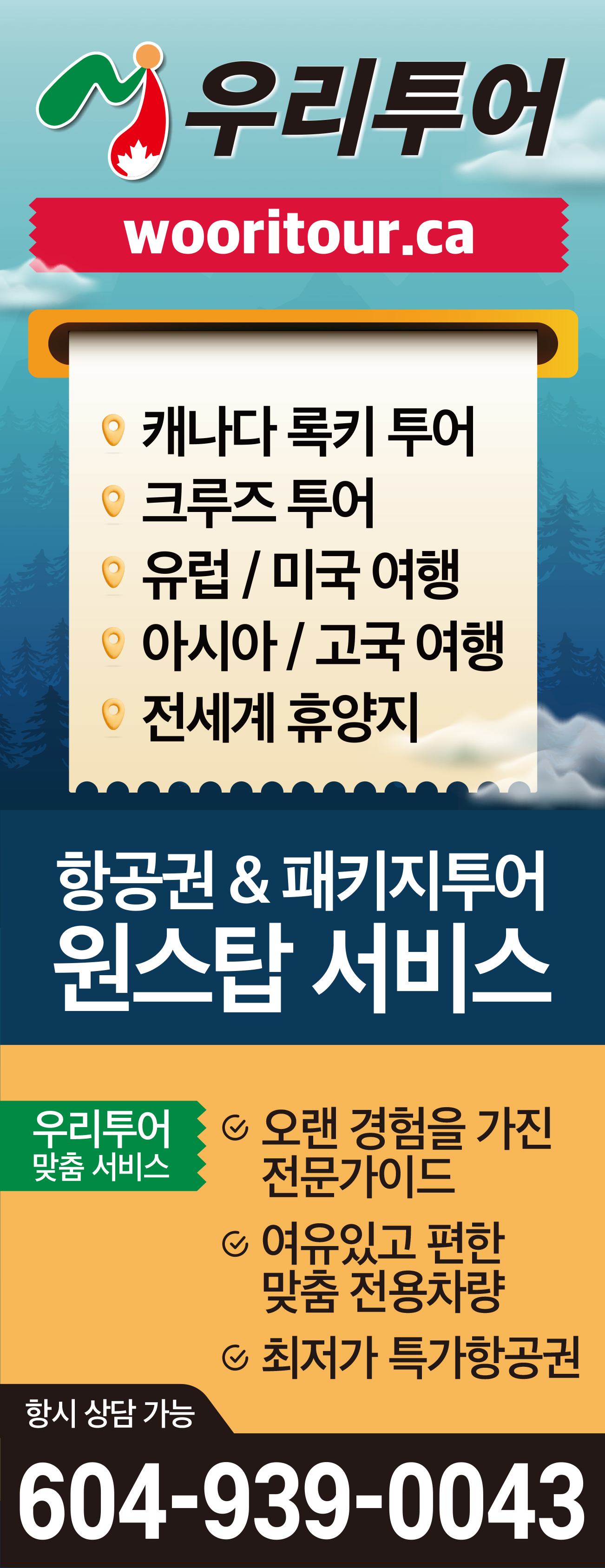임현숙 (사)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갓 지은 흰 쌀밥 같은
삼백육십오 개의 이름 없는 하루
해와 달 경계에서 호명을 기다린다
아직 목울대에 후회가 걸려있는데
때 묻은 손이
다시 하루를 빚는다
덜 굳어 찌그러져도
금이 번져 부스러져도
울음이 새지 않도록
웃음 한 벌 문설주에 걸어 두고
욕심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박수를 내밀어야지
하루를 닫으며
그래도 괜찮았다고 끄덕이게
오늘의 이름 아래
'사람' 쪽에 발 디딘다
응달로 찾아드는 얇은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눈부시게.
-림(20260101)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임현숙의 다른 기사
(더보기.)
임현숙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