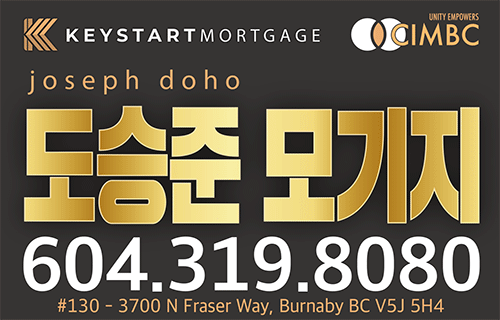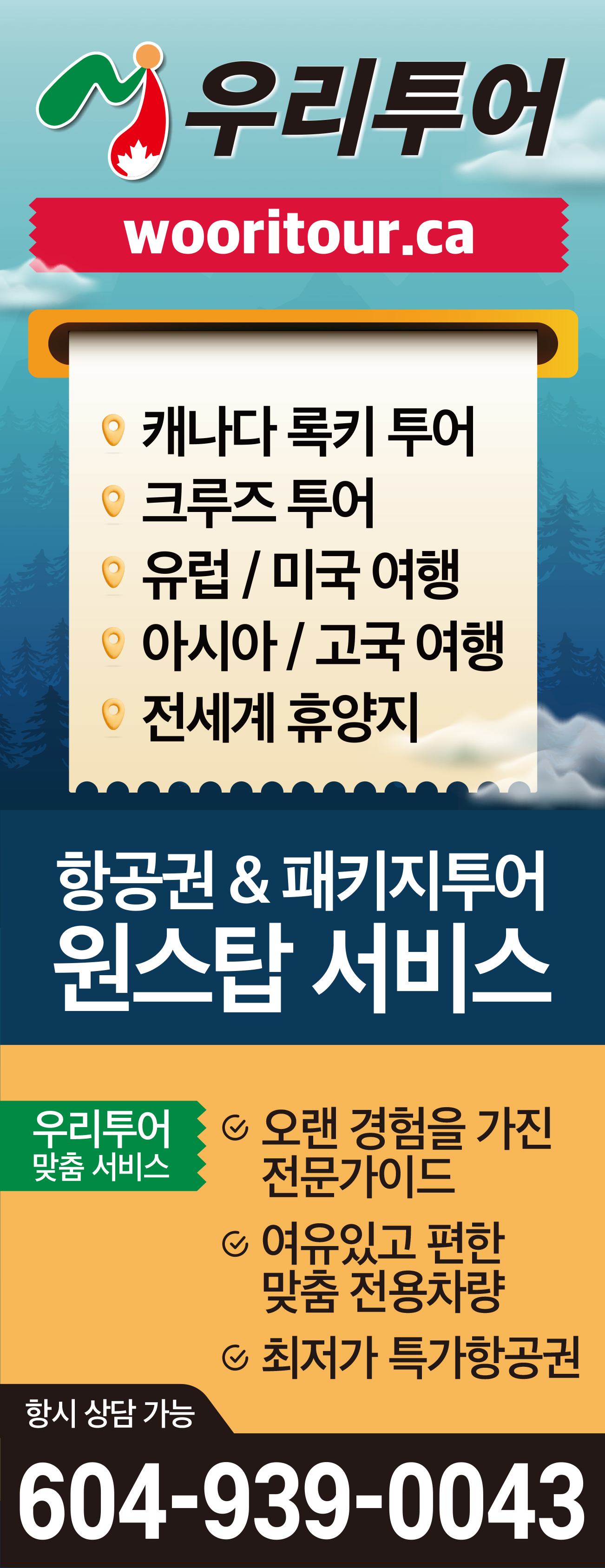어머니는 젖이 풍부하신 분이셨다. 우리 형제들을 키우면서도 일부러
젖을 떼려고 애쓰지 않고 아이가 먹겠다면 언제까지고 먹이려고 하셨다. 나도 거의 세 네 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들었다. 내 밑에 막내 동생은 여섯 살이 넘도록 젖을 먹었다.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도 들어와서는 어머니 품을 파고들어 젖을 먹었다. 주위 사람들이 젖을
떼지 다 큰 애를 무슨 젖을 먹이냐고 하면 어머니는 이제 더 먹일 아이도 없는데 나오는 젖을, 먹겠다는
아이를 어떻게 말리겠냐고 하셨다.
이렇게
되다보니 주위에서 젖이 모자라는 집에서는 아이를 데려와서 젖을 얻어 먹이기도 하였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영등포 당산동에 살 때 어머니와 절친한 친구 분이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체수도 작은 분이라 젖이 모자라 동생 쌍둥이를 데리고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젖을 얻어 먹이곤 하면서 키웠다. 쌍둥이 형은 커가면서 젖을 먹여준 어머니한테 각별한 마음으로 종종 우리 집에 들리고는 하였다. 장성해서 대학을 나온 뒤에는 듣기에도 생소했던 계리사가 되었다고 자랑했다. 계리사는
얼마 뒤 명칭이 회계사로 바뀌었다. 초창기 무렵이라 각광받는 유망한 직업으로 매일 바쁘게 지낸다고 땀을
닦던 쌍둥이 형은 어느 날 마침내 노총각을 면하고 장가를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색싯감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눈에
보아도 귀엽고 예쁜 얼굴이다. 형은 키가 큰 편으로 훤칠한데 새색시는 아담하고 작은 편이었다.
결혼식을
마치고 마련해 둔 살림집에 모여 친구들과 피로연을 하기로 해서 나도 슬쩍 끼어들었다. 사실은 쌍둥이
형의 색시를 가까이서 본다는 호기심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20대 초반의 어린 신부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신랑 친구들은 신부가 노래를 하지 않으면 신랑의 발바닥을 매질하겠다고
야단이다. 신랑을 인질로 신부에게 강청을 하는 것이다. 남들
앞에서 제대로 눈도 못 뜨는 새 색시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요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신부가 노래를
하지 않는 한 신랑에게 매질은 멈출 것 같지 않으니 어쩌랴!
신부의
입에서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친구들은 입에다 손가락을 대고 모두 조용히 하라고
했다. 나도 귀를 기울여 목소리에 집중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 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의
시〈모란이 피기까지는>이었다.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하고
얼마나 감동에 젖었길래 처음 들어본 이 시를 단번에 외울 수 있었고, 평생을 암송하고 있다. 피고 난 모란이 지고 나면 삶의 모든 보람은 무너지고 섭섭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련만 그래도 나는 다시 봄을
그리며 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미이다. 영문 모르고 부른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자신의 미래를
바라본 새색시의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모른다.
멀지
않은 곳에 가까이 살면서 쌍둥이 형네와는 절친하게 지냈다. 연말연시나 생일에는 우편엽서 뒤에 삽화를
그려서 축하 카드로 보내면서 ‘작은 아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작은 아씨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고교를 졸업하고 한국전력에 들어가 경리업무를 보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동안 직장에 나갔다. 집에 가면 내가 보내준
엽서를 화장대 거울 아래 꽂아둔 것이 보였다. 반갑게 맞아주며 과일이고 커피를 대접해 주었다. 어느 날 쌍둥이 형과 함께 셋이 앉아 있는데 형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
사람은 나보다 현섭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하면서 파안대소했다. 갑자기
나와 작은 아씨 사이에 커다란 산이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작은 아씨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작은 아씨는 내게 말했다. “졸업 축하해요.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것 있나요?” 망설이던 나는 “구두를 신고 싶어요.”하고 말했다.
며칠
뒤 나는 서울시청과 광화문 사이에 있던 한전빌딩 앞에 서 있었다. 널찍한 건물 현관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멀리 복도 끝에서부터 하이힐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더니 점점 크게 들려왔다. 가까이 걸어오는 작은
아씨가 ‘향림’이라는 이름처럼 향기롭게 다가왔다. 핸드백을 든 정장 차림이었다. 나는 아직 교복을 입고 교모를 쓰고
있으니 쑥스럽고 촌스런 모습으로 작은 아씨와 함께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다.
종로 2가에 있는 금강구두에 함께 들어갔다. 세상 처음 구두방에서 구두를
사보는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머뭇거리는 나에게 작은 아씨는 정말 맘에 드는 구두를 골라 주었다. 왕자라도 된 기분으로 구두방에서 나와 종로 1가에 있는 ‘미락’이라는 메밀국수집으로 갔다.
좁은 식탁에서 마주 앉아 가만히 작은 아씨를 보았다. 언젠가 시골 동네 돌담길에서 담장
너머로 피어있던 진홍빛 능소화 같다고 여겼다.
집에
돌아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새 구두를 책상 위에 모셨다.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 보았다. 차마 새 구두 밑에 흙을 묻히고 싶지 않았다. 새 구두를 신기까지는
꽤 여러 날이 걸렸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심현섭의 다른 기사
(더보기.)
심현섭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