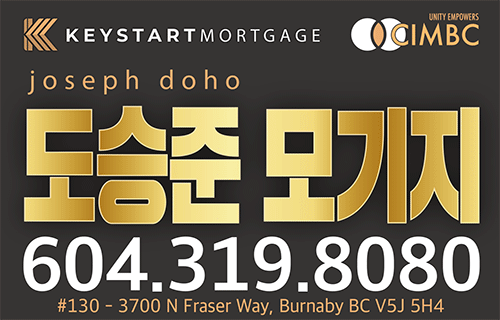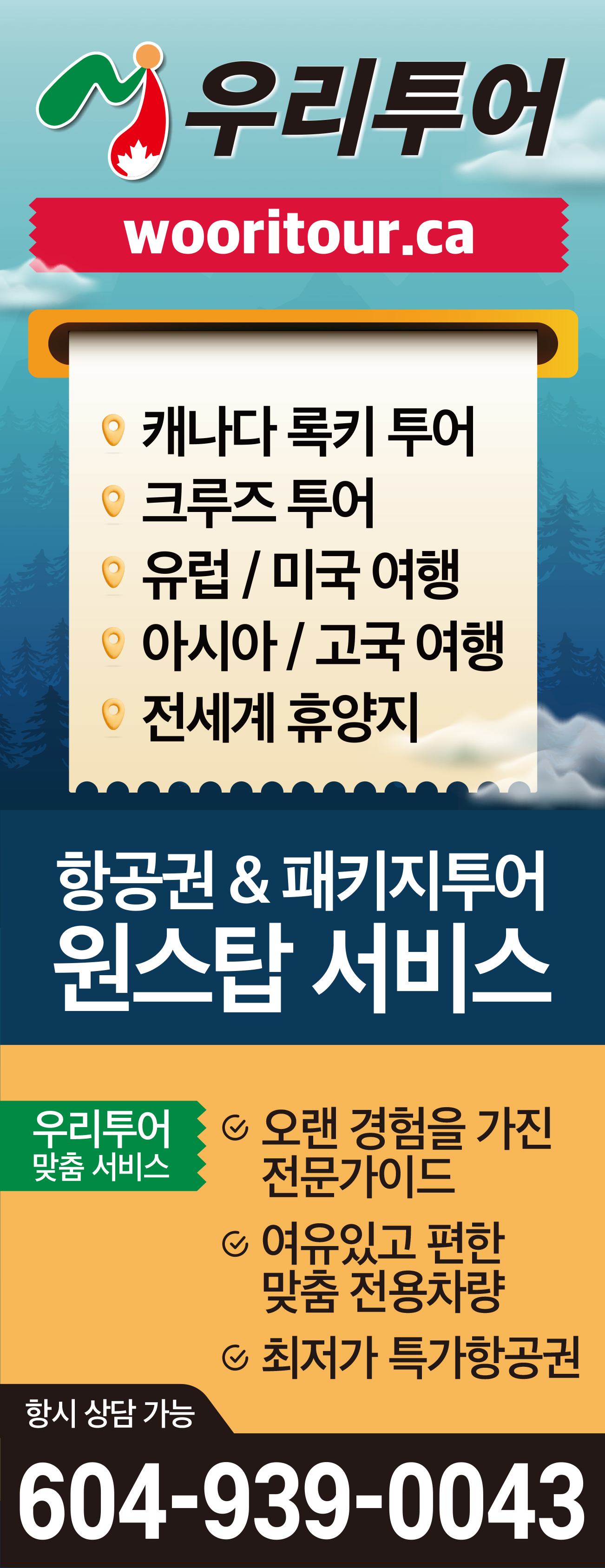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그래서 수어를 배웠나요?”
이 질문의 뜻을 바로 이해했다. 한두 장 읽고 말 줄 알았는데 다 읽게 되었다며, 내가 쓴 문장대로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책에는 청각 장애인 부부를 만나 썼던 <손의 언어>라는 글이 있다. 그가 장애인 지원기관 수장이라 그 글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배우고 싶은 언어로 수어를 소개했으니 내가 정말 수어를 배웠는지 묻는 것이다.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 이성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받은 질문이었다. 땀이 났다. 하필 글과 삶의 거리감에 허우적대고 있는 지금 묻다니. 다정한 마음과 연대를 힘주어 말하면서도 한동한 어긋난 계획과 연결되기 어려운 마음에 지쳐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무례한 몸짓에 움츠려 들었고, 마음은 차가워졌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써온 문장처럼 살고 있을까. 쓰는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는 ‘읽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글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글의 가치와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반가운 말이었다. ‘읽는 사람’은 다양한 관점으로 유연한 사고를 하며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이내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진실하고 깊은 글을 쓰면 좋겠다고 했다. 오랜 시간 꿈꾸며 기다렸는데 내 글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나다니. 외롭게 글을 써온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문장처럼 살아가는 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까.
제안을 받고 그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쓰인 문장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일까. 자폐가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그는 오래전부터 장애 자녀의 행복한 삶을 고민해 왔다. 언젠가 부모가 세상에 없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자녀가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장애 자녀가 ‘지금’ 행복하고 ‘미래’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반을 세우는 것이 그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삶은 결국 약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인간은 연약하게 태어나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다가 다시 연약해져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다. 소수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곧 모두의 삶을 지우지 않는 일이다.
작가 희정은 살아가고 싸우고 견뎌내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죽음을 배우고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알고자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염습실과 안치실 등 그들의 일터를 취재하기 위해 먼저 자격을 갖추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살던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업業’에 대해 소개하며 현장에서 얻은 사유와 정보를 촘촘히 기록했다. 단체의 이야기를 담으려면 장애 친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기록 노동자인 희정을 떠올렸다. 밖에서 엿보는 사람이 되기 싫어 현장안으로 들어갔던 작가처럼 나도 소중한 삶을 기억하고자 장애인들의 세계로 들어간다.
덕분에 타인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장애 친구들로 일상을 가득 채우는 서포터들과 기관을 운영하며 무수한 결정에 머리를 모으는 사람들, 무엇보다 영원히 늙지 않는 피터팬, 발달장애인들과 조우한다. 서로가 삶의 자리가 되어 이어진 공동체에는 희망이 비친다. 내 세계가 넓어졌음은 선물이다. 이제 이곳에서 어떤 세상을 꿈꾸며 무슨 마음으로 글을 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쓰는 행위는 지식과 감각, 기술을 넘어 관계에 연약하게 기대어 있다. 그 안에 애정과 진심이 스며들 때 문장은 살아난다.
사람은 글보다 크다. 하지만 나는 삶을 표현할 방법으로 글을 택했다. 글을 씀으로 내가 담지 못하는 세상은 무엇일까 묻는다. 그러다보면 가장 인간적인 문장으로 어떤 삶도 소외시키지 않을 글을 쓸 수있지 않을까. 내가 썼고, 쓰게 될 문장에 하늘 리듬을 붙여 노래로 부를 것이다. 문장이 삶이 된 이들을 따라서.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한나의 다른 기사
(더보기.)
김한나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