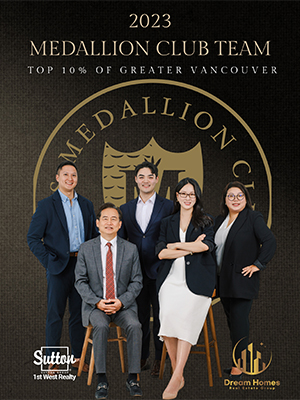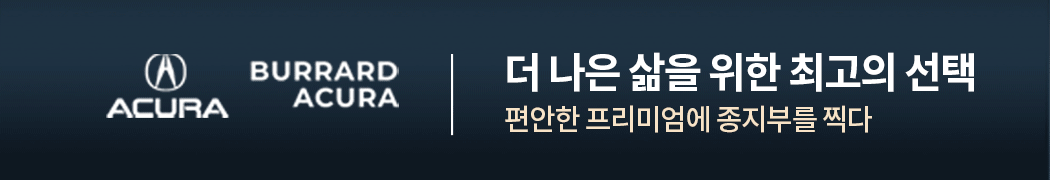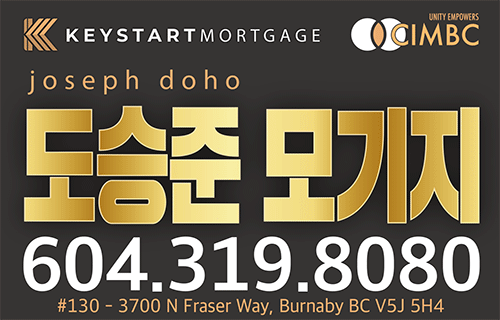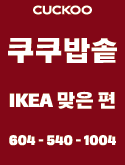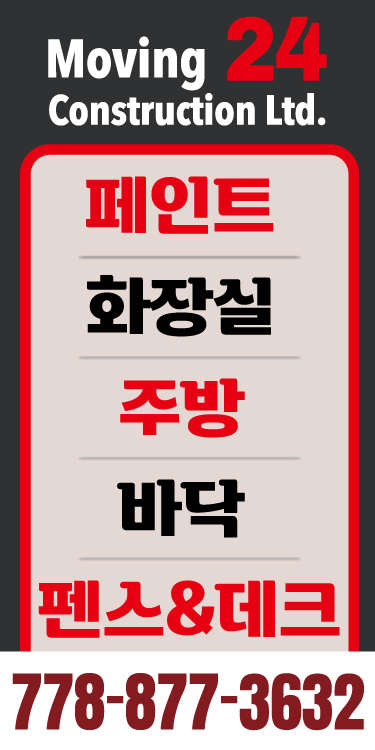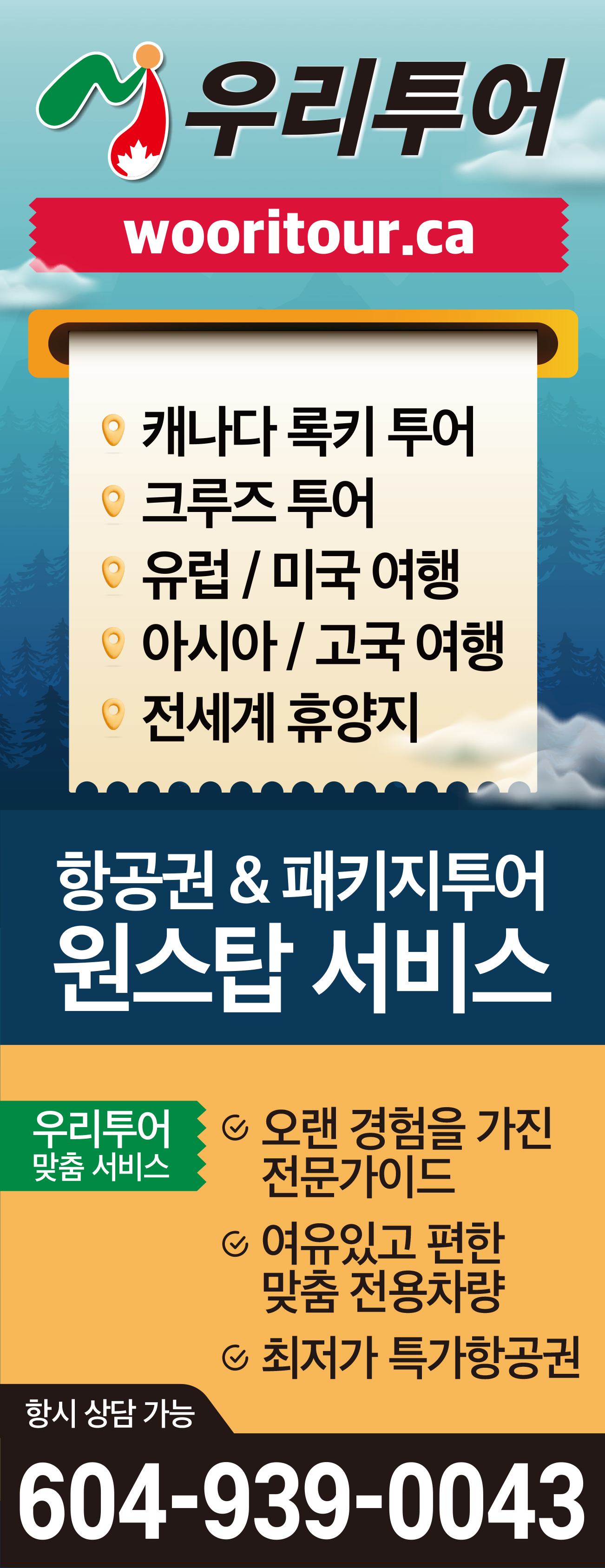고현진 / 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단영은 유미를 가졌을 때를 떠올렸다. 유미의 태몽은 강렬했다. 조류를 무서워하는 단영에게는 잊힐 수 없는 그럼 꿈이었다. 커다란 기와집 대문 중앙에 서 있던 단영은 무거운 대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작은 틈 사이를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선 건 윤기가 흐르는 까만빛의 새였다. 새는 긴 목을 똬리 틀듯 둥글게 말고 마당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까만 깃털 안에서 번뜩이는 까만 눈동자가 단영을 올려다봤다. 단영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새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길을 걸을 때도 새를 피해 다니고 비둘기 무리를 넘어서지 못해 길가에서 울기도 했다. 누군가에겐 우스워 보일 수 있는 조류에 대한 공포가 단영에겐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 같은 거였다. 그런 단영에게 길쭉한 목을 둘둘 말고 바라보는 까만 새라니. 단영은 몸서리치며 뒷걸음질했다. 툇마루에 엉거주춤 앉아 까만 새를 보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까만 새는 그저 웅크리고 있었다. 단영은 얼른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요량이었다. 단영이 까만 새를 응시하며 조심스레 방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침착하게 양문을 잡고 닫으려던 찰나였다. 웅크렸던 까만 새가 커다란 날개를 펴고 푸드덕 날아와 단영을 덮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단영은 까만 깃털 더미에 묻혀 악을 질렀다. 꿈에서 내지른 비명이 현실로 터져 나오면서 단영은 꿈에서 깼다.
단영은 단번에 이 꿈이 태몽이란 걸 직감했다. 기분 좋은 꿈은 아니었으나 태몽이라는 확신도 벗겨낼 수 없는 그런 꿈이었다. 단영은 까만 날갯짓으로 날아들던 그 새를 떠올리자 오한이 든 듯 온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다. 15년이나 된 꿈이지만 매번 떠올릴 때마다 생생했다. 육감적으로 아이를 예견한 꿈이라는 걸 깨닫고 얼마 안 있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유미가 태어났다. 열 살이 될 때까지 말썽 한번 없이 밝게 자랐던 유미였다. 쏟아지는 태양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유미는 반짝이고 눈부셨다. 그랬던 유미가 열 살 생일을 잘 보내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그대로 의문사를 맞이했다. 단영과 남편은 상실의 고통을 온전히 느낄 새도 없이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숱하게 받았다. 차라리 이유가 확실한 죽음이면 답답함도 없을 텐데
단영과 남편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아이의 죽음에 분노가 치밀 만큼 알아낸 것이 없었다. 그 후로 유미의 기일이 어느새 5주기에 접어들었다. 단영은 따로 사는 남편과 오랜만에 마주한 것이다. 유미의 납골당에 들어서면 늘 그렇듯 단영은 유미의 태몽이 어제 꾼 꿈처럼 떠올랐다.
“이제 다 정리됐네.”
단영과 남편은 유미를 잃은 상실로부터 서로를 탓하기 바빴다.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까지 다다르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유미 기일은 잊지 말고 와야 돼.”
“그건 우리 두 사람에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일이야.”
유미의 기일 5주기는 단영과 남편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날이기도 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가 단영을 바라봤다.
“일본으로 간다고?”
단영은 일본의 가고시마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까지 했다. 청춘을 일본에서 보낸 셈이었다. 가난한 유학 생활이었지만 학교 캠퍼스에서 보이는 사쿠라지마 화산의 풍경은 단영을 붙들어 졸업까지 머무르게 했다. 활화산인 사쿠라지마 화산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일쑤였다. 딛고 서 있는 땅 아래가 뜨겁게 들끓고 있다는 것, 땅속을 흐르는 오래된 시간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단영에게 그동안 갖지 못했던 이면의 사유를 갖게 했다. 유학 생활이 힘겨운 날이면 단영은 활화산이 내뿜는 검은 연기를 보며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이렇게 신을 찾게 되는 거구나.’하고 단영은 연약해진 마음을 붙들었다. 남편과의 이혼 조정이 끝나고 단영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었다.
“오래 지내려는 거야?”
“오래는 아니야. 그냥 검은색의 쇠재두루미를 보려고 가는 거야.”
단영은 태몽 속 검은 새를 실제로 본 적이 있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발견한 한 장면이었다.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한 곳에서 묘한 이지메를 당하던 때였다. 단영은 속내를 알 수 없는 회사 사람들에게 진절머리가 나 아무 연락도 없이 무작정 교외로 떠난 적이 있었다. 가을 중순부터 두루미가 거대 도래하는 이즈미시로 향한 것이다. 그곳에서 단영은 일반 두루미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쇠재두루미를 발견했다. 원래라면 그곳에 있을 개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쿤지(Koonji)라고 해요. 인도와 네팔에서는 쇠재두루미를 높이 평가하면서 쿤지라고 불러요. 아마도 길을 잃은 미조 같군요.”
쇠재두루미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단영을 알아챘는지 두루미를 관찰하러 온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건넸었다. 유미의 태몽으로 나타났던 긴 목의 검은 새는 그때 봤던 미조, 쇠재두루미가 분명했다. 단영은 다시 가고시마로 돌아가 검은 쇠재두루미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린 유미의 죽음을 곱씹을 때마다 떠오르던 태몽 속으로 단영은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일본행을 마음먹은 단영은 두루미가 도래하는 계절을 맞춰 가고시마 이즈미시에 다다랐다. 두루미가 모여 있는 풍경은 장관이었다. 초겨울의 찬바람을 맞으며 단영은 두루미 떼 사이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길을 잃은 쇠재두루미가 그 사이에 있지는 않을까 한참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곁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탄식했다.
“쿤지다.”
돌아보니 10년도 더 된 쇠재두루미를 봤던 날 단영이 만났던 그 사람이었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 끝을 따라가니 정말 온 몸이 까만 쇠재두루미가 보였다. 긴 목을 감고 논밭에 엎드려 있는 녀석이었다.
“길을 잃은 미조군요.”
단영이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그때로부터 꽤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길을 잃고 이곳에 터전을 잡았을 지도 모를 일이죠.”
단영은 느닷없이 흐르는 눈물에 어쩔 줄을 몰랐다.
“왜 이런 데서 길을 잃고, 집이 아닌 곳에서 머무는 거야. 어서 날아가. 네가 가야 하는 곳으로 어서 가.”
단영이 눈물을 닦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곁에 선 사람이 쇠재두루미를 보며 담담히 이야기를 이었다.
“걱정마요. 쇠재두루미는 작은 몸집으로 가장 고단하고 힘든 이주를 하는 새예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따뜻한 나라로 가는 강인한 새죠. 길을 잃었다 한들 다시 또 갈 거예요. 춥고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은 기억은 몸에 그대로 배어 있을 테니까요.”
단영이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추스르자 웅크렸던 쇠재두루미가 날개를 펴고 제자리에서 몇 번의 날갯짓을 했다. 이윽고 쇠재두루미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단영은 하늘로 치솟는 검은색의 쇠재두루미를 보며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고현진의 다른 기사
(더보기.)
고현진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