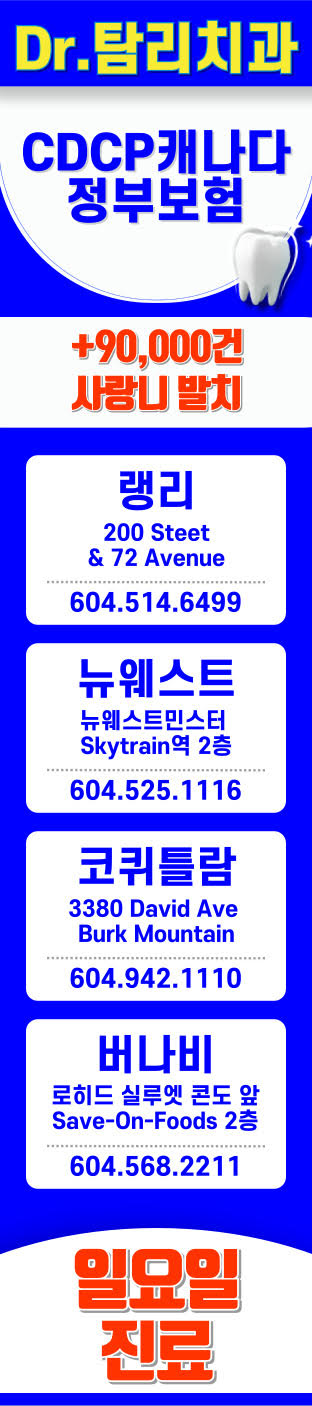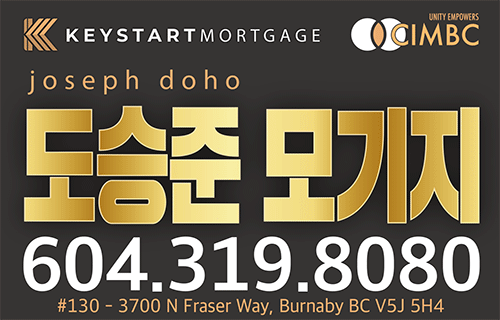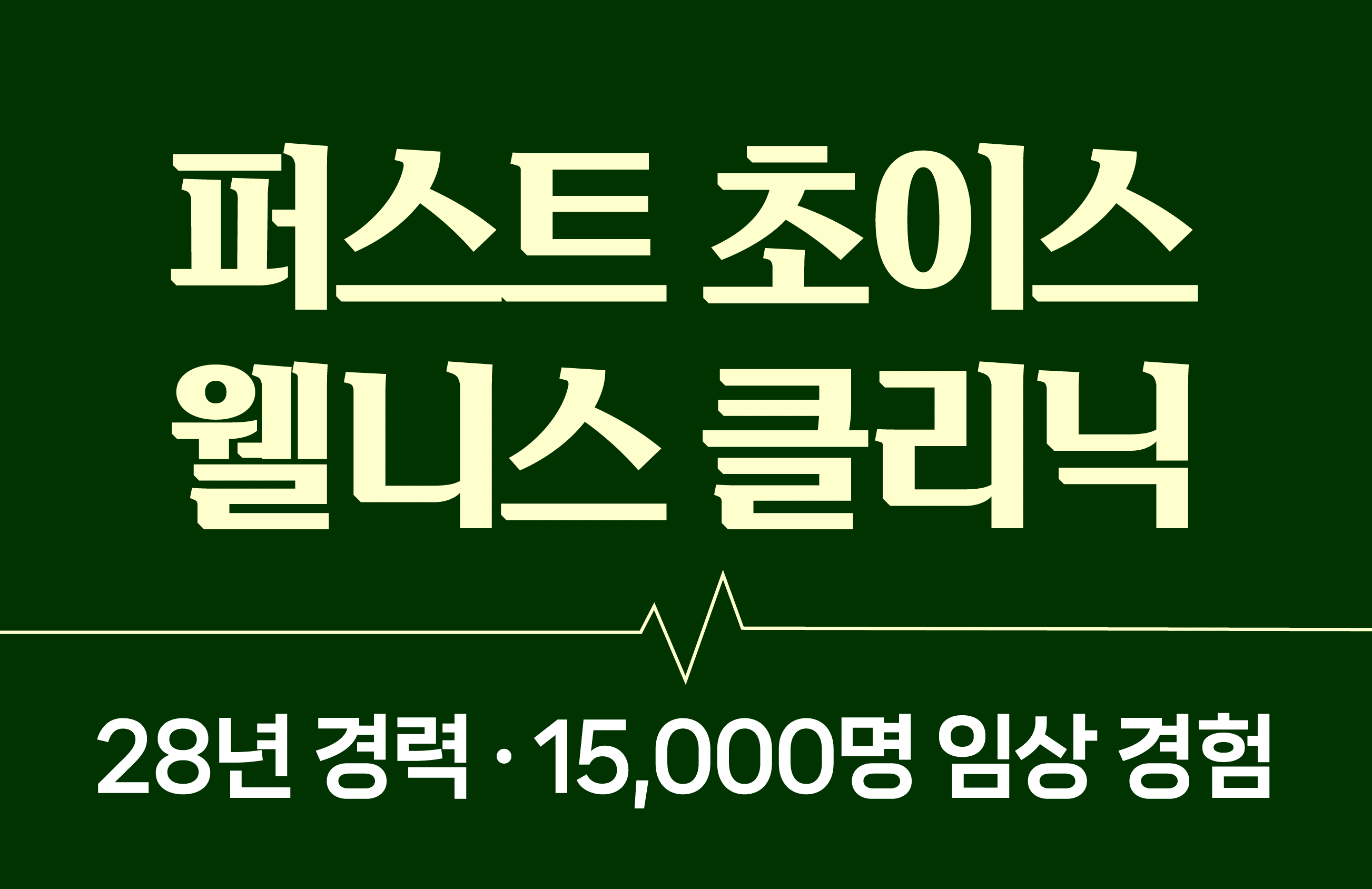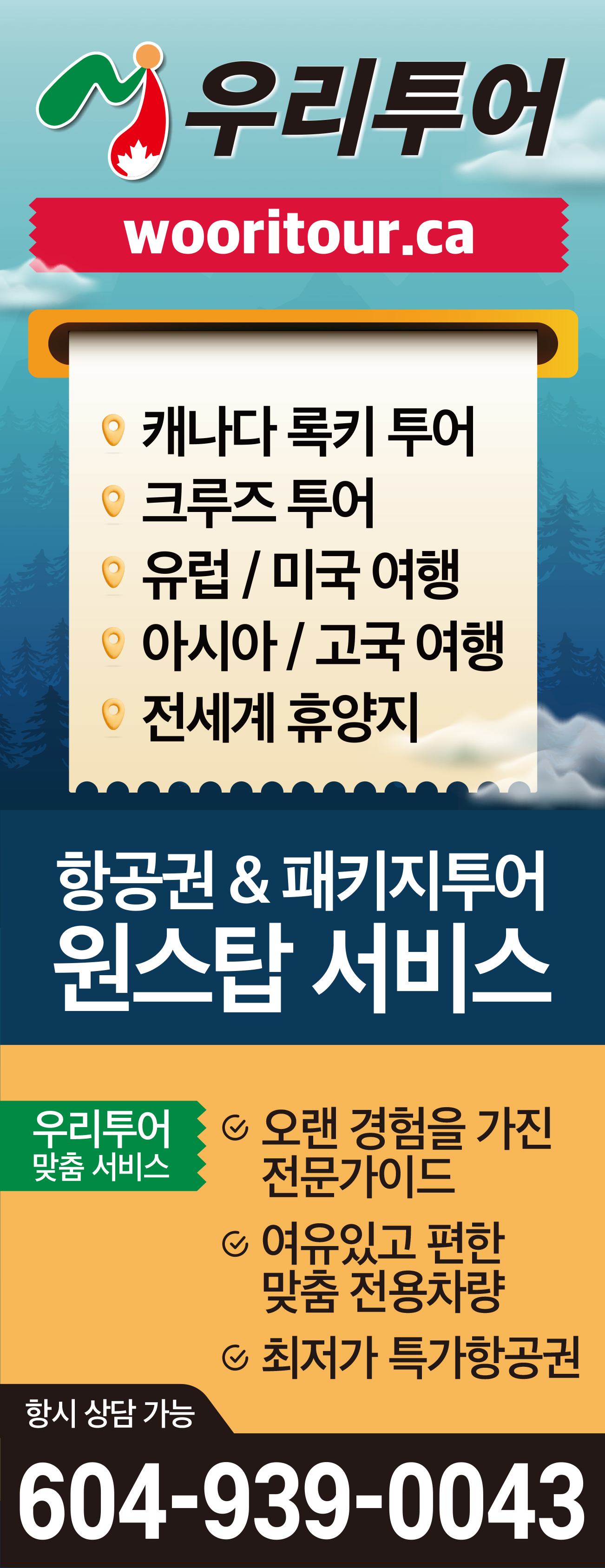김춘희 /(사)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이민 6년 차(1980), 몬트리올에서 쌩로랑 강을 건너 비둘기장처럼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살 때였다.
부활절이 되면 쇼핑몰마다 병아리를 전시하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 알에서 갓 부화되어 삐약거리는 노란 병아리를 볼 때마다 아이들은 사 달라고 졸랐다. 나는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남편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남편에게, 병아리가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약 병아리가 되면 닭을 잡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이민 초기라 닭을 집에서 못 잡으면 도살장에 갖고 가면 된다는 것을 몰랐다. 결국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고 노란 병아리 다섯 마리를 샀다.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다.
처음 한동안은 병아리가 상자 안에서 잘 자라더니 한 마리 두 마리 죽어 갔다. 결국 팔자가 센 수놈 한 마리만 살아남았다. 상자 안에서 자라던 녀석이 몸집이 커지면서 가끔 상자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이들은 병아리일 때는 모이도 주고 예뻐하더니, 병아리가 점점 자라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날도 따뜻해졌기에 녀석을 아예 마당에 놓아길렀다. 수놈은 점점 늠름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머리꼭지엔 발그레 한 벼슬을 달고 목덜미에는 갈색의 머플러를 둘렀다. 꼬리깃도 제법 길어지며 혼자 살아남은 팔자에 상관없이 수놈의 풍채를 자랑하듯 점잖게 마당을 거닐었다.
어느 날, 새벽 정적을 깨고 닭이 회를 쳤다. 꼬끼오 오! 아니 수탉이 회를 치다니. 그리고 다음 날도 새벽에 또 꼬끼오. 드디어 내가 걱정하던 문제가 찾아왔다. 이웃들의 항의다. 새벽 수면을 방해하니 무슨 조치를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퇴근한 남편에게 이제 약 병아리를 만들 때가 되었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남편은 그날은 피곤하니까 다음 날 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다음 날 다시 채근했다. 동네 사람들 불평에 체면이 구기니 제발 빨리 닭을 잡아 달라. 잡기만 하면 뒤처리는 내가 다 한다며 졸라 댔다. 남편은 그날도, 그다음 날도 같은 이유로 계속 약속을 미루었다.
나의 인내심이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랐을 때, 남편은 결국 남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는 동물을 죽이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대한민국 군인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군인생활 20년을 어떻게 했을까,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군인이 어떻게 6.25. 전쟁터에서 총을 쏘았을까? 대한민국은 이런 군인에게 보국 훈장까지 주다니. 종알대는 내 소리가 시끄럽다는 듯, 퉁명스레 한마디 내뱉었다. 전쟁터에서 총을 쏘았지만 사람 맞으라고 쏜 것이 아니고 그저 무서우니까 공중에 대고 막 쏘았단다. 하기야 벌레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인 걸 나는 안다. 나는 혼자 말로 내가 어쩌다 이렇게 겁쟁이 군인 아저씨와 결혼했는가. 신세 한탄을 하다가 약병아리 먹긴 다 틀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닭 못 잡겠다는 남편과 아무리 입씨름한들 뾰족한 수가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제안했다. 내다 버리자. 그냥 내다 버리고 오자. 우리는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시골길로 저녁 드라이브를 나갔다. 바람이 불고 구름도 잔뜩 낀 으스스한 저녁이었다. 우리는 드넓게 펼쳐진 들과 드문드문 박힌 시골 농가 주택을 사이에 둔 하이웨이를 달렸다. 남편은 정말 버릴 거냐고 물었지만 차마 내가 기른 녀석을 바람 부는 들판에 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을 속 가게에 가서 알아보기로 했다. 나는 늦게까지 열려 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수탉 한 마리를 버려야 하는데 누가 닭 필요한 사람 있을까 하고 나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조그만 동양 여자의 닭 가져가라는 제안에 가게 주인은 눈만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내 가슴은 콩콩 뛰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지. 그때 가게에 있던 건장한 중년 사나이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갖고 가겠다며, 내일은 맛있는 치킨 수프를 먹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얼른 차에 가서 닭이 들어 있는 상자를 들고 와 사나이에게 건네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는 키다리 포플러 나무들이 몰아치는 바람과 팔 씨름을 했다. 아이들은 서로 포개어 잠들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나는 휙휙 지나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녀석이 들판에 버려진 것보다는 누군가의 식탁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문득 친정어머니가 생각났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한동안 궁핍하게 살았다. 어머니는 뒷마당에 야채도 심고 닭도 길렀다. 어머니는 가끔 손수 닭을 잡았다. 목을 따고 털을 뽑고 그렇게 백숙을 해 주셨다.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었다. 어머니의 가족을 위한 희생을 나는 흉내 내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장작불을 지피고, 나는 수탉을 찾아 들판을 헤매는 꿈을 꾸었다. 기른 정이 그리워서였겠지!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춘희 의 다른 기사
(더보기.)
김춘희 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