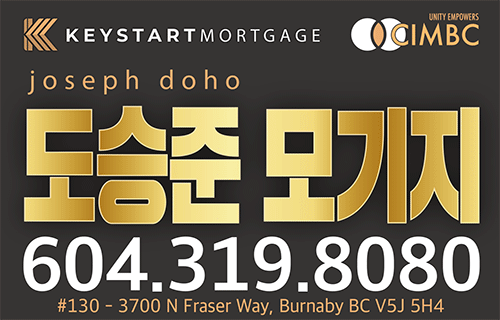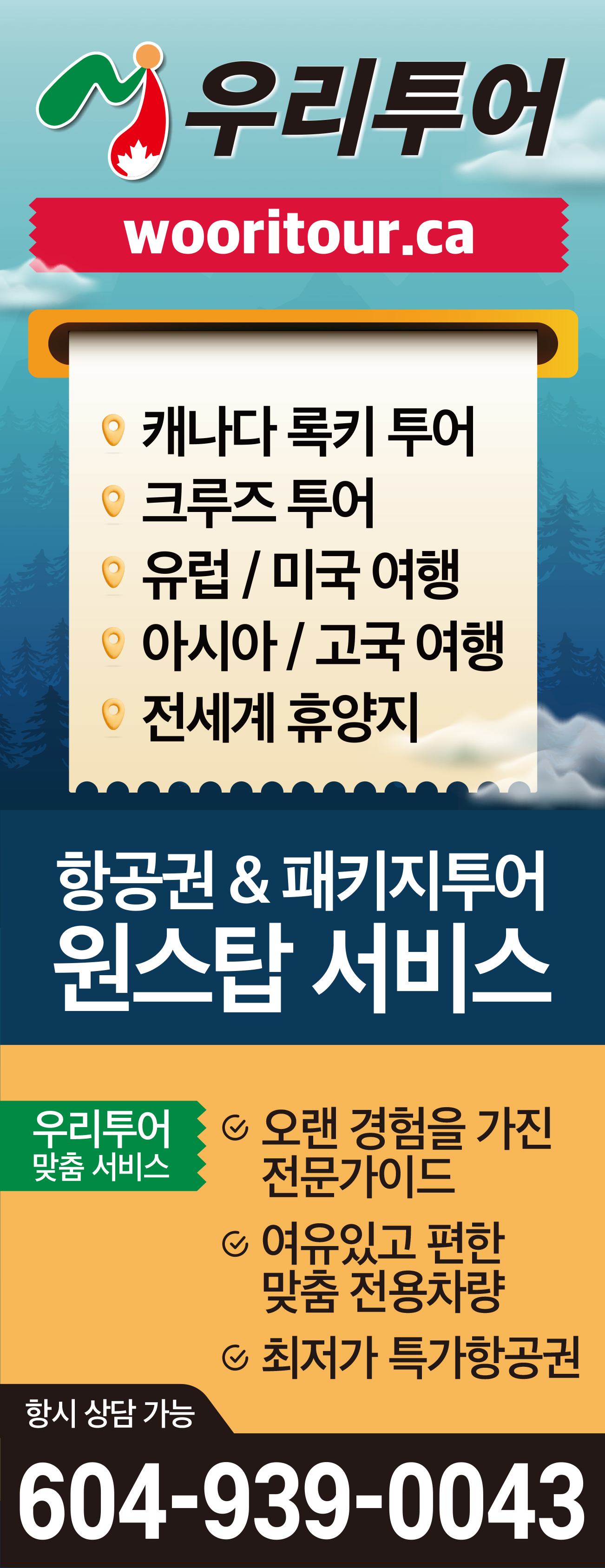제13회 한카문학상 산문(수필)부문 버금상
아들이 분가했다. 처음 집을 떠나 독립해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내 안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허전한 느낌이 훅! 들어왔다. 살인적인 고물가, 렌트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아이가 지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엄마 맘이 먼저였다. 장남에게 은연중 믿고 의존해 왔던 내 기대어진 몸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아이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지혜롭고, 묵묵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자기 앞가림을 잘해 나가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꼴쯤 만나면 오랜만에 친정 찾는 자식 들과의 상봉처럼 반갑고 마냥 유쾌하다. 힘든 일이 왜 없겠나. 고물가의 시대 밴쿠버에서의 살림살이 겪고 있어 익히 알지만 쉽지 않다. 그래도 아이가 잘해 나가고 있고, 나도 딸과 둘만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아들이 차지하던 만큼의 물건들이 빠져나가고, 먹거리가 빠져나가니 냉장고는 속이 보이기 시작했다. 냉동 칸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해졌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뭘 많이 쟁이고
살았다는 게 빠져나간 자리를 보고 새삼 깨달아진다. 아이러니하다….
휑해 진 곳을 바라보면 묘한 안도감이 또 든다. 비워지고 빠져나간 자리는 큰 섭섭함도 없이 시원하기만하다. 난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줄여가고싶다. 남은 날이 살아온 날들 삼 분의 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덜어가는 물건들은 짐이고 치우기엔 버거운 부피의 무게일 뿐이다. 더구나 내가 가진 물건 중 변변한 것은 정말 없다. Suitcase 하나 분량만큼 채울 수 있으려나.
물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삶이었다. 닥친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부를 축적하는 재주가 없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프신 엄마를 대신해 동생 둘도 건사해야 하는 처녀 가장이었음을
늘 밑밥처럼 깔고, 훈장처럼 궁색하지 않을 변명으로 드러냈다. 열심히 산 것만으로 세상의 기준 성공에 못 닿았음을 퉁치려했다. 나에게 있어 틀린 말은 아니다. 주저리주저리 얘기가 길어진다.
여태 이룬 게 없는 내가 이제 뭔가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면 허상인 것 같다. 매일 살아가는 날을 일기처럼 기록해 보는 중이다. 산문 같은 시로, 시 같은 산문으로, 자전적인 짧은 소설로, 지나온 날을 돌아보는 일 말이다.
돈 버는 일이 되어 금광을 찾아가던 골드 러쉬의 시대가 있었다. 돈 명예 이런 건 나와는 소원한 일이다. 캐고 캐서 극미량의 사금만큼이라도 내 지나온 날들의 이야기를 글로 건져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엄마의 생각을 들려주고 프다. 책갈피처럼… 기억 한편에 저장된 낡은 흑백 사진처럼. 그러면 내 살아온 날들의 소임을 다했다고 배짱 좋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딱 거기까지의 나이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