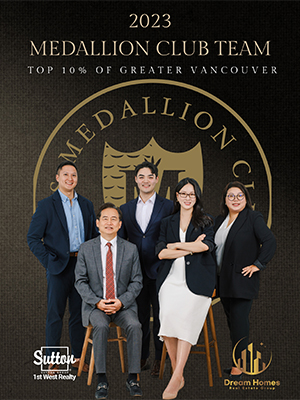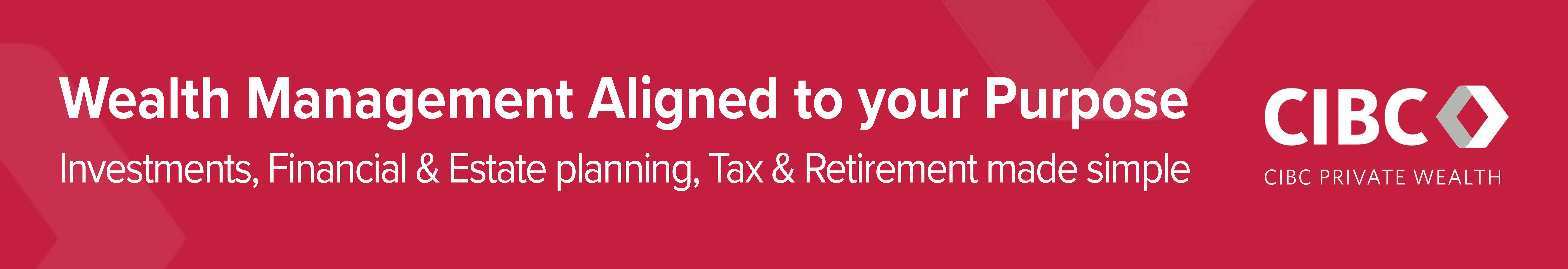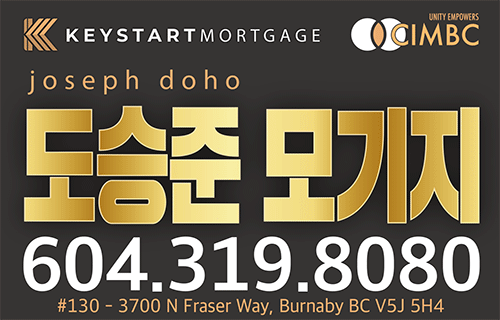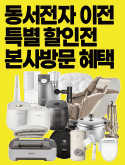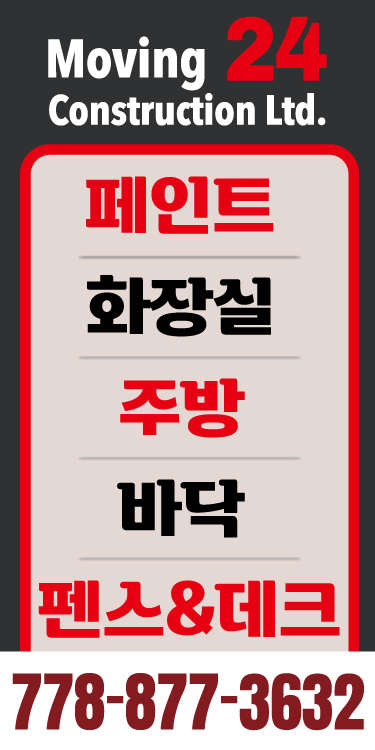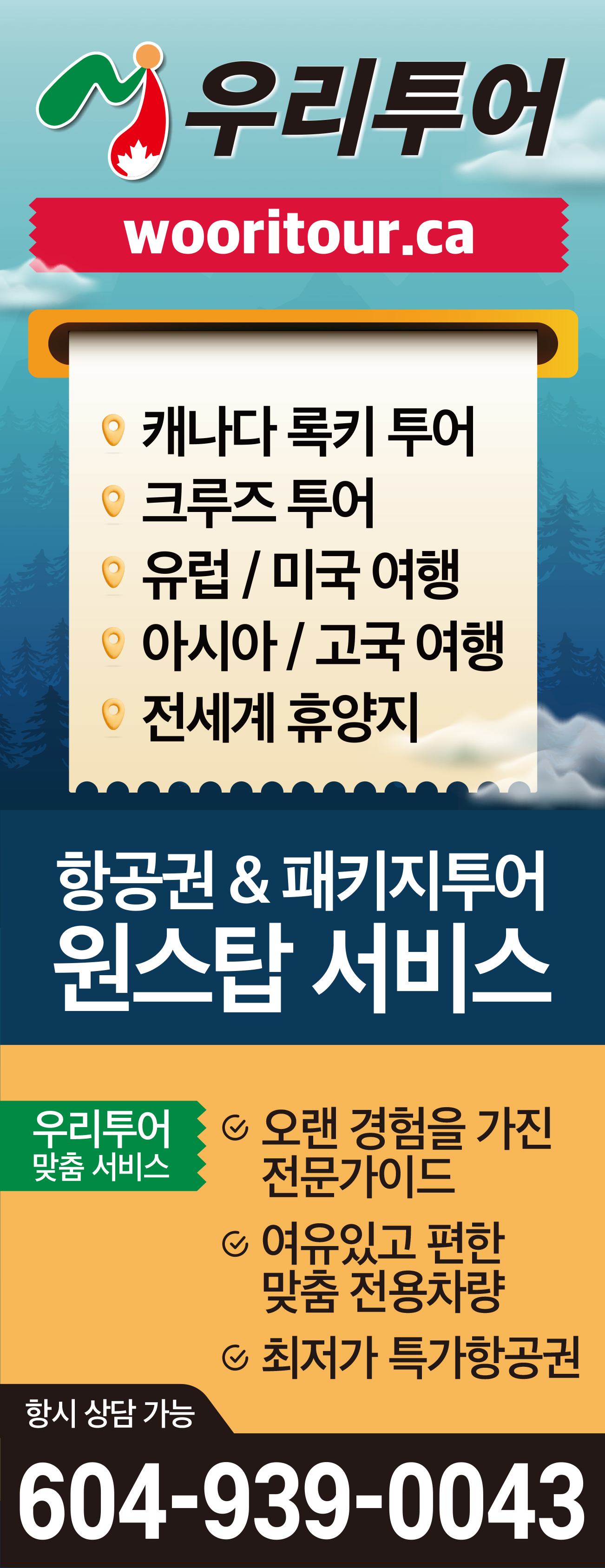김한나 (사)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나는 아이가 없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정말 아이를 갖지 않을 거냐고 묻는다. 생물학적으로 출산하기 어려운 나이에 가까워진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에 대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본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아이가 없는 삶을 생각했다. 부모님은 나와 동생 때문에 몇 번이나 마음을 졸였으면서도 아이가 주는 기쁨을 말한다. 그 기쁨은 매우 크고 달콤해서 서운하고 슬펐던 일도 어느덧 사그라진다며 ‘자식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늘그막에 밥맛이 없어도 아들이 같이 있으면 먹을만하고, 김치 담그는 일이 고돼도 딸이 조잘거리며 소금그릇, 고춧가루 통을 건네주기만 해도 힘이 난다니 도대체 자식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려본다. 나를 닮은 아이가 해맑은 눈에 나를 가득 담는 뭉클함,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나를 통해 누릴 때 얻는 보람, 내가 이루지 못한 성취를 척척 해낼 때 기특함, 내가 온 우주였다가 자신의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을 때 오는 벅찬 감정을 매일 선물로 받는 것일까. 나의 부모는 나를 정성스럽게 키웠고 나는 여러 감동을 선물로 돌려주었다. 이 주고받음이 결국 인생일까.
나를 닮은 아이라면 귀엽고 야무지고 다정할 거라며 즐거운 상상을 해보다가 아이가 있다는 것은 불안한 마음 한 조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쓴’ 사랑이라는 점이 먼저 다가왔다. 나는 비겁하게 그 고귀하고도 ‘쓴’ 사랑을 포기한 것이다. 너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은 사랑, 나를 갈아 먹이고 진이 빨려나가도 더 주고 싶은 유일한 관계. 신이 모든 곳에 갈 수 없어 엄마를 보냈다는 말처럼 그 사랑은 거룩하다. 그 사랑을 빨아먹고 자랐으면서 더 이상 내리사랑하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미안하다.
나는 평생 아이가 없을 테지만 내게는 글이 있다. 글을 통해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재미를 느꼈다. 아이처럼 품은 글이 활자로 생산될 때 생긴 존재로서의 완전함은 누군가의 아이가 부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를 살린다. 나를 닮은 글을 낳을 때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남들 보란 듯 자랑할만한 것이 없어 초라해질 때는 써온 글들이 나를 위로했다. 부모가 아이에게 담듯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바람을 나는 글에 담았다. 글을 품고 키우고 쓴 글에 기대어 사는 삶이 나 닮은 물질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만큼 유의미하게 다가왔다.
나는 아이가 없다. 키워낸 생명이 없어 내가 죽어도 나를 닮은 한 사람 세상에 남긴다는 안도감을 느낄 리 없고, 훗날 늙고 약해져도 찾아올 자식 하나 없는 것이 헛헛할지 모른다. 이 모든 슬픔을 감수하며 읽는 이가 고작 몇몇 인 글을 남기는 게 무슨 의미 있는 거냐고 묻는다면 글을 씀으로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고 마주한 사람과 맡겨진 일에 진심을 다했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글은 마음만큼 풀리지 않아 좌절하고 영원히 무명할 것 같은 문장에 속이 쓰리지만 그런 날에도 쓴다는 희망으로 살아간다. 글을 쓸 수 있어 삶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열차게 살아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삶도 괜찮다고 믿는다.
나는 아이가 없다. 내게는 글이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한나의 다른 기사
(더보기.)
김한나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