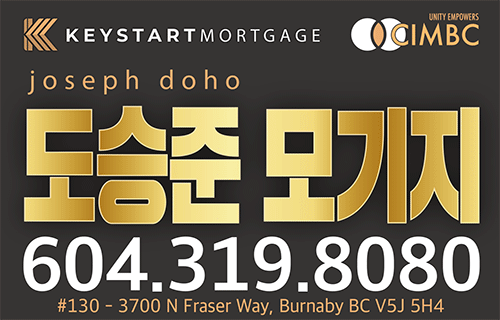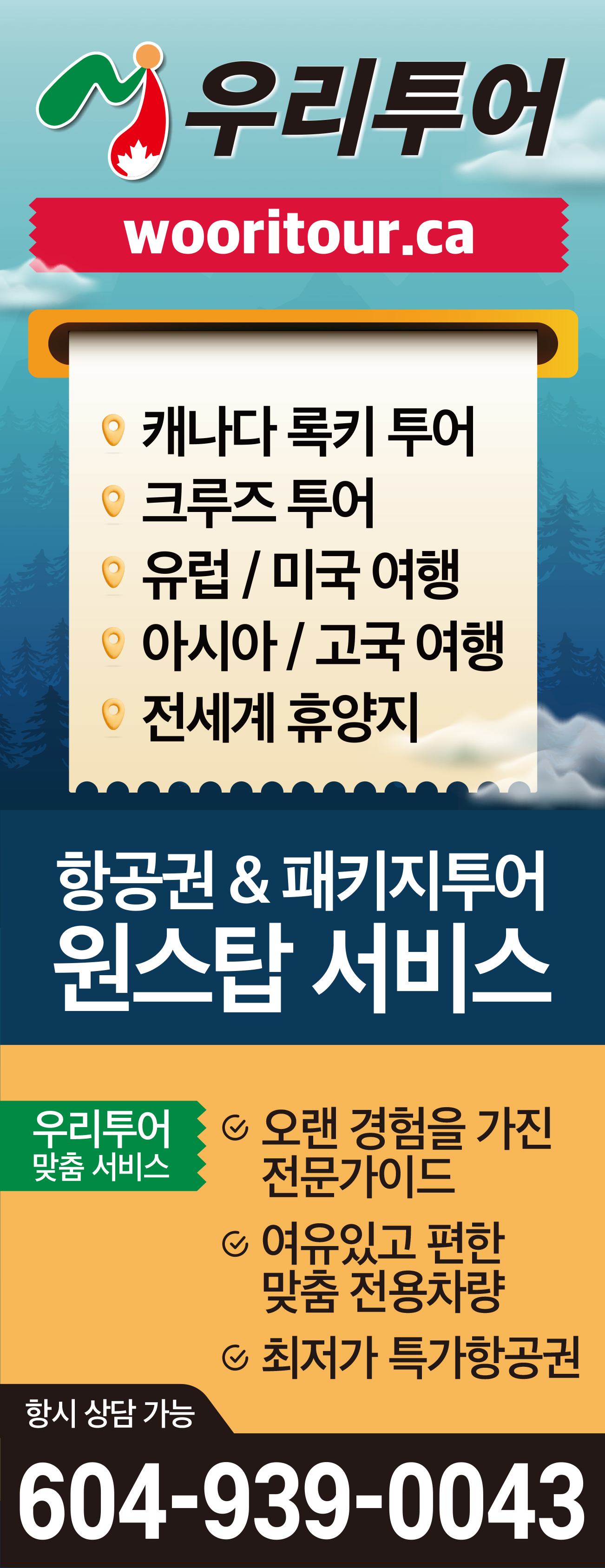정성화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학교에 매일 빵이나 과자를 가져와서 자랑하듯 먹는 아이가 있었다. 어쩌다가 사탕 몇 개 정도의 군것질을 하던 우리에 비해 너무나 풍족해 보였다.
어느 날, 친구들이 그 아이에 대해 수군거리는 걸 들었다. 나이 육십이 다 된 그애 아버지가 자전거로 막걸리 배달을 다니고, 그애 엄마는 집에서 비단 홀치기를 한다고 했다. 홀치기는 육· 칠십 년대에 유행하던 부업으로, 수많은 점들이 찍힌 비단을 오비틀에 걸고 꾸리를 돌려 그 점 하나 하나를 홀치는 일로써 고된 작업이었다. 그애가 곱게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하교길에 그애 아버지를 봤다. 커다란 짐자전거에 막걸리 통을 네 개나 매단 채 거의 선 자세로 힘겹게 페달을 밟고 있었다. 목에 두른 타월은 꾀죄죄했고 반백의 머리칼은 성글었다. 자전거가 빨리 달릴수록 고리에 매단 막걸리 통들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뒤따르던 차가 ‘빵’ 하고 클랙슨을 울리자, 자전거는 길 한 쪽으로 비켜서며 크게 휘청거렸다.
그 다음 날, 2교시를 마치자마자 빵을 꺼내 먹고 있는 그애에게 다가갔다.
“어제 너거 아버지 배달 나가시는 거 봤다. 니는 너거 엄마 아버지 생각은 안 하나?”
빵을 입에 문 그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자리로 돌아와 그애 쪽을 보니 책상에 엎드려 우는 것 같았다. 반의 여론이 그애 편으로 기울었다. 그애의 군것질을 두고 수군대던 아이들이 이젠 나를 두고 수군대었다. 우리 집이나 그애 집이나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그럼에도 군것질을 일삼는 그애가 철이 없어 보여 그저 한 마디 했을 뿐이었다. 아니, 내 속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군것질거리로 아이들을 주위에 불러 모으는 게 얄미워서, 그애가 두르고 있는 ‘포장지’를 찢어발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애는 자기 아버지가 막걸리 배달을 다니는 걸 반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다음 날 저녁, 그애를 만나러 갔다. 막걸리가 허옇게 말라붙은 자전거가 대문 옆에 세워져 있었다. 그애가 대문 밖으로 나왔다. 친구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왔다가 나를 보고는 실망과 어색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제 일 미안하다.”
“······.”
그애는 얼굴을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내가 그애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제야 실감났다. 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존심이 내 목젖을 움켜쥐었다. 그때 그애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알겠다.”
불투명한 말이었다. 아직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은 아니지만 미안해 하는 너의 마음은 알겠다는 의미로 들렸다.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세 개의 문을 통과시켜 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라고 묻는 문이다. 내가 그 아이에게 한 말은 첫 번째 문만 통과했다. 그애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했다.
사과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다. 각자의 생체리듬이 다르듯, 우리 ‘감정시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 오해가 풀리는 데 걸리는 시간, 아픔을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 사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상대를 원망할 일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내가 사과를 떼어 먹은 적도 있다. 쑥스러워서,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상대방이 거절할까 봐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 대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이 ‘나 못났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줄 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문다.
그러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나면 저절로 나를 돌이켜 보게 된다. ‘내가 그동안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거나 원망했던 건 아닐까. 정말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을까?’하며. 때로는 사과를 주고받은 후에 한결 돈독한 정이 생기기도 한다. 사람의 사과에도 과일 사과처럼 작은 씨가 들어있어서 새로운 정을 싹 틔우게 해주는지도 모른다.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다짐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짓은 하지 말자고, 그리고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정성화의 다른 기사
(더보기.)
정성화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