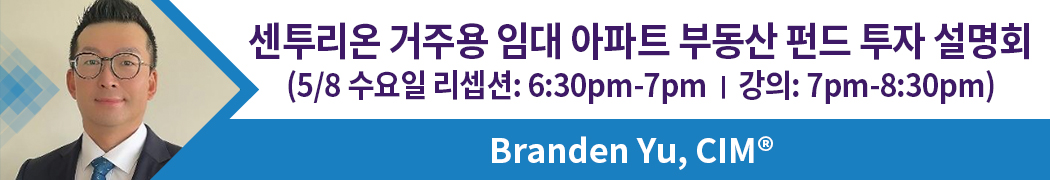11월로 접어드니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계속 내린다. 회색의 하늘과 떨어지는 빗소리, 바람소리에 마음을 내 맡기며 우울한 날들이 계속된다. 10월은 화려한 나무들의 성장으로 아름다웠고 잎들은 아픔을 핏빛으로 토해내고 모든 걸 내려놓았다. 빨간색 노란색 아름다운 단풍과 파란 하늘이 언제나 내 곁에 남아 있는 듯 바라만 봐도 행복했다.
빗줄기 속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본다. 붉디붉은 단풍잎들이 내리는 비와 바람 속에서 춤추듯이 땅으로 내려앉는다. 한 순간에 몸을 버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비와 빨간 단풍이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지 한참을 바라본다.
아무런 색깔도 지니지 못하고 헐벗은 것 같은 11월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남겨주려는 걸까? 나무들은 고통으로 초록을 삼키고 무채색으로 우리에게 무념무상의 세계를 알려준다.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인내로 얻을 수 있는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며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나무들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해 고민 할 수 있는 소중한 날들을 보낸다. 먼 길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 새삼 서글퍼지며 해마다 새로 태어나는 나무들이 더 고귀하고 부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들만 가득한 거리를 걷는다. 잿빛 하늘 아래 헐벗은 앙상한 나무들이 오히려 홀가분해 보인다. 아직 버리지 못한 잎들을 힘겹게 껴안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 버리지 못한 내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는 듯 부끄럽다. 비에 젖은 잎들은 물에 젖은 채 편안해 보인다. 다 내려놓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유 없이 슬퍼지고 가슴은 아파오고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서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면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한다.
속절없이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본다. 유난히도 많은 죽음을 배웅하면서 인생의 허무를 새삼 느끼며 이렇게 숨 쉬고 살아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하루하루를 즐겁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충만한 행복감을 조금은 알 것 같은 나날이다.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인연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면 내 마음은 어느새 고향 길로 달려간다. 가을 안개 가득한 지리산 노고단, 제주도 의 갈대밭으로 ……. 거기엔 잊지 못한 사람의 얼굴도 보인다.
11월은 아프다, 그래서 12월의 마중물이다. 곧 다가올 12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모든 것이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면 마음은 왠지 바빠지고 마무리 하지 못한 많은 일과 또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또 기억 속에서 맴 돌던 사람들로 머릿속은 어지럽게 과거와 현재를 맴돈다. 그리운 친구들, 보고 싶은 얼굴들이 떠오르면 난 더 이상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다는 느낌으로 행복해진다. 회색의 그림에서 덤으로 하얗고 깨끗한 도화지 한 장을 선물 받은 그런 느낌이다. 새롭게 그려 넣을 수도 있고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위에 처음 찍어보는 내 발자국처럼 설렘이 가득하다. 무엇이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은 바빠진다.
사람들은 정답게 오가며 사랑을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서로를 아껴준다. 첫 눈이 내리면 그때부턴 뭔지 모르는 뿌듯함으로 가득차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면서 나도 덩달아 순백의 세상 속으로 한 발 내 디딘 느낌이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가장 분주한 느낌으로 주위를 온통 들뜨게도 만들고 화려하면서도 가장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매다 똑 같은 생각과 준비로 맞이하지만 올핸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부푼 그런 날들을 보낸다. 12월, 지나온 한 해를 후회 없이 털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기로 하자. 흰 눈이 쌓인 아름다운 풍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파묻혀서 내면의 세계까지도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길 기도하는 그런 12월을 기대해본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베로니카의 다른 기사
(더보기.)
김베로니카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