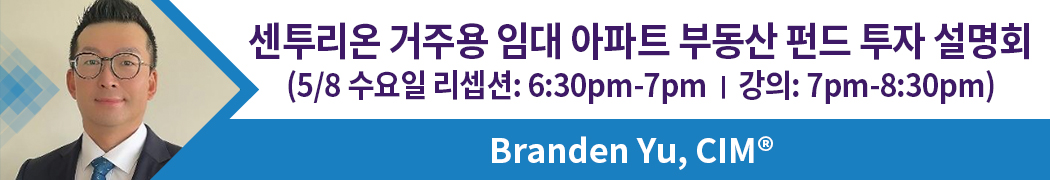박오은 / 캐나다 한국문협 이사
꽈당 미끄러졌다. 언젠가 밴쿠버에 눈이 많이 온 적이 있다. 커뮤니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사정없이 넘어졌다. 바닥이 살짝 얼어 매우 미끄러운 블랙 아이스 상태,
무심히 발을 내딛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아주 심하게 찧었다. 핸드백과 책이 하늘로 솟고 내
몸은 그대로 발라당 나가떨어졌다. 클리닉에 갔다. 가정의는 골절도 아니고 근육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털코트를 입어 천만 다행이라며 행운의 털코트이니 눈 오는 날이면 꼭
애용하란다. 또한, 가정의는 나에게 굽이 낮은 구두를 신었더라면 그렇게 심하게 넘어지진
않았을 거라며 좀 더 낮은 구두를 신을 것과 천천히 행동하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운동신경이
좋고 민첩한 편이어서 그동안 날아다녔다.
구두 수선점에 들러 부츠, 하이힐, 샌들 할 것 없이 굽을 3-4cm 남기고 모두 잘라 달라고 했다.
구두 키를 낮추니 내 젊음도 달아나는 기분이었다.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이키
매장을 지나는데 ‘어머나, 부츠 스타일의 운동화라니 ...’ 적당한 굽의 날씬한 운동화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제부터 운동화와 친해지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좀 거한 가격이지만 집어
들었다.
키가 작아진 내 구두들이 신발장에 나란히 정렬해 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준 키와 자존심이
속절없이 잘려 나갔다. 낮은 굽은 키가 작아 보이고 왠지 몸이 뒤로 당겨지는 것 같아 좋아하지
않았다. 학교 다닐 때도 늘 굽 있는 부츠를 신고 다녔다. 등산 갈 때 외에는 운동화를 신어 본 적이
없다. 결혼 후에 아기를 가졌을 때도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을 본 시어머님이 운동화를
신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셔서 시댁에 갈 때만 굽이 좀 낮은 구두를 신을 정도였다.
어느 의학 드라마를 보니 주인공의 구두가 칼 힐이다. 수련의가 칼 힐을 신다니. 수련의
과정은 거의 중노동인데 그 높은 구두를 신고 어찌 견딘 단 말인가. 운동화로 버텨도 다리가 붓고
발바닥이 아프다. 의사인 내 친구가 있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신발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비싼 운동화를 신고 늘 뛰어다닌다. 수련의 할 때 그 친구를 보러 가면
잠시라도 신을 벗어 놓는다. 맨발로 수다를 떨다가, 병원으로 들어갈 때야 운동화를 신을 정도다.
그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신발을 봐도 알 수 있다. 나도 구두나 운동화를 고를 때는 늘
신경을 쓰는 편이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늘 달리기 선수로 뽑혔다. 내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큰언니가 특별히 만들어준, 운동화보다 가벼운 헝겊 덧버선을 신고 나는 듯이 뛰었다.
우리반 1등은 물론 계주 달리기에서도 전체 우승을 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듬해
운동회가 있었다. 그때도 굽이 있는 부츠를 신고 있었지만 학부형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 그렇게
잘도 뛰고 못 오를 곳이 없었던 내 발에 일이 닥친 것은 3년전이다. 서울에 갔다가 오른 발을 다쳐
몇 달을 고생했는데, 1년후 여행 중에 왼 발을 다쳐 수개월간 또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한참을 의기양양 겁도 없이 오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호흡을 고르며 삶을 돌아보게 된다.
하필이면 그런 생각을 발을 다치고 나서야 하게 됐다. 그로 인해 겉치레보다는 편안함과 안전한
길을 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발장에 도열한 신발들의 서열이 무너지고 있다. 긴 드레스를 입을
때나 정장 수트를 입을 때 신는, 맵시 있는 하이힐이 저만치 밀려나 있다. 요즘 내가 집어 드는
건 가죽이 부드럽고 굽이 중간 정도이고 바닥이 편안한 고만고만한 앵클 부츠들이다. 내가
다니던 커뮤니티 센터 옆에 사스(SAS)구두 가게가 있다. 차를 그 곳 주차장에 세우기에 가끔은
주인과 얼굴을 마주친다. 그는 내 부츠를 보고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눈다. 사스 신은
굽이 1-2센티 정도이고 가죽이 부드럽고 이음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이기에 여성이길
포기한 일명 ‘여포신발’이라고 한단다. 운동화도 ‘여포신’도 거부하고 싶은 나의 발악이
처연하기만 하다.
사람은 살아가며 유효기간이 짧더라도 계획을 세운다. 또한 살다 보면 정점을 찍을 때가 있다.
새로운 것에 눈 뜬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기도 하다. 그것이 도전하는 젊음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노경老境이라면 차원이 다르다. 이제는 촘촘한 삶보다 삼베처럼 엉성하게 그냥
설렁설렁 살아내자. 온몸으로 저항하는 나이에 맞설수는 없다. 긍정이 언제나 어려운 길이지만
스러지는 목마름이라고 탓하지는 말아야지.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박오은 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박오은 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