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협밴쿠버지부 회원기고/수필
딸아이의 넓은 뒷 뜰에는 민들레가 많았다.
작년 여름에 31도의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그리도 땀흘리며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내려
애썼던 민들레가 이제는 시월의 쌀쌀한 바람에 한풀 꺾인 자세로 노오랗던 꽃 하나 없이
파란 잔디들 사이에 촘촘히 숨어 있었다. 비 온 뒤끝이라 땅이 부드러워 쏙쏙 캐내기가
수월했다. 약 한번 한적없으니 완전한 올개닉 식품이다. 하도 많아서 네 다섯시간 동안
캐낸것이 큰 함지박에 꾹꾹 눌러 담아도 자꾸만 밖으로 떨어졌다.
하나 하나 캐낼때 죽은 잎들과 잔 뿌리와 흙을 털어 깨끗하게 다듬어서 다시 손볼 일이
없었다. 살랑 살랑 부는 가을 바람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잔디밭에 덜퍽 앉아 뽑아낼때
마다 은근히 나는 향긋한 민들레와 흙 냄새를 맡으며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들로 밭으로 헤집고 다니며 나물캐기를 좋아했던 나는 또래중에서 으뜸가는 나물꾼이었다.
쓴 맛을 없애기위해 몇번이나 꼼꼼하게 씻고 헹구어 옅은 소금물에 푹 잠기도록 무거운
돌로 눌러 놓았는데 이튿날 작은 뿌리 하나를 맛보니 쓴 맛이 그대로였다. 누르스름하게
우러났던 물을 버리고 다시 정갈하게 씻어 소금물에 사흘동안 잠궈두니 쓴 맛이 거의 가셨다.
민들레는 고들빼기의 사촌이라서 내 어머니가 담그신 고들빼기 김치를 연신 생각해내며
파, 마늘, 생강, 꿀과 설탕, 통깨와 밤, 멸치젓 그리고 찹쌀풀을 준비 하였다.
" 쪽파를 고들빼기 양 만큼 넣어야혀. 꿀 넣지 말고 조청을 넣고 깨는 금방 볶은것을 넣어야
제맛이 나는거여. 글고 젓은 푹삭힌 황새기젓을 푹푹 달여 많이 넣어야제. 고들빼기가 뭔
맛이 있다냐? 다 양념 맛이제." 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말씀이 귓가에 쟁쟁했다.
쪽파와 황새기젓(조기새끼젓), 조청은 여기에서 구할 수 없었다. 커다란 밤 다섯개를 껍질
벗겨 허옇게 고운채를 썰어넣고 고춧가루를 위시한 모든 양념을 쏟아부은 후 정성스럽게
뻘건 고무장갑 낀 손으로 버무렸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번 맛본 민들레가 소태 맛이었다.
놀라서 살펴보니 설탕대신 소금을 넣은 것이었다. 칸칸이 붙어있는 양념통 앞에 븥여진 이름들
즉 sugar 와 salt를 언뜻 s 자만 보고 혼돈한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한글로 써 놓을 것이지.'
하고 불평을하다 생각하니 설탕과 소금도 ㅅ자가 공통이라 혼돈하기 쉬운건 마찬가지여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다. 아직도 녹지않은 덩어리 진 하얀 소금을 수저로 떠내며 이제 이 김치는
다 틀렸다고 구시렁거리며 찬물을 부어 덜 짜게 하려고 애를 썼다. 몇번이나 맛을 보면서
자료가 달라도 어머니께서 만드셨던 고들빼기 맛과 비슷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주무르며
뒤섞었다. 꾹꾹 눌러 담은 김치가 커다란 김치통에 가득차자 빨간 빛깔과 함께 속에 들어있는
김치가 울긋 불긋한 모습을 보이며 맛갈스럽게 시야에 들어왔다.
저녁 밥상에 차려진 민들레 김치를 딸이 먹기전에 " 야야, 내가 설탕대신 소금을 넣어 엄청 짜다."
라고 하니 한번 먹어본 딸이 "약간 짜네요. 그래도 파하고 같이 먹으니 맛있어요." 라고 격려해
주었다. 다행히 많이 넣은 파는 소금기가 없었다.
아무튼 처음으로 담근 고들빼기 사촌 민들레 김치는 그런대로 딸아이와 나에게는 유별나게
새로운 반찬이었다. 다른 식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품목이기도 했다. 며칠 후 프랑스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인 젊은 커플에게 이 김치를 나누어 주었더니 맛있었다고 하면서 자료가 무엇인지
물어서 '댄디라이온스'라고 했더니 아주 놀라워하며 감탄을 연발했다.
내년에는 몸에 좋다는 민들레 김치를 잘 담글 수 있을까?
작년 여름에 31도의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그리도 땀흘리며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내려
애썼던 민들레가 이제는 시월의 쌀쌀한 바람에 한풀 꺾인 자세로 노오랗던 꽃 하나 없이
파란 잔디들 사이에 촘촘히 숨어 있었다. 비 온 뒤끝이라 땅이 부드러워 쏙쏙 캐내기가
수월했다. 약 한번 한적없으니 완전한 올개닉 식품이다. 하도 많아서 네 다섯시간 동안
캐낸것이 큰 함지박에 꾹꾹 눌러 담아도 자꾸만 밖으로 떨어졌다.
하나 하나 캐낼때 죽은 잎들과 잔 뿌리와 흙을 털어 깨끗하게 다듬어서 다시 손볼 일이
없었다. 살랑 살랑 부는 가을 바람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잔디밭에 덜퍽 앉아 뽑아낼때
마다 은근히 나는 향긋한 민들레와 흙 냄새를 맡으며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들로 밭으로 헤집고 다니며 나물캐기를 좋아했던 나는 또래중에서 으뜸가는 나물꾼이었다.
쓴 맛을 없애기위해 몇번이나 꼼꼼하게 씻고 헹구어 옅은 소금물에 푹 잠기도록 무거운
돌로 눌러 놓았는데 이튿날 작은 뿌리 하나를 맛보니 쓴 맛이 그대로였다. 누르스름하게
우러났던 물을 버리고 다시 정갈하게 씻어 소금물에 사흘동안 잠궈두니 쓴 맛이 거의 가셨다.
민들레는 고들빼기의 사촌이라서 내 어머니가 담그신 고들빼기 김치를 연신 생각해내며
파, 마늘, 생강, 꿀과 설탕, 통깨와 밤, 멸치젓 그리고 찹쌀풀을 준비 하였다.
" 쪽파를 고들빼기 양 만큼 넣어야혀. 꿀 넣지 말고 조청을 넣고 깨는 금방 볶은것을 넣어야
제맛이 나는거여. 글고 젓은 푹삭힌 황새기젓을 푹푹 달여 많이 넣어야제. 고들빼기가 뭔
맛이 있다냐? 다 양념 맛이제." 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말씀이 귓가에 쟁쟁했다.
쪽파와 황새기젓(조기새끼젓), 조청은 여기에서 구할 수 없었다. 커다란 밤 다섯개를 껍질
벗겨 허옇게 고운채를 썰어넣고 고춧가루를 위시한 모든 양념을 쏟아부은 후 정성스럽게
뻘건 고무장갑 낀 손으로 버무렸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번 맛본 민들레가 소태 맛이었다.
놀라서 살펴보니 설탕대신 소금을 넣은 것이었다. 칸칸이 붙어있는 양념통 앞에 븥여진 이름들
즉 sugar 와 salt를 언뜻 s 자만 보고 혼돈한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한글로 써 놓을 것이지.'
하고 불평을하다 생각하니 설탕과 소금도 ㅅ자가 공통이라 혼돈하기 쉬운건 마찬가지여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다. 아직도 녹지않은 덩어리 진 하얀 소금을 수저로 떠내며 이제 이 김치는
다 틀렸다고 구시렁거리며 찬물을 부어 덜 짜게 하려고 애를 썼다. 몇번이나 맛을 보면서
자료가 달라도 어머니께서 만드셨던 고들빼기 맛과 비슷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주무르며
뒤섞었다. 꾹꾹 눌러 담은 김치가 커다란 김치통에 가득차자 빨간 빛깔과 함께 속에 들어있는
김치가 울긋 불긋한 모습을 보이며 맛갈스럽게 시야에 들어왔다.
저녁 밥상에 차려진 민들레 김치를 딸이 먹기전에 " 야야, 내가 설탕대신 소금을 넣어 엄청 짜다."
라고 하니 한번 먹어본 딸이 "약간 짜네요. 그래도 파하고 같이 먹으니 맛있어요." 라고 격려해
주었다. 다행히 많이 넣은 파는 소금기가 없었다.
아무튼 처음으로 담근 고들빼기 사촌 민들레 김치는 그런대로 딸아이와 나에게는 유별나게
새로운 반찬이었다. 다른 식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품목이기도 했다. 며칠 후 프랑스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인 젊은 커플에게 이 김치를 나누어 주었더니 맛있었다고 하면서 자료가 무엇인지
물어서 '댄디라이온스'라고 했더니 아주 놀라워하며 감탄을 연발했다.
내년에는 몸에 좋다는 민들레 김치를 잘 담글 수 있을까?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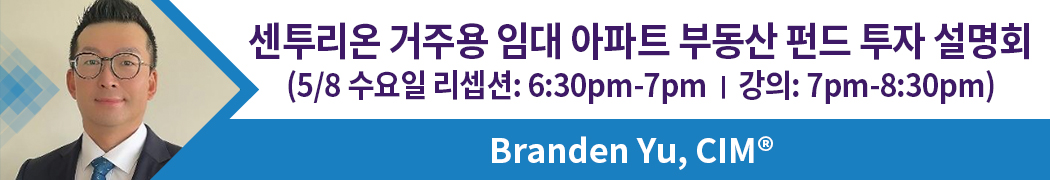












 박인애의 다른 기사
박인애의 다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