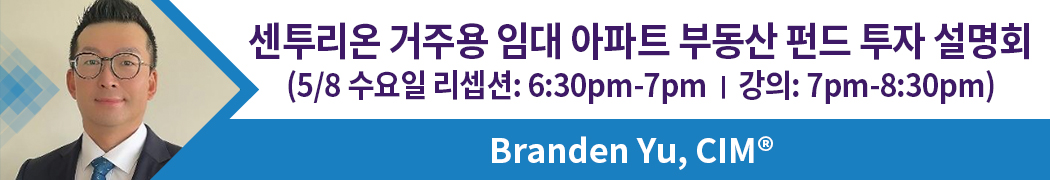산행 에티켓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산다는 것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개체 생명체들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사람과 사람의 ‘사이’ 즉 사이 ‘간’(間)을 배제한 절대적 개체의 ‘인’(人)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인 인간(人間)이란 철학적 명제로 귀결된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결국 나만 존재하고 나만 잘 살면 그뿐이라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이타적인 사람인 것이다. 공자의 중심 사상인 ‘인’(仁)이란 글자를 파자(破字)해 봐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으로 풀이되니 그 심오한 철학적 의미가 절로 드러난다. 공맹이 주장한 유도란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여하히 할 것이냐를 고민한 결과로 얻은 것이 바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며 맨 가운데 위치한 글자인 “예”(禮)는 한마디로 말해 “사회적 질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심미적 개념이다. 예절, 예의에 어긋난다는 말은 바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개판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사서삼경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산을 가면서 지켜야 할 질서인 ‘산행지례’(山行之禮)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수십명이 떼를 지어 가는 그룹산행을 가든 혈혈단신으로 올라가는 단독산행을 가든 거기엔 분명히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 여기서 내가 언급한 에티켓이란 산행중 동료 산행인들과 지켜야할 예의 범절이 아닌 대자연과 산행인 사이의 관계를 정립함이며 지켜야 할 질서이다. 산을 오래 다니다 보면 야생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름 모를 풀 한포기, 야생화 한 송이가 그렇게 귀엽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경지에 자기도 모르게 진입하고 만다. 아니 정말 산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은 물론이요 신비함까지 느껴지면서… 자연과 내가 한 몸이라는 소위 물아일체(物我一體)를 한번쯤은 체험하게 된다. 더러는 청초한 풀꽃 한송이에 비해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추한 인생을 살아 왔는가라는 황연대오(恍然大悟)의 순간도 없잖아 있는 것이다.
어느 산정상 초원에 위치한 주립공원의 안내 입간판에 쓰여있길 ‘모진 북풍한설과 눈사태를 이겨내고 한 송이 야생화를 피우기 위해서 25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흐른다’는 설명을 읽은 사람치고 초원을 짓밟을 사람은 없는 것이다. 필자로선 초원사이에 만든 좁은 오솔길이 황송하게 너무 넓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가 되었다고나 할까. 대자연이 아무리 무지막지하게 험준하고 거칠지라도 산이라는 대자연이 싣고 있는 모든 생태계(ecosystem)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묘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대자연에 난입한 인간의 무지로 인해 미묘한 균형이 깨어진 생태계가 정상을 회복하는데는 수 십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누가 자연을 훼손할 수 있겠는가. 어디 그뿐이랴. 청정무비의 옹달샘이 흘러가고 청초하기 이를데 없는 산자락에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친 쓰레기 부스러기와 깨어진 유리병을 볼때 심미적 분노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필자가 가장 꼴불견이며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끼는 것은 산자락에 버려진 허연 화장지를 목도할 때이다. 볼일은 봤으면 구덩이를 적어도 30센티 이상 파고 완벽하게 처리하며, 소변은 적어도 흐르는 물에서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엄연한 하이커들의 불문율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할 예의는 보이는데서 하는 것이지만 대자연과 인간사이에 지켜야할 예의는 보이지 않는데서 지키는 불문율이니 그 자율성의 격조와 깊이를 우리는 인지해야한다. 산행중 필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게시된 영문 캣치프레이즈를 늘 의미심장하게 감상한다. “싸가지고 들어간 것은 그대로 싸가지고 나오라”(Pack it in. Pack it out). “발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Don’t leave anything behind but your foot prints). “추억만 가져가지 그외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Don’t take out anything but your memory).
정말로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냉소적인 경구에 훈도되기 이전에 자신을 삼가는 품격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한 품격은 몰지각하게 바위나 나무에 ‘잘난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대자연을 새기는 일이다. 문득 중용 제 1 장의 그 구절이 머리를 스친다. ‘숨은 것 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없고, 작은 것 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군자는 그 홀로 있음을 삼가야 하는 것이다.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 그렇다 산행 에티켓은 바로 군자의 도리에 다름아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