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목일 / 캐나다 한국문협 고문
김밥 한 줄은 말줄임표(……)
간단명료하다. 설명이나 사족을 붙이지 않는다. 말의 울림이다. 침묵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 가슴 속에서만 숨 띄는 함축언어이다.
김밥 한 줄은 가장 간소한 한 끼이다. 30초 만에 차려진다. 김 한 장을 펴고 밥을 담은 다음 준비해둔 당근, 부친계란, 볶은 햄, 우엉, 시금치. 단무지를 넣고 말아 올리면 된다. 은박지를 깐 접시 위에 놓인 검은 김밥 한 줄….
김밥 토막들은 대열을 벗어나지 않고 반듯하다. 움직이는 듯 긴장과 생동감이 있다. 달려가는 전철 같다. 맥박이 뛰고 삶의 숨소리가 들려온다. 마음 놓고 먹는 따뜻한 밥과는 다른 느낌이다. 시계 초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심장이 띄는 지금 이 순간과 공간을 의식하게 만든다.
목요일 아침은 지하철역 부근의 김밥 집에서 식사를 한다. 30분 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가기 위해서다. 탁자 위에 김치단지와 단무지단지가 있다. 손님들이 알아서 접시에 담아 먹는다. 식사대금 2천원을 통 안에 넣으면 된다.
김밥 집은 24시간 열려 있다. 김밥 집 탁자에 앉으면 편안하다. 이따금씩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가슴을 울린다. 아침 손님들은 말쑥한 차림의 20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부근의 백화점이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다.
가게 안에는 50대~60대 3인의 여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김밥을 만들고 있다. 김밥 집이지만 음식 메뉴는 수십 가지에 달한다. 김밥 집은 언제나 열려 있는 밥집이다. 김밥 한 줄은 고속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고마운 식사 한 끼이며, 삶의 최소 열량이기도 하다.
김밥 한 줄은 나에겐 충분한 양(量)이다. 반(半) 줄을 시키는 사람도 있다. 김밥 한 줄의 식사는 말줄임표(……)만은 아닐 듯싶다. 간명한 한 끼의 식사에는 첨예한 의식의 맥박이 뛰고, 삶의 숨결이 느껴진다. 편안한 밥을 먹을 때는 반찬 투정도 해보지만, 김밥 한 줄을 먹을 때는 엄숙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김밥 한 줄은 발설하지 못한 말들의 표정이다. 다 토로하고 말면, 더 허전해질까봐 간절한 말 한 마디만 남겨 놓은 한 줄의 문장을 본다. 마음속으로 오래 남는 여운이나 향기, 그리움은 완료가 아니다. 김밥 한 줄을 먹으며 허위, 군더더기, 과장, 허세, 치장이 없는 문장을 바라본다.
김밥 한 줄을 앞에 놓고 하루의 출발선에 선다.
어떻게 김밥 한 줄 같은 문장에, 드러내지 않은 속내를 전할 수 있을까. 숨 가쁘게 전철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김밥 한 줄은 발설하고 싶지 않은 나의 절실한 삶의 말줄임표(……)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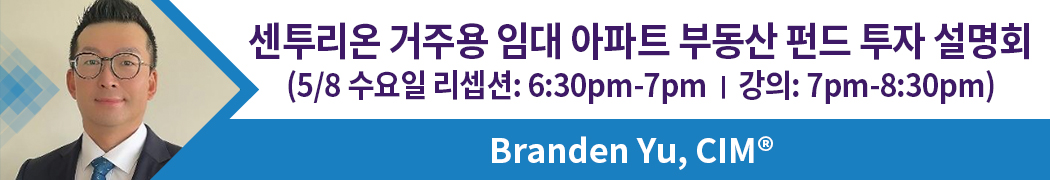












 정목일의 다른 기사
정목일의 다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