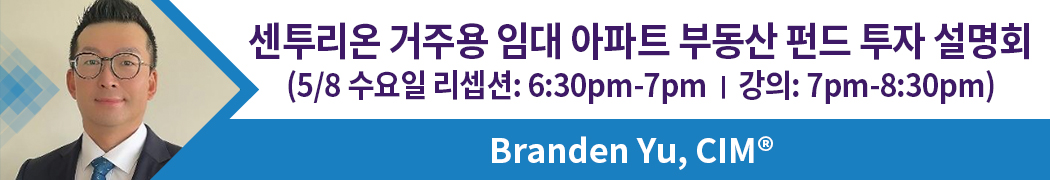최민자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도킨스와 하라리, 베르베르와 이정모가 사이좋게 어깨를 밀착하고 있다. 사이좋게?인지는 사실 모르겠다. 시비를 걸거나 영역다툼을 하지않고 시종 점잖게 어우러져 있으니 나쁜 사이는 아닌 것 같달 뿐.
책들은 과묵하다. 포개 있어도 붙어 서 있어도 일생 서로 말을 걸지 않는다. 책들은 다 수줍음을 탄다. 자리를 바꿔 달라 보채지도 않고 어디로 데려가 달라 꼬리치지도 않는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양산하는 다중 미디어들이 창궐하는 시끌시끌한 시대에 이렇듯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매체들이 한정된 공간을 점유하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니, 이사할 때마다 읽지도 않는 책들을 끌고 와 별다른 고민 없이 벽면 하나를 통째 내주는 내 허영심 덕분일 것이다. 세상은 넓고 읽을 책은 많아서 한번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해묵은 책들이 다양하게 꽂혀 있는 벽만만큼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아날로그적 인테리어도 흔하지는 않다.
앞서 간 사람들이 체득한 내상의 흔적들이 검박한 활자 안에 정박해 있는 책들 앞을 모처럼 느긋하게 서성거려 본다. 축축한 물기가 스며 나던 시인의 유고집과 전아한 기품이 배어나던 스승의 산문집도 오랜만에 들추어 본다. 한때 눈이 맞았으나 멀어져 버린 사랑을 만난 듯 붉은 줄이 죽죽 그어진 문장에도 이제 더는 가슴이 뛰지 않는다. 한 줄의 시구詩句에서 풍겨 나오던 돌연한 향기에, 슬프고 따뜻한 말들이 번져 내던 묵직한 여운에 잠 못 들어 뒤척이던 시간들이 그립다.
두꺼운 책들 사이에 거꾸로 꽂혀 있는 낡은 시집을 꺼내 펼친다. 기형도의 『잎 속의 검은 잎』이다. 나달나달 닳아진 표지, 페이지 여기저기에 세모귀가 접혀 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쓸어 뽑은 자리에 다시 꽂는다. 열정은 진즉 스러졌어도 의리로, 전우애로 살아 내는 부부처럼.
쓰는 일이 내면을 물성화하는 작업이면 읽은 일은 물성을 내면화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안이 밖을 낳고 밖이 다시 안을 낳으며 책과 사람이 스미고 넘나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화적 유전자를 매개하는 중간숙주가 책인지, 어떤 영성이나 지성 같은 것이 책이라는 물성을 입고 인간들 사이를 활보하며 세상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인지 머릿속이 일시 혼란스럽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민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최민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