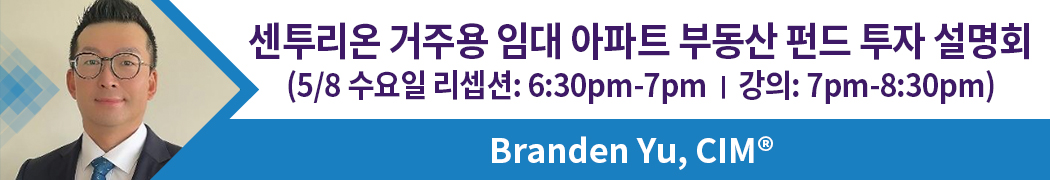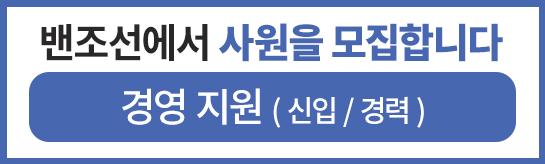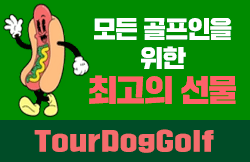박성희 /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불 폭탄 같은 열기가 투하되는 여름 한낮.
머리에 태양을 이고 담비 밭으로 갔다. 콩밭, 옥수수 밭을 지나 담배 밭에 이르니, 얼마
전만해도 작았던 담배 싹이 우뚝우뚝 내 키만큼 자랐다. 바람이 불때마다 그들은 출렁이는 초록
바다가 된다.
나는 이내 태양을 지고 밭고랑으로 들어섰다. 와락 숨이 막힌다. 온통 진초록 향연. 담배는
물이 오를 대로 올라 하나의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선 세상과 담을 쌓은 듯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간신히 발뒤꿈치를 들어야 자분자분 싱그러운 바람이 느껴지고, 숲 속
어디선가 재잘대는 새들의 수다와 신선한 자연의 향기만 풍길 뿐.
담뱃잎을 딴다. 똑. 똑. 똑. 담배나무 만큼 커다란 잎사귀는 밑 둥부터 맨 꼭대기 분홍 꽃이 핀
곳까지 다닥다닥 붙었다. 한 장 한 장 담뱃잎을 딸 때마다 송진 같은 하얀 액이 나와 자꾸
끈적댄다. 담뱃잎은 생긴 것과 달리 연해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엮어 말리기도 어렵고 상품
가치도 없다.
겨우내 따뜻한 비닐하우스 속에서 싹을 틔워 밭에 옮겨 심었던 담배다. 여름 한철 알맞은
햇볕과 바람과 수분으로 왕성하게 자란 담뱃잎. 그들이 한껏 아름다움을 뽐낼 때가 바로
지금이다.
숨이 턱턱 막혀 기진맥진이다. 크고 무거운 담뱃잎을 한 아름씩 옮기며 부리나케 따니 온몸이
끈적끈적하다. 모든 숨구멍은 폭염에게 시위하듯 땀은 비 오듯 하고. 아, 누가 저 태양에게
방아쇠를 당겨라.
아, 그러나 내 몸이 까맣게 그슬리고, 흙 범벅이 되어도 좋다. 나는 저절로 어느 시인의 시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갈증을 못 이겨 산비탈 은행나무 밑으로 갔다. 산 숲은 자작나무, 보리수나무, 밤나무,
소나무가 잡초와 함께 칡덩굴로 가득 쳐졌다. 그 칡 줄기는 얼마나 힘차고 거센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인데도 자기 키 보다 큰 나무와 숲을 칭칭 감았다. 독사 살모사도
우글거리리라.
담배와 백반은 뱀이 제일 싫어하고, 뱀에 물린데 담뱃잎이 특효라지만, 산 밑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할 생각에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 내 발 밑으로 슬그머니 기어올지도 모를 뱀의 몸짓과
똬리를 틀고 뭔가를 갈망하는 눈빛.
나는 산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를 마시고 다시 밭고랑으로 들어갔다. 금방 또 땀으로 노배기다.
머릿속에서 볼을 타고 내려와 목 줄기와 등줄기를 거쳐 땅으로 쏟아진다.
히뜩히뜩 쳐다본 하늘과 창공, 온 산하가 눈부시다. 세상 모든 생물들이 생기발랄하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자기만의 색깔과 소리와 향기로 역동하고 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는 하나 때에 따라서 한 두가치의 담배가 오히려 인생의 멋과 여유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휴식을 취하거나 고뇌할 때 누군가에게서 날리는 푸른 담배 연기는
그를 낭만적으로 보이게 한다.
어느새 태양이 서산에 걸려 커다란 산 그림자를 드리웠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박성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박성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