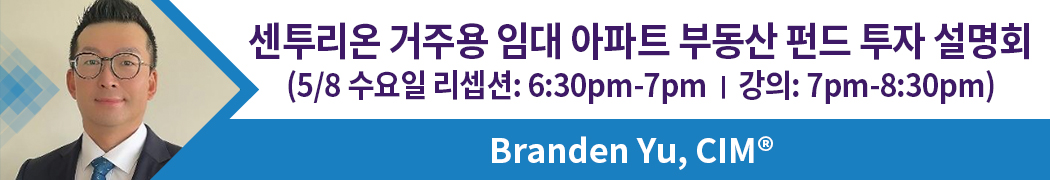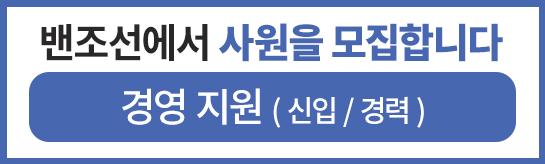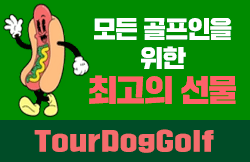정재욱/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천천히 마이 무라이, 거선 이런 거 묵기 힘들 낀데.”
(천천히 많이 먹어라, 그곳에선 이런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을 건데.)
팔순 할머니가 막내 아들에게 아침상을 차리며 건넨 한마디다.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가 쌀을 씻고, 딸그락 딸그락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아직 시차에 적응을 못한 탓인지 일찍 잠이 깨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멀리서 “두부 사려~, 비지”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두부 파는 아줌마의 정겨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잠깐 둘러 본 동네는 새롭게 올라간 건물들과 길가에 빽빽히 주차된 차들로 비좁았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낯설었지만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흙먼지를 휘날리며 신나게 뛰놀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그 당시, 매일 아침 벌어지는 아침 풍경은 전쟁터나 다름 없었다. 오 남매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까지 돌보셨던 어머니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였다. 한 번만 차려도 될 밥상을 식구들 수 대로 각기 다른 스케줄에 따라 여러 번 차릴 때도 있었다. 차려 주신 밥상에서 비위가 약해서인지 냄새가 나는 김치를 싫어했고, 비린 생선도 먹지 않았고, 순대, 곱창이나 곰탕은 아예 손도 대질 않았다. 이것 저것 권하시며 많이 먹으라는 소리에 귀찮아 하며 내가 알아서 먹는다며 짜증을 내기도 했고 반찬투정을 하기 일쑤였다.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시는 일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도 내가 제일 좋아했던 밥상은 어머니께서 손 수 담그신 물 김치에다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에 밥과 함께 참기름 한 방울과 고추장에 비벼 먹는 거다. 지금 내 앞에 제일 좋아했던 밥상이 차려져 있다. 오랜만에 멀리서 자식이 왔다고 손수 만드신 김치에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넉넉히 담은 밥 한 공기를 정성스레 차리신 한끼였다. 어머니께서 차리신 밥상은 세상 어느 유명한 셰프가 만든 것보다도 옛날 임금님이 먹던 수라상보다도 더 맛있고, 내 입맛에 꼭 맞는 최고의 밥상이었다. 반 백 년의 세월에도 내 혀가 느끼는 맛은 여전했다. 매끼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아무도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맛이다. 뭘 하나 음식을 만들 때마다 멀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자식이 생각 나신다는 어머니, 한국 출장 온 막내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 먹이려는 마음에 이것 저것 권하신다. 연세 드신 어머니가 항상 걱정이 되고, 거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 앞에선 아이가 된다. 아직까지 어머니가 손수 차려준 밥상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건 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밖에선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다. 며칠 남지 않은 한국 일정을 아쉬워 하고, 미세먼지가 빨리 씻겨 나가길 기대하며 창 밖을 바라본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정재욱의 다른 기사
(더보기.)
정재욱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