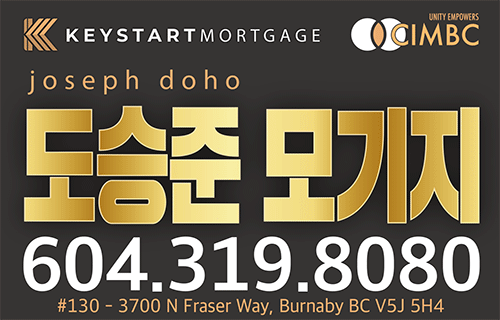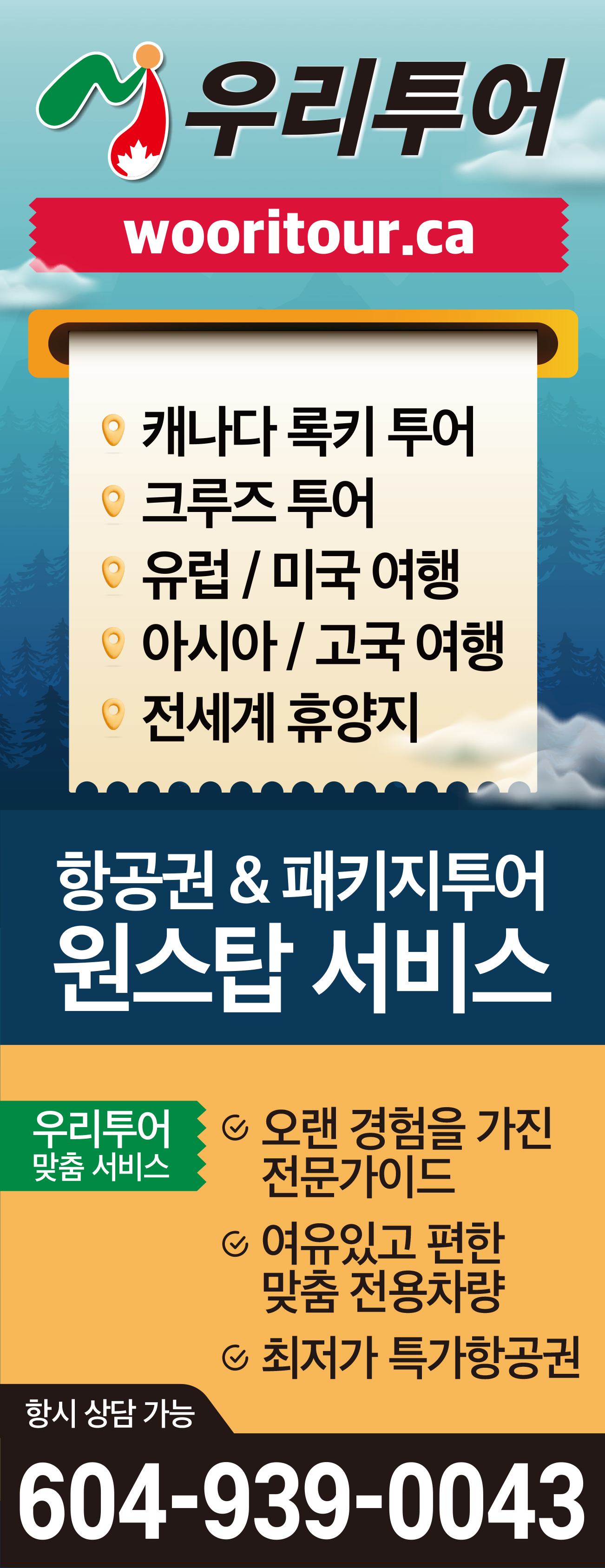박성희/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어서 들어오우.”
누가 우리 집 대문에 들어서면 아버진 무조건 반긴다.
그러곤, “여기 밥상 좀 내와라” 하거나 “차 좀 타 와라” 한다.
행색이 남루하건 반지르르 하건, 장사꾼이건 나그네이건 가리지 않고 손님 대접을 해준다.
자연 우리 집엔 공짜로 밥 먹고 가거나, 아예 몇 년 몇 달을 눌러 붙는 떠돌이들이 생긴다.
처음엔 ‘여보게, 자네’ 하다가 ‘김씨, 이씨’ 한다. 나중엔 ‘형님, 아우’로 불리며 가족의 일원이
된다.
모르는 사람들이 오고 떠나면, 엄마와 나는 그들 치다꺼리가 못 마땅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한다.
아버지는 미안한지 실실 웃다가, “그럼 어떡하나, 오갈 데 없어 내 집에 온 사람인데.
매정하게 가라고 그러나.” 한다.
종종 빨래도 해주고 묵는 방 청소까지 해 준다. 그러면 밥만 축내는 게 미안한지, 리어카를
끌거나 경운기를 몰며 논밭 일을 도우며 떳떳하게 한자리 차지한다.
길게는 몇 년, 짧게는 한두 달 기거하다 떠난다. 그리고 얼마간 세월이 흐른 후, 안부가
궁금하다며 술과 고기 몇 근을 들고 오기도 한다.
“사람 좀 그만 좋아해요.”
나와 엄마가 이리 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다그친다.
“그럼 못써.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찾아오는 건 좋은 일이다. 니 할아버지가 장 그러셨다.
누가 내 집에 찾아오면 ‘절대 그냥 보내지 말고, 남의 집에 찾아갈 땐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셨다.”
나는 도시에 살면서 현관문을 꼭 걸어 잠그고 산다. 가끔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주인이
나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린다. 하지만 현관문에 뚫린 조그만 구멍을 통해 ‘누구세요’라고
물어야 할지, 문을 열어주어야 할지, 숨죽이며 그의 행색부터 살핀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 믿어 천당 가요.” “이거 잡수면 금실 좋아져요.” 하는 꼴이
선교사이거나 장사꾼이 분명한데, 집안에 들였다간 질긴 궁둥이를 붙이고 나를 설득시킬
것이 뻔한 일이어서 일부러 기척도 하지 않는다. “시간 없어요.” “안사요.” 쏴 붙이고
문전박대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선 웃는 얼굴로 문이라도 열어보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걸고 싶지만, 피곤해 질
거라는 편견과 부담 때문에 마음의 문마저 걸어 잠근다.
자기 집에서는 모두 귀한 가족이고, 생계방편으로 나왔을 텐데. 전생에서 나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날엔 그냥 물이라도 한잔 줄 걸, 하고 미안해지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찜찜하다. 내일은
친구네 집들이다. 무얼 들고 갈까 고민이다.
친정에서는 남의 집에 갈 때 쌀 한말, 고춧가루 한 되, 들기름 한 병도 좋은 선물이 된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박성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박성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