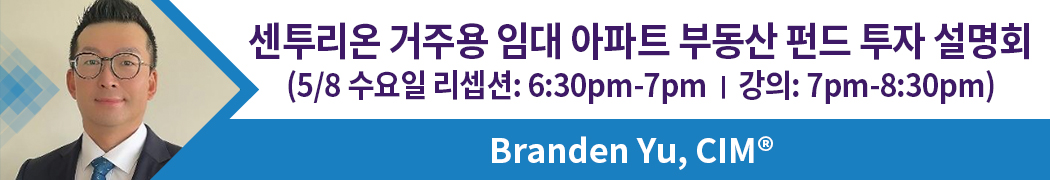雨中望海而釣魚
봄비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낚싯대를 드리우다.
北郊無人跡 북쪽 교외엔 사람 자취 하나 없는데
百嶽連天起 하늘 따라 수백의 산들이 일어서 있네
水明山影落 물은 해맑아 산그림자 떨어지고
蕭蕭春雨裏 봄비는 보슬 보슬 하염없이 내리네
虛心投竿客 텅빈 마음으로 낚싯대 드리운 나그네 하나
豈使外人知 어찌 사람들이 이를 알게함이 있으리요
吾道遊玩是 나의 도는 산수를 즐기는 것일 뿐
富貴都無意 부귀영화 모두 다 뜻이 없노라
丁亥陽四月二十六日與林君山行後釣魚中有感梅軒偶吟
정해년 4월 26일 임군과 함께 산행 후 낚시를 하던 중 느낀바 있어 매헌은 우연히 읊다.

이 세상의 모든 취미 활동 중 좀 별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연 낚시가 으뜸이다. 좀 심한 구분을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낚시를 좋아하는 부류와 낚시를 싫어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진종일 피래미 하나 건져 올리지 못했어도, 그 다음날 또 허탕칠 줄 뻔히 알면서 낚시터로 향할 수 있는 그 집요함은 주변사람이 보기에도 딱하기만 하고, 본인 자신도 딱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들 한다. 민물고기든 바다생선이든 반찬문제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를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낚시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배를 빌리거나, 자동차로 이동하는 휘발유값 등을 합산한 그 돈으로 어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오는 편이 백번 천번 저렴할 터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좋은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 한국같으면 아예 밤잠을 설치는 극성을 떨어야 하고, 진종일 뙤약볕에 쭈그리고 앉아 날고생을 사서 하는 족속들이 바로 언필칭 '조사'(釣士)들이다.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지렁이나 거머리를 만지작거리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손으로 밥도 먹지 말라'는 푸대접이 일쑤요, 낚시가 뭐가 그리 좋다고 사흘이 멀다 하고 궁상을 떠느냐는 핀잔을 친구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대책없는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누라의 푸대접과 친구들의 핀잔에도 아랑곳 없이 냉큼 또 떠날 수 있는 낚시터는 인간이 원초적으로 지향하는 메카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산행을 시작하기 전 한때 "낚시에 약간 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가 지나치게 탐닉한 적이 있다. 이민오기 전 산골에 살던 하동(河童)시절엔 고사리같은 손으로 바위 밑에 손을 넣어 메기의 멱살을 꼰아잡아 끄집어내는 손더듬이의 명수였고, 여름에 물이 불은 개천 둑에 대소쿠리를 들이대고 붕어와 피리떼를 일망타진했던 훌치기의 대가(?)였으니, 그보다 몇 수 위인 낚시는 이민 후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춥고 배고프던 이민 초기시절은 먹고 살기 바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을 당시 낚시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구(craving)는 활화산의 용암처럼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온타리오주 토론토 북쪽 두 시간 거리에 있는 Lake Simcoe 동남쪽 호반 마을 Beaverton이란 곳에서 80년대 초반 무렵, 한 5년간 장사를 했었으니 가히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었다. 호수 둘레가 100km이상이니 충청북도 사이즈의 내륙호로 수심이 깊고 각종 민물고기가 사시사철 득실거리는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엔 호수전체가 1m 이상 두께로 결빙되다 보니, 호수엔 수백 채의 얼음낚시 판자촌(shed town)이 들어서 '북미의 얼음낚시 수도'(ice fishing capital of North America)라는 미칭까지 얻은 곳이었으니 나로서는 정말 낚시천국에 살면서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행운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셈이었다.
금상첨화로 장사도 짭잘했으니 당장 구입한 120마력짜리 6인승 쾌속정으로 틈만 나면 호수를 종횡무진으로 트롤하며 Bass, Pickerel, Pike, Lake trout을 마음대로 건져 올렸다. 겨울이면 10리밖 호수 한가운데 2평짜리 얼음 낚시집을 지어놓고 최신형 스노모빌을 타고 무시로 출입하며 민물 청어인 Herring을 무 뽑듯 뽑아 올렸고, 때로는 20파운드가 넘는 Lake Trout와 30분 동안 사투를 벌리는 혹한속의 에스키모가 되기도 했었다. 겨울철엔 아예 프로판 난로가 장착된 얼음 낚시집에서 가게가 끝난 10시 이후 다음날 새벽까지 자면서 낚시했으니 아내와는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었다. 이런 낚시를 신물나게 한 5 년 했으니 87년 밴쿠버로 이사온 이후로는 낚시라면 쳐다보기도 싫었다. 온타리오 그곳에 살면서 내가 물속에 투자한 돈만해도 아마 아파트 한 채는 사고도 남을 정도였으니 도가 지나쳐도 한창 지나친 광기에 가까운 낚시였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는 공자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낚시엔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심층심리 저변에 흐르는 그 무엇이 조사들을 낚시터로 향하게 하는 이면에는 분명히 철학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철학이 별 것이던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곧 철학이 아니든가. 눈에 당장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곧 낚시로 표출된다고도 할 수 있다. 말도 되지 않는 개똥철학일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세계와 보이는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낚싯줄에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낚싯대를 드리우는 조사의 자세는 진지하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한 것이다. 부질없이 바쁘기 만한 세상살이에 염증을 느끼며 살아가노라면, 저마다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무지개를 쫓던 꿈들이 물거품처럼 흩어지는 소용돌이 속에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 그래서 더러는 짬을 내어 낚싯대에 또 하나의 꿈과 희망을 매달고 보이지 않는 물밑 세계를 향해 드리울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안을 찾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일순간 손끝에 전해오는 짜릿한 전율은 오르가즘에 비할 바 아닐 것이요, 허연 뱃대기를 드러내며 튀어올라 꿈틀대는 물고기의 생동감(elan vital)에서 삶의 약동과 생명의 환희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시경에 나오는 어약우연(魚躍于淵 물고기가 연못에서 튀어오르네)에 다름아닌 심미적 쾌감이 있는 것이다. 물론 불가에서 금기시하는 무모한 쾌락적 살생행위일 수도 있을 것이나, 잡자마자 방생하는 격조높은 조사들의 수준도 있으니 낚시를 저급한 취미로 매도할 수많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항암제를 주입하며 힘든 투병생활을 했던 2004년 여름, 20년 동안 처박혔던 낚싯대의 먼지를 털어내고 노스밴의 라이스 레이크에 살다시피 했었다.
피어 오르는 물안개 수면위로 낚싯줄이 긴 포물선을 그리며 안착될 때 마음이 모처럼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낚싯대 끝에 걸려 있는 한 가닥 희망이 유치환이 말한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처럼 펄럭이고 있었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