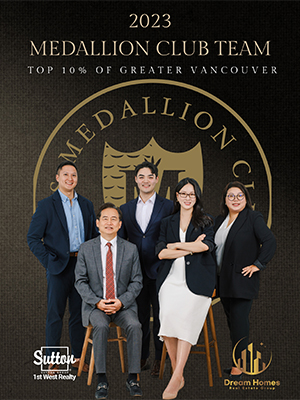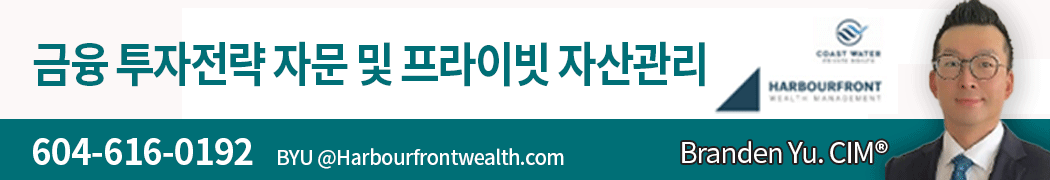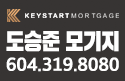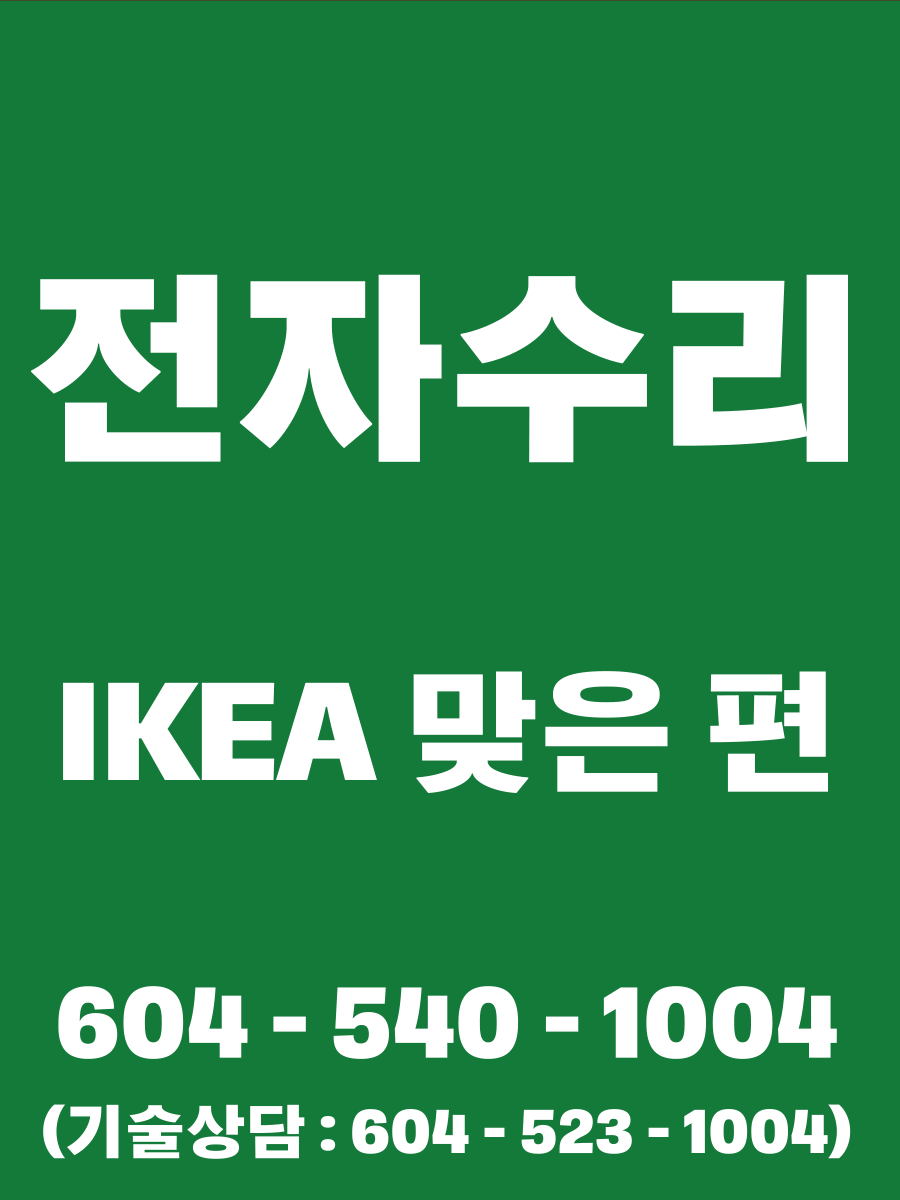베고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계단에 앉아 어딘가에 엽서를 쓰던 고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를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이젠 찾을 길 없다. 밤새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구겨버린 끝에 파지더미 안에서 간신히 피어나 누군가에 보내졌던 편지, 이젠 박물관에나 있다. 시집, 장가가는 날을 며칠 앞두고 다 태워버리는 것으로 처녀, 총각시절과의 영영 이별을 고했던, 가슴 두근거리던 첫사랑의 편지, 이젠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다. 가을엔 편지를 쓸 테니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달라던 사람, 이젠 가을에도 안 쓴다. 연서(戀書) 한 통에도 그저 가슴만 뛸 뿐 혼자는 도무지 감당할 길 없어서 재간 있는 친구에게 애걸복걸하며 대신 써달라던 까까머리 그 녀석, 이젠 어디에도 없다.
베고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계단에 앉아 어딘가에 엽서를 쓰던 고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를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이젠 찾을 길 없다. 밤새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구겨버린 끝에 파지더미 안에서 간신히 피어나 누군가에 보내졌던 편지, 이젠 박물관에나 있다. 시집, 장가가는 날을 며칠 앞두고 다 태워버리는 것으로 처녀, 총각시절과의 영영 이별을 고했던, 가슴 두근거리던 첫사랑의 편지, 이젠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다. 가을엔 편지를 쓸 테니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달라던 사람, 이젠 가을에도 안 쓴다. 연서(戀書) 한 통에도 그저 가슴만 뛸 뿐 혼자는 도무지 감당할 길 없어서 재간 있는 친구에게 애걸복걸하며 대신 써달라던 까까머리 그 녀석, 이젠 어디에도 없다.
전화, 전자 메일, 그리고 동영상의 전송까지 광속으로 시간과 공간을 메우는 요즘 세상에서야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러한 소통의 도구와 방편이 다양하지 않던 시절의 편지는 공간을 넘어 소통하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편지가 지니는 소통의 역할 또한 일상적인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문을 논(論)하거나 사상을 쟁(爭)하는 것에서부터 원거리 교육, 그리고 공문서의 역할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편지 쓰기는 곧 글쓰기의 실전 훈련, 글쓰기의 생활화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편지를 모은 것은 그대로 저술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시대를 기록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었다.
58세의 퇴계 이황(退溪 李滉)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던 1558년,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은 이제 막 문과 을과에 1등으로 합격한 32살의 청년이었다. 낙향하여 학문에만 열중하던 달관의 대학자 퇴계가 명종의 거듭된 부름을 받아 더는 고사치 못하고 잠시 서울에 와 성균관에 있을 때, 마침 과거를 치르러 서울에 왔던 고봉이 퇴계를 찾아가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이들의 만남은 시작된다. 그 해 겨울 퇴계가 26살 아래의 혈기왕성한 젊은 학자 고봉에게 첫 편지를 보낸 후로부터 두 사람의 서신 교환은 퇴계가 세상을 떠나는 1570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으니 주고받은 편지가 백여 통을 넘는다.
고봉이 퇴계를 향해 극진한 존경의 예를 갖춘 건 물론이려니와 퇴계 또한 세대를 건너나 있는 젊은 후학에게 두터운 존중의 예를 다함이 절절하게 드러나 읽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러나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를 넘나든 그들의 논쟁은 무엇보다 치열했으며 예리했다. 특히 두 사람이 편지로 논하고, 답하고, 후설을 달기를 거듭하면서 4년을 이어갔던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논쟁은 독립적인 한국 주자학을 성립시키는데 다다른다. 이처럼 편지에는 영혼이 실린다.
그로부터 200년쯤이 지난 조선에는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이 있다. 두 말할 나위 없는 대문호(大文豪)이면서 깐깐하기로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연암이지만, 그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한낱 인간 연암이 푸근하게 엿보인다. 연암은 51세에 부인 이씨를 잃고 홀몸이 되지만 세상을 다할 때까지 다시 혼인치 않고 홀로 두 아들(종의(宗儀), 종채(宗采)을 길러낸다.
상처(喪妻)한지 9년이 지난 1796년의 연암은 안의(安義. 지금의 경남 함양군 안의면) 현감으로 있어서 서울 재동 본가의 아들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편지 쓰기를, '쇠고기 장볶이, 고추장 작은 단지 하나를 보내니 사랑방에 두고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게다. 내가 손수 담근 건데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다.'
아들 녀석들 무덤덤한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진지, 한참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소식이 없자 연암은 혀를 차며 큰 아들에게 다시 쓰는데, '전에 보낸 장볶이는 받아서 조석간에 반찬으로 하느냐? 좋은지 어떤지 어찌 말이 없느냐? 무람없다, 무람없어. 난 그게 포첩, 장조림 같은 것보단 나은 듯하다. 그리고 보낸 고추장은 내 손으로 담근 거다. 맛이 좋은지 어떤지 자세히 말하라. 두 물건을 계속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처럼 편지에는 체온이 실린다.
오늘은 오랫동안 서랍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만년필을 꺼낼 거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대'로 삼아 편지 한 통 쓸 테다.
*필자 김기승은 1979년부터 극단76극장, 극단 실험극장, 환 퍼포먼스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오기 직전 PMC 프로덕션 등을 중심으로 공연계에서 활동했고 연극, 뮤지컬, 영화, 콘서트, 라디오 등 100여 편의 작품들에서 연기, 연출, 극작, 기획 등을 맡아왔습니다. 제목 '추조람경'(秋朝覽鏡)은 당(唐)나라 설직(薛稷)이 쓴 시의 제목으로, 제자(題字)는 필자가 직접 썼습니다. <편집자주>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