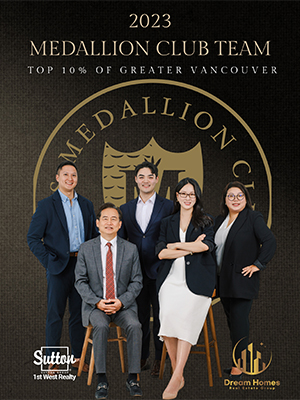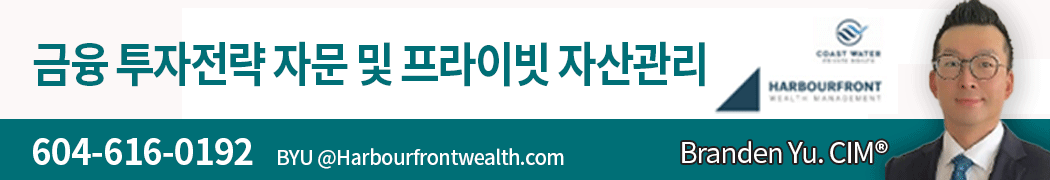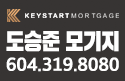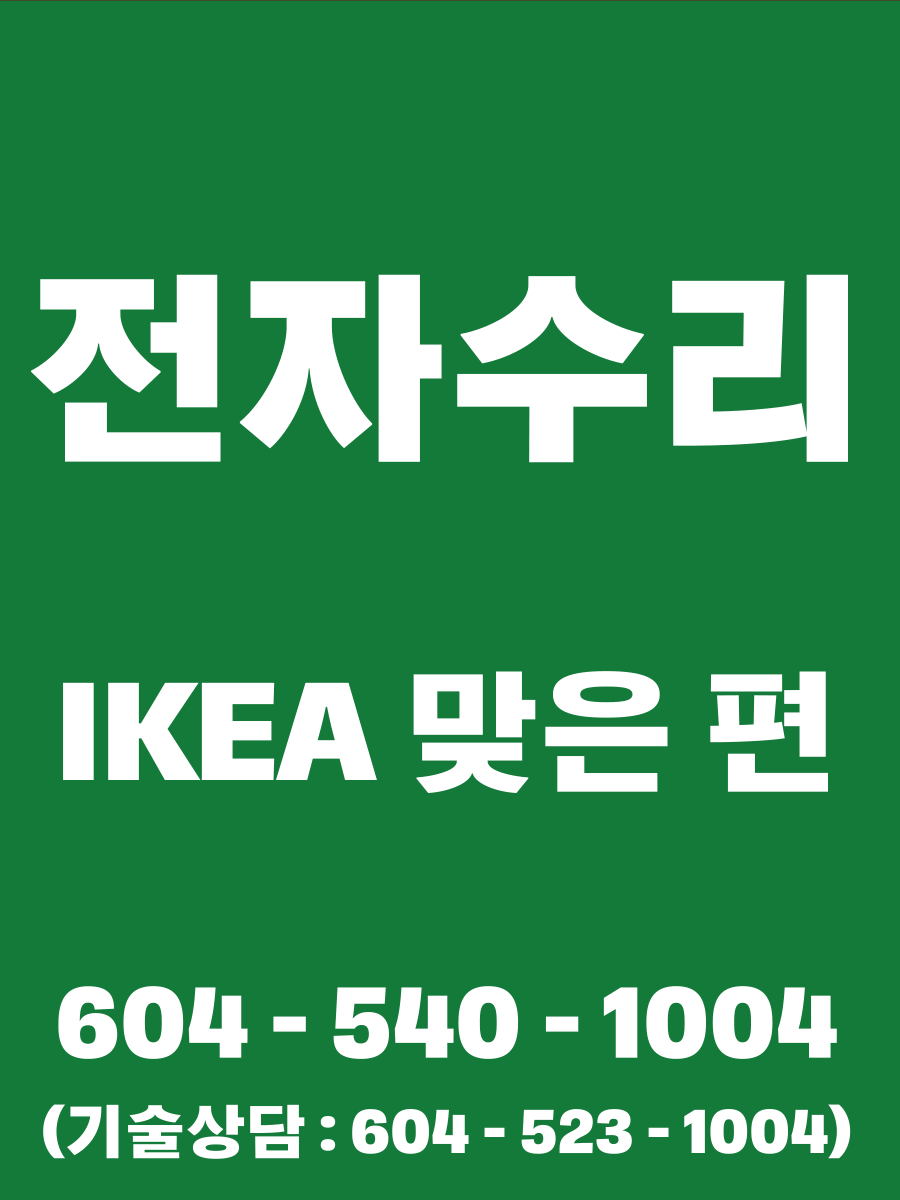세상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을 터, 밥짓는 일도 예외일 순 없다.
세상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을 터, 밥짓는 일도 예외일 순 없다.
밥 한다. 쌀을 씻으며 쌀 한 톨마다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이 닿은 농부의 수고에 감사하고, 밥을 지어 함께 나눌 이들을 떠올리면 사랑의 마음이 깃들고, 밥이 익어 가는 동안 잠시도 소홀할 수 없으니 매사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에 생각이 머물고, 뜸을 들이면서는 기다림의 미덕을 마음에 담는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밥을 나눠 먹으며 마주한 사람들과 정겨움을 나누니 참으로 즐거운 일이며, 섭식으로 건강한 몸을 이뤄 사는 일에 또 열심일 수 있으니 기쁨이며 다행이다.
이렇게만 보면 밥하는 일은 무엇과도 견주기 힘든 기쁜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밥하는 일이 매번 이토록 명상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별로 티도 나지 않는, 그렇다고 거역할 수도 없는 반복적인 일상 노동에 머무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습관되어지기 쉬운 것도 아니어서 밥 할 때마다 중압감에 빠진다.
밥을 한다는 일은 쌀을 씻고 익히는 단순한 노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밥해야지 하고 몸을 일으키기 시작함과 동시에 오늘은 또 뭘 해먹나 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밥하기에 있어 밥 자체로만 밥하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밥과 함께 먹을 반찬이 동반된 다음에야 비로소 밥하기의 완성을 이룬다. 거의 매 끼니때마다 닥치는 이러한 중압감이야말로 숱한 밥하기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습관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래서 밥하는 일이 절대 수월한 일이 아니게끔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밥하는 일이 밥하는 일 하나만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더욱 밥하는 일에 마음 놓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밥하는 일은 밥하는 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밥하는 일 앞에서 끊임없는 뇌의 작용이 중압감과 맞서야 한다, 뭘 해먹나.
누군가가 나서서 오늘은 뭘 먹자라고 말하면 그것은 밥하기를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뭘 먹는가 라는 중압감, 심각한 밥하기의 모의과정에 결정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거기에서부터는 밥하기의 막막함이 돌파구를 찾고 밥하기는 거침없이 내닫는다. 이처럼 밥하기의 모의과정을, 밥하기 위해 쌀 물에 손을 담그는 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버겁다.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전 같지 않다지만 그래도 아직은 밥하는 일이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 더 가까이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밥하는 일은 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자들도 밥한다. 아니, 사람들은 철이 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밥하는 대열에 떠밀려 합류하게 된다. 쌀 씻는 것에서 시작하는 밥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앞으로 되돌려 놓으면 훨씬 더 복잡다단한 밥하기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밥하기는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활동의 근원적 이유로 자리잡고 있다. 복잡하고 난해한 살아가는 일에서 이런저런 지엽적 의미의 배경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밥을 하기 위해서’가 남는다. 사는 게 곧 밥하는 일이다. 밥하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단순히 쌀 말고도 그에 앞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척 많다. 구체적인 밥하기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산적한 갈등, 피곤한 육신, 치열한 경쟁 같은 것들을 우선 극복해야 한다. 밥 한 술에도 눈물 나도록 고단한 삶의 품이 서려있다.
어떤 날은 다 싫다. 밥하기를 향해 가느라 진땀이 나도록 손에 꼭 쥐고 있는, 어깨가 으스러지도록 짊어진 저마다의 무언가를 그냥 털썩 내려놓고 싶은 날이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밥하기의 치열한 대열에 내몰린 사람들, 이제는 쇄락한 애초의 푸른 꿈을 애써 떠올리며 무작정 대열을 이탈해서 마냥 개개고픈 욕망과 충동이 치밀어 올라 견디기 힘든 때가 있다. 그저 한가롭기만 한 하늘만 온종일 바라보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때가 있다.
정말 밥하기 싫은 날이 있다.
*필자 김기승은 1979년부터 극단76극장, 극단 실험극장, 환 퍼포먼스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오기 직전 PMC 프로덕션 등을 중심으로 공연계에서 활동했고 연극, 뮤지컬, 영화, 콘서트, 라디오 등 100여 편의 작품들에서 연기, 연출, 극작, 기획 등을 맡아왔습니다. 제목 '추조람경'(秋朝覽鏡)은 당(唐)나라 설직(薛稷)이 쓴 시의 제목으로, 제자(題字)는 필자가 직접 썼습니다. <편집자주>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