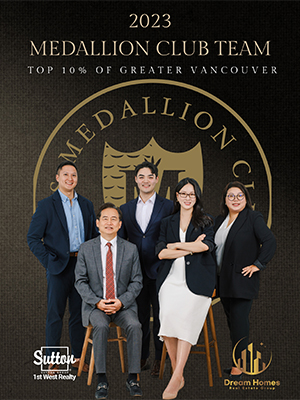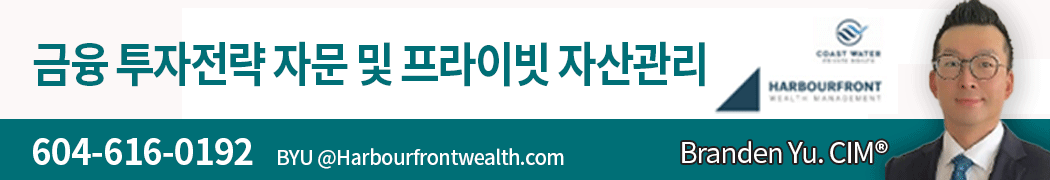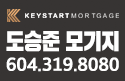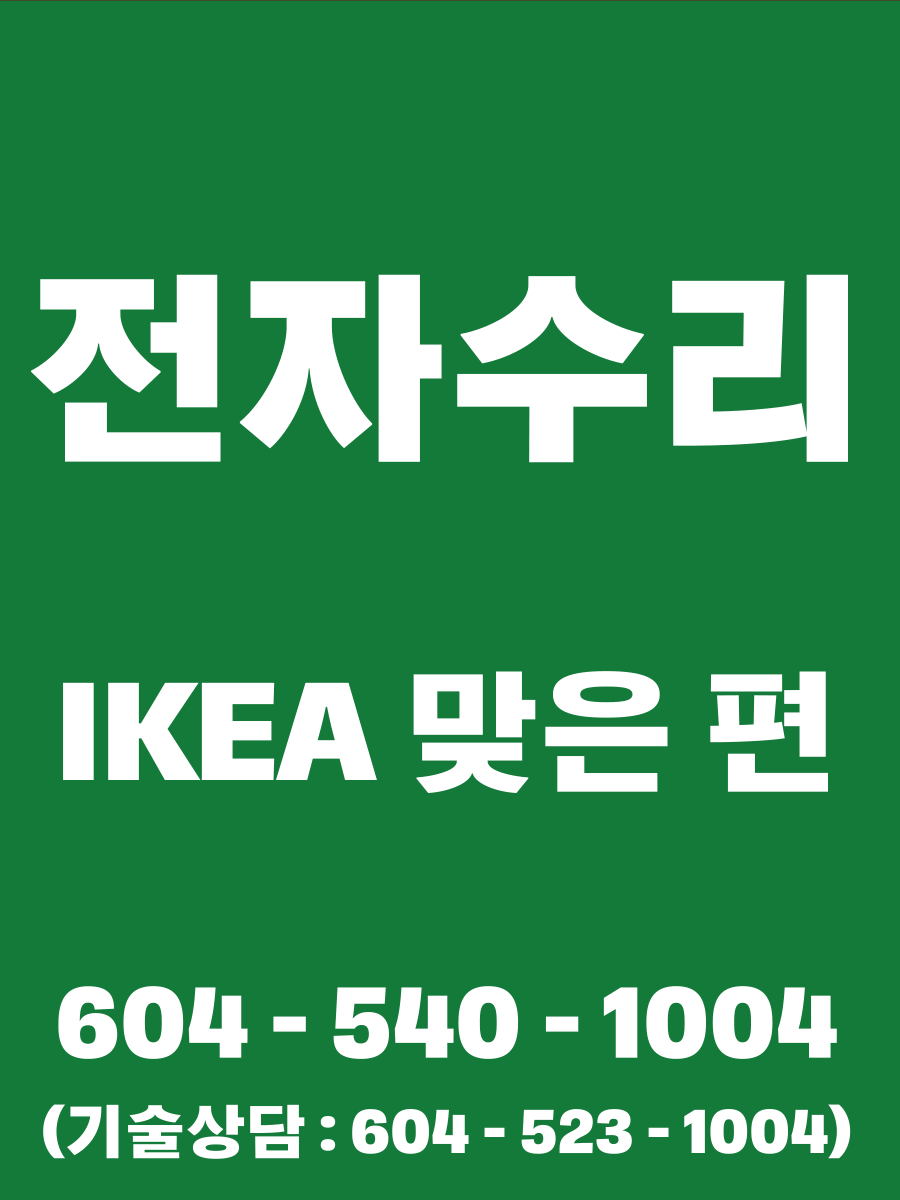'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라고 민태원은 청춘을 예찬(禮讚)했다. 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찬란한 축복이 내리는 시기임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청춘이라고 해서 무작정, 또는 저절로 푸르른 것만은 아닐진대, 값진 청춘에 대해 들려달라고 하는 젊은 그대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머뭇거린다. 아둔한 나는 젊음이 인생에 던지는 화두(話頭) 앞에 입을 열지 못하고 쩔쩔매야 한다. 또한 지난 날 나에게도 분명히 주어졌을 그 눈부신 시절에 과연 나는 푸르렀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라고 민태원은 청춘을 예찬(禮讚)했다. 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찬란한 축복이 내리는 시기임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청춘이라고 해서 무작정, 또는 저절로 푸르른 것만은 아닐진대, 값진 청춘에 대해 들려달라고 하는 젊은 그대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머뭇거린다. 아둔한 나는 젊음이 인생에 던지는 화두(話頭) 앞에 입을 열지 못하고 쩔쩔매야 한다. 또한 지난 날 나에게도 분명히 주어졌을 그 눈부신 시절에 과연 나는 푸르렀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서 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다. 무릇 모르겠다는 말은 솔직하고 겸손한 언어지만 때때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언어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모른 것을 아는 척 할 수도 없다. 여기서 나는 더욱 푸르른 청춘을, 젊음의 의미를 묻는 젊은 그대의 발목을 잡는다. 아는 척하지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덜 비겁하기 위해서다. 난 젊은 그대와 함께 청춘을 음미(吟味)하려 한다. 난감한 청춘을 피하지는 않되 혼자는 싫어서다. 아둔한 나의 최선의 꾀다.
아둔한 나는 젊은 그대와 함께 노래를 듣는다. 돗수 높은 검은 뿔 테 안경 안에서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 양병집의 노래 '소낙비'다. 이 노래는 원래 봅 딜런이 불렀던 'A hard rains gonna fall'을 번안한 곡이지만 '소낙비'에 이르러서는 누가 뭐래도 양병집의 언어, 양병집의 노래가 분명하다. 끝없이 내리는 '소낙비'에서 아들, 딸들에게 묻는다.
'어디에 있었느냐'는 물음에 아들, 딸들이 대답한다. 안개 낀 산속에서 방황했다고, 시골의 황토 길을 돌아다녔다고, 어두운 숲 가운데 서있었다고, 시퍼런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무덤들 사이에서 잠을 잤노라고.
'무엇을 보았느냐'는 물음에 아들, 딸들이 대답한다. 늑대의 귀여운 새끼들을, 보석으로 뒤덮인 양옥집을, 새카맣게 타버린 나무들을, 망치 든 사람들의 죽음을, 하얀 사다리가 물에 뜬 것을, 장난감 칼과 총을 가진 애를 보았다고.
'무엇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아들, 딸들이 대답한다. 비 오는 날 밤의 천둥 소리를, 세상을 삼킬 듯한 파도소리를, 성모 앞에 속죄하는 기도소리를, 가난한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물에 빠진 시인의 노래를 들었다고 한다.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에 아들, 딸 들은 비 내리는 개울가로 돌아가겠다고, 수평선이 보이는 바닷가로 가겠다고, 영혼을 잃어버린 빈민가로 가겠다고, 뜨거운 사막 위를 걸어가보겠다고, 무지개를 따다 주는 소녀 따라 가겠다고 대답한다.
양병집의 노래가 끝나고 아둔한 나는 다시 그대의 얼굴을 바라본다. 젊은 그대, 혹시 청춘의 한복판이 살점이 다 떨어져나가고 가시만 발려진 생선처럼 스산한가. 그래서 스승을 찾아 무작정 길을 나서는가. 의심하는 청춘은 비로소 스승을 만나 더욱 푸르름의 구원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가. 그 길에서 방황하는가. 그러나 아둔한 나는 더욱 푸르르고 눈부신 청춘을 갈구하는 젊은 그대에게 감히 말한다, 세상 어디에도 그대의 스승은 없다고.
스승에의 신념을 지닌 그대에게 아둔한 나의 스승에의 부정은 경멸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다시 젊은 그대의 바짓부리를 부여잡는다. 한시라도 빨리 스승을 찾는 걸음은 멈춰야 한다고. 젊은 그대여, 대신 그 걸음으로 한번은 친구 따라 강남도 가보자, 그리고 더 잃고 덜 잃는 것에 대해 헤아리는 건, 더 아프고 덜 아픈 쪽을 가리는 건 좀 멀리 두자.
아둔한 나는 확신한다. 스승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고. 다만 젊은 그대가 팔 벌려 아픈 세상을 한껏 안을 때, 불확실한 것들에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때, 젊은 그대의 저어 깊은 곳으로부터 어렴풋이, 그러나 뚜벅뚜벅 걸어오는 스승의 모습을 볼지니. 그래서 젊은 그대의 청춘은 끝내 더욱 푸르를지니.
* 필자 김기승씨는 1979년부터 극단76극장, 극단 실험극장, 환 퍼포먼스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오기 직전 PMC 프로덕션 등을 중심으로 공연계에서 활동했고 연극, 뮤지컬, 영화, 콘서트, 라디오 등 100여 편의 작품들에서 연기, 연출, 극작, 기획 등을 맡아왔습니다. 제목 '추조람경'(秋朝覽鏡)은 당(唐)나라 설직(薛稷)이 쓴 시의 제목으로, 제자(題字)는 필자가 직접 썼습니다. <편집자주>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