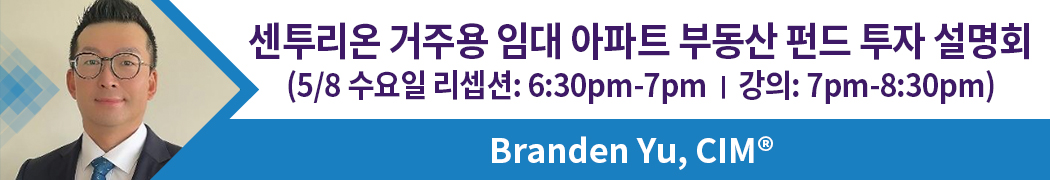문철봉 / 한국문인협회 밴쿠버지부
천당에서 하나 모자라는 곳,구백 구십 구당이라는 밴쿠버. 여름이면 브로드웨이 남쪽, 캠비 거리에선 먼 산 바라기가 참 좋았다. 끝 모를, 파란 하늘과 환한 햇살, 하얀 구름 몇 점에 가벼이 스치고 지나는 바람이 좋았다. 이런 여름, 가게 문을 열고 나가면 다운타운 너머 웨스트 밴쿠버와 노스 밴쿠버를 병풍처럼 두른, 사이프러스 산(Mt. Cypress)과 그라우스 산(Mt.Gruose.)산, 시모어 산(Mt. Seymour)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산머리에 시리도록 하얀 눈(雪)이 파란하늘과 함께 눈(目)에 들어와 가슴까지 시원케 하고 그 능선 언저리로 구름이 살포시 자리하고 있을 때면 ‘청량함’이라는 단어가 절로 실감이 났다.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아 신비롭기까지 했다.
이렇게 먼 산 바라보기 좋은, 어느 날, 선계(仙界)의 청량함을 마음껏 즐기고 들어와 조금 바쁜 점심시간을 보낸 뒤, 나른하고 무료한 오후 시간을 멍 때리고 앉았을 때였다. 소녀티가 채 가시지 않은, 자그마한 아가씨가 쭈뼛쭈뼛 가게로 들어섰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고 묻자
“일(job)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찾아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이 꼬마아가씨가 미심(Agnes MeeSim Kim)이다. 내가 미심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섬의 한 마을에서 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땋은 머리며 옷차림새가 우리와 많이 닮은 인디언 소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난 속으로 ‘별일이네, 원주민 아가씨가 왜 일자리를 찾아다니지?' 의문이 들었고 한편으로 ‘참 맹랑한 아가씨구나.’라는 생각도 했다. 원주민 젊은이가 스스로 직장을 찾아다니는 일이 드물기에 뜻밖에 신선감도 느꼈었다. 그날 저녁, 이력서를 무심히 보는데 이름이 남달리 길고 이상했다. 꼼꼼히 들여다보니 오히려 읽기가 너무나 친숙하고 쉬운 Mee Sim Kim Agnes가 아닌가? ‘우리네 김씨 성을 미들 네임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가?’싶은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다. 즉시 전화기를 들고 내일 오전에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
만나 확인을 하니 설마 했던 대로 10살에 입양된 한국계 캐네디언이었다. 면접에 필요한 몇 마디를 주고받는데 미심이 “코리언이 아니라서 한국말을 못 한다.”고 쑥스럽게 웃었다. 그럼 "네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고 물었더니 미심이든 킴이든 상관이 없으니 마음대로 부르란다. 그러곤 자기의 친구들은 킴이라 부른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며 웃고 있는 아가씨를 마주한 내 가슴이 도리어 슬픔으로 차올랐다. ‘킴은 너의 성(姓)이라 너는 미심으로 불려야 옳아.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 게 아니란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을 차오르는 슬픔과 함께 꾹 눌러 삼켜 버렸다.
미심을 만나기 이태 전, 한국계 입양아들이 모인 미네소타의 여름 캠프 '호숫가의 친구들' 마지막 날, 아이들과 헤어지며, 저희들 출생 나라의 한 어른으로 저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가여움에 눈물을 보이게 되었다. 오히려 아이들이 우는 나를 끌어안고 “샘, 울지 마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하며 위로를 했다. 그 기억이 아직도 가슴 속에 가시로 남아 있다. 미심을 보며 다시 그 가시가 아려왔다.
한참 시간이 흘러 한국어로 쉬운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미심에게 물었다. “한국의 부모는?” “다른 가족은?” “찾고 싶은지?”를. 미심은 이 물음들에 대답 대신 지갑 속에서 조심스럽게 쪽지 하나를 꺼냈다. 언제부터 넣고 다녔을지 모를 만큼 꼬깃꼬깃한 쪽지에는 영어반 한글반으로 서툴게 베껴 쓴 “가족을 찾습니다, 이름은 김미심. 한국에서 태어났어요."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어져 있는 생년월일과 입양된 시기, 한국의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이 몇 줄이 적힌 쪽지를 받아 든 나와 직원들 모두는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다. 딸 기르는, 어느 엄마는 "신문에서 보고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기막히고 가여운 일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며 목을 놓고 울었다.
미심은 이렇게 우리와 일하며 한국말 배우기를 더 했고 또 구김 없이 성실했다. 아쉽게도 내가 미심보다 먼저 그곳을 떠나왔고 미심은 그 뒤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밴쿠버 아일랜드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뒤, 밴쿠버의 저 청량한 여름 하늘과 산들을 그리면 그 한 자락에 구절초 같은 미심의 모습이 함께 피어난다. 밴쿠버를 떠나 올 때 언론에 제보하고 도움 될 만한 기관을 소개하고 왔지만, 이후 소식을 듣지 못 했다. 미심이 김미심으로 우리의 성과 이름을 되찾았는지 여직 아그네스로 남아 있는지… 이런 까닭에 미심은 아직도 내 마음 속 서늘한 섶으로, 아픈 가시로 남아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문철봉 의 다른 기사
(더보기.)
문철봉 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