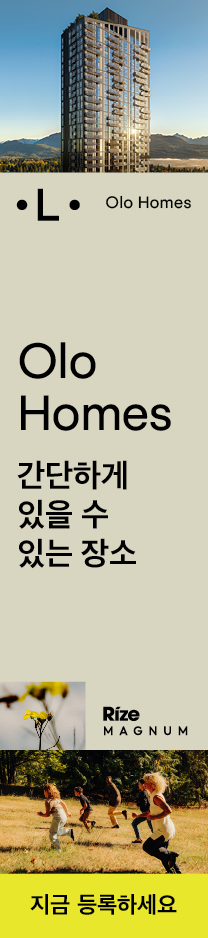스키나 크릭에서 수셔티 베이까지 8.6km를 남겨둔 마지막 날 아침. 늦잠 늘어지게 자고 11시 출발!을 선언했는데도 야성이 밴 팀원은 새벽 5 시부터 일어나 부산을 떤다. 허니문 중인 신랑과 새색시 깨지 않게 살짝 몸을 일으켜 발개진 모닥불 앞에서 오늘의 일정을 점검한다. 5 시간 걸리는 구간이라 말하지만 분명 쉽지 않은 길이리라.
우리와 반대쪽을 걸어온 젊은 하이커들에게 트레일 상황을 묻자 “머드와 보드왁.”이라 답한다. “머드는 오케이. NCT는 DMZ(Dirty & Muddy Zone)이니까. 하지만 너희가 가는 길은 서바이벌 게임장일 걸.”한껏 호기를 부린다. 그러나 보드왁을 제외한 8.6km가 진흙탕 연속인 걸 보고 “머드는 오케이.”했던 걸 내심 후회한다.

<▲ 고슬고슬한 보드왁 >
수샤티 베이(Shushartie Bay) 캠프장에는 물이 없다. 아들 배낭에 정수한 물을 꾹꾹 눌러담은4L짜리 물주머니를 넣는다. 엿새 동안의 식량, 연료를 다 털어낸 아들의 배낭이 물 때문에 도로 24kg을 훌떡 넘는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뚜벅이처럼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 아들을 보며 안스러운 어미의 마음과 생명수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하는 리더의 염려가 교차한다.
캠프장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베이지 색 바지를 입은 처녀 둘과 부모, 개를 데리고 가는 가족을 만난다. 한 처녀가 긴 다리로 훌쩍 뛰어넘다 진흙구덩이에 풍덩 빠진다. 바닷가에 썬텐이라도 나온 성싶은 산뜻한 차림새와 네 발 달린 저 개가 블러프와 로프, 각종 진흙탕 버라이어티를 어찌 견딜지. 진흙 장아찌가 된 모습을 보고“축하해요.” 한다. 정말 부러울 게다. 아니, 위대해 보일 게다.
숲길이라기보다는 산 두 개와 나즈막한 언덕을 오르내리는 산길이다. 낮은 데, 높은 데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진흙길이다. 해발 177m의 산을 넘고 나면 중간 지점(4.3km) 표지가 있는 보드왁이 나온다. 질퍽한 늪지대에 깔린 보드왁이 환하고 밝아 천국 가는 길 같다. 배낭을 벗어두고 그 위에 벌렁 드러 눕는다. 하늘에 수제비 구름이 동동 떠있다. 식수가 모자라니 고인 듯 흐르는 브라운 빛깔의 물이나마 떠가야 한다. 널빤지에 엎드려 정수물병에 물을 받아 빈 물병에 가득 채운다. 한낮 뙤약볕이 내려와 있는 보드왁에서 낮잠 한 숨 자고 싶으나 블랙 플라이와 호스 플라이가 방해를 한다.

<▲ 여전히 길은 거칠고>
줄창 이어지는 고난도 어드벤처에 일년365일 중 360일 산행을 하는 청산 님도 힘이 드는지 무릎이 푹푹 꺾어진다. 70대 고령과 부실한 식사, 그리고 참기름병에 김치, 1kg짜리 카레봉지까지 담긴 배낭을 메고 엿새 간 강행군했으니 왜 안 그렇겠는가? 말린 과일과 넛츠를 건네고, 우리도 현미 누룽지로 에너지를 보충한다.
뒤팀이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 너무 지칠 것 같아 청산 님을 먼저 보낸다. 다행히 발 빠른 메이가 따라나선다. 진흙탕에서 넘어진 아들 무릎에 피가 빼꼼 비친다. 게다가 “오늘은 제발 해 떨어지기 전에 캠프장에 좀 가봅시다,네?”간청을 한다. 그애 마저 놓아 보낸다. 지난 엿새의 험한 여정 동안 팀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잘 달려왔다. 체력이 바닥이 난 오늘은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무리겠다 싶어 팀원 간에 묶은 체인을 풀어주고 나도 무거운 리더의 책무를 벗는다.
나무 제 멋대로 자라 하늘을 가리고, 흐르고 싶은 데로 물 흘러 대지를 가르는 제 멋대로의 세상에서 발가벗은 나로 서본 적이 얼마만이던가. 체면과 도리로 칭칭 동여맨 사리를 풀어헤치고 까까머리를 디미니 햇볕 살갑고 숲 그윽하다.
해발250m의 두 산봉우리를 넘고서 나타난 긴 보드왁 끝에서 팀을 기다린다. 무릎을 다친 영주 씨가 아무래도 진통제가 필요할 듯싶다. 블랙프라이가 내 몸을 걸게 차린 잔칫상으로 여기는지 썬그라스 속까지 파고든다. 늦게 도착한 영주 씨가 무릎 통증을 호소한다. 진통제 두 알을 건네주고 지도를 보니 또 하나의 봉우리가 남아있다. 225m의 봉우리를 앞두고 다 왔으니 힘 내라고 빤한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천천히 오라 이르고 배낭을 둘러맨다. 모기떼가 아귀처럼 쫓아온다.

<▲ Welcome to Hell >
또 쓰러진 나무 등걸과 이 악문 나무뿌리, 창칼처럼 내민 부러진 가지들, 깊은 골짜기와 언덕, + 깊고 아득한 진흙구덩이와의 싸움이다. 이제는 진흙탕을 보아도 피하거나 머뭇거림도 없이 내딛는다. 뇌가 사고(思考)할 틈을 주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게 “Run!”이라는 단어가 입력된 로보트 같다. 머리와 심장도 수면상태, 배낭을 멘 어깨도 감각을 잃은 지 오래. 오직 모터 단 듯 날뛰는 두 발만이 살아 날뛰며, 몽롱한 최면상태의 나를 내리막길로 굴린다.
저 아래 녹색 물그림자가 얼룽인다. 다 왔구나. 아들애의 이름을 부르자 “여기요~~.” 긴 메아리가 따라온다. 컴컴한 숲 속에 텐트 패드 세 개가 보이고, 아랫채 앞에 피워놓은 모깃불이 매캐한 연기를 뿜고 있다. 겨우 물주머니 반만이나 남겨온 물로 밥 짓는 중에 들어서는 후미 팀.
와, 해냈다. 코리안 NCT 팀 만세!.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도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야생의 생존자들 만만세!!

막힌 블러프에서 길을 봐주고 손 잡아준 성현 씨 내외, 밀물 때 바닷물에 들어가 팀원들 건네준 아들애, 모닥불 피우고 지친 팀을 위해 엽렵하게 식사 준비해준 메이, 물 떠다 날리고 늘 웃는 얼굴로 든든하게 후미를 지켜준 일손 님, 리더 말에 맞장구쳐 팀 분위기 돋워준 청산 님, 개성 강한 팀원들이 서로 양보하여 이루어낸 완벽한 하모니의 승리.
자연이 아름답다 하여도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으면 빛이 바래고, 자연이 위대하여도 사람의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 또한 무위(無爲)이니,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의 눈길이 닿는 곳에 모닥불처럼 피어나는 사랑의 불꽃,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닿는 곳에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NCT 트레킹의 마지막 밤이 들고양이(조지의 말에 의하면 쿠거 울음소리) 울음소리와 함께 저물어간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글: 김해영 ∙사진:백성현의 다른 기사
(더보기.)
글: 김해영 ∙사진:백성현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