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갑식 선임기자
꿈도 시작은 소박했다 그런데 욕망이 불타오르는 순간 그것은 늪이 돼
아버지·어머니와 임금님마저 삼켜버렸다 계절은 이렇게 아름다운데…옛날에 잘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헌법(憲法)은 딱 두 줄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단, 임금보다 덜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금님은 자기가 나라 다스리느라 고생했기에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나라엔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의무를 어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그래도 못 미더워 몸소 궁성(宮城) 밖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자기보다 더 행복한 촌장(村長)을 발견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벼슬을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사내가 행복해하자 그의 예쁜 아내와 착한 아들·딸을 죽였고 다음에는 사내를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임금님도 스스로 너무 모진 게 아닐까 뉘우쳐 보았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헌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임금님은 마침내 사내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서 고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궁금해 가 보니 지푸라기, 나무젓가락, 밥풀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행복하구나!" 임금님이 떨며 독배(毒杯)를 건네자 사내는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잘됐군요. 하늘에서 가족을 만나게 됐으니…." 질투에 몸 단 임금님은 "너에게 질 순 없다"며 독배를 빼앗더니 냉큼 자기 입에 부었습니다.
■
서울 운현궁 터 근처에 한의원이 있었다. 세상을 고통에서 구하자며 할아버지가 세워 3대(代)째 내려오던 그곳이 얼마 전 사라졌다. 부지런하고 불우이웃 돕기에도 남달랐던 주인이었다. 그의 때아닌 영락(零落)이 궁금해 수소문해봤다.
퀭한 눈빛의 50대가 털어놓는 스토리가 허무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미국 보냈잖아. 손님은 주는데 타지(他地)에서 처자식 고생할까 봐 빚을 썼지. 넘어갔어, 경매(競賣)로." 사나이 실패,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지만 결말이 괘씸했다.
"마누라와 아들은 연락도 없어. 딸만 몰래 전화해 울더군. 자기들은 잘 지낸다며…."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기러기 아빠'의 말로(末路)를 이렇게 목격했다. 그에게 건넬 수 있는 건 쓴 소주 한잔, 말 한마디뿐이었다. "꼭 재기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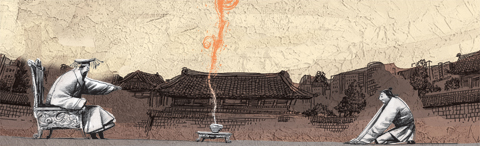
▲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박완서(朴婉緖)의 소품 '마지막 임금님'이 떠오른 건 그때였다. 남을 못 이기곤 못 배기는 우매한 임금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커 그걸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삶을 용납하지 못한다." 평론가 박덕규의 해설이다.
한의(韓醫)의 꿈도 시작은 소박했을 것이다. '남보다 조금 더 앞서보자'는 그 작은 욕망이 괴물이 돼 가족을 손익(損益)이란 차가운 관계로 만들고 말았다. 만일 그에게 이리 말했던들 들었을까. "사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온 식구가 숟가락 꽂고 다투는 게 행복인데요."
■
'아버지의 마지막'을 목도하며 '마지막 임금님'을 떠올리다 보니 주변이 온통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군상(群像)투성이다. 한 대학 후배는 갓 부장된 자기 회사 상사의 말에 통음(痛飮)했다고 한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의 말은 이랬다고 한다.
"내 3년은 더 해먹어야겠는데…. 아무래도 네가 걸리적거리니 나가 달라!" 그 말을 한 이는 자신의 삶만이 영생불사(永生不死)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어디 '마지막 부장님'뿐이랴, '현대판 임금님'은 연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날 위해 몸 던지는 이는 없고 다 제 살 길만 찾는다" "내가 기업 있을 땐 안 그랬다" "남 탓하는 사람 성공 못한다"…. '현대판 임금님'은 자신이 허무(虛無)에 젖어 있는 동안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
4·2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특히
한나라당 수도권지역 의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그중 한 의원이 딸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아내가 울먹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의 아내는 매일 관내 복지관을 돌고 있다. 그 수가 열개가 넘으니 식모(食母)도 이런 식모가 없다. 그게 벌써 3년째다. 물론 목표는 남편의 재선, 몇 표 더 얻자는 '소망'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저녁때만 되면 팔다리가 퉁퉁 붓기 일쑤인데 딸이 앞치마를 넣어둔 핸드백을 보고 한마디 던졌다는 것이다. "엄마, 너무 냄새나." 앞치마 빨아주겠다는 '효도'까지 기대한 건 아니지만 격려는커녕 '짬밥 냄새' 타박하는 철부지의 말에 아내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보고 뺨 한 대 올려붙이려다 겨우 참았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오월이다. 가정의 달이고 계절의 여왕(女王)이다. 그렇게 소중한 하루하루인데 임금님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두터운 욕망의 담장 속에 틀어박혀 세월을 잊고 산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햇빛 좋은 이 봄이 오히려 애처롭다.
 ▲ 문갑식 선임기자
꿈도 시작은 소박했다 그런데 욕망이 불타오르는 순간 그것은 늪이 돼
▲ 문갑식 선임기자
꿈도 시작은 소박했다 그런데 욕망이 불타오르는 순간 그것은 늪이 돼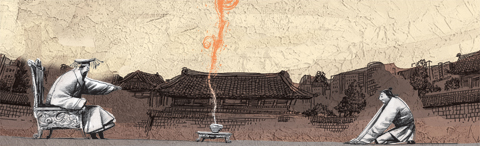 ▲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