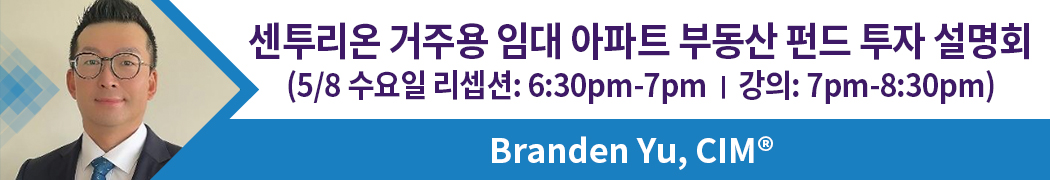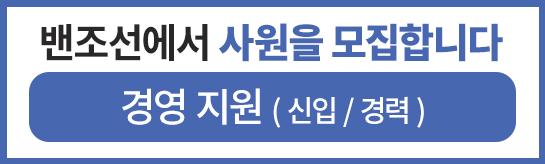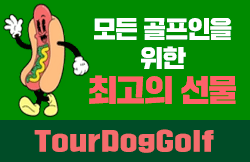최낙경 / 캐나다 한국문협
지난주 대학 동기 모임에 참석했다. 56학번이니 62년이란 세월이 흘러 간 셈이다. 모두 들 새하얀 머리에 세월의 골이 깊숙이 파인 주름살로 산수傘壽를 바라다보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대학에 들어갔던 지난 세월만큼 시간이 흐른다면 내 나이는 124세. 그때 나는 이 모임에 분명 참석하지 못하리라. 게다가 나와 같이 82세인 사람이 겨우 91,308명이 살아 있다니. 나의 죽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서성이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소름이 돋았다.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투성인 것이 삶이라지만 죽음은 이처럼 확실한 것으로 다가 선 것이다. 그런 죽음에 나는 무감각하고 몽매하다. 지난해 거처를 옮긴 노인 시설인 실버타운에서, 평균 연령 84세의 입주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죽음이란 단어는 아예 입에 담기조차 터부시하고 있다.
우선 우리의 죽음의 환경은 어떠한가? 지난해 집에서 숨진 사람은 전체 28만 827명의 15.3%에 그치고, 반면 74.9%가 병원 객사客死가 대세大勢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기 환자 등 임종에 이르면 하나같이 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늘어놓는 다는데... 그들은 예부터 내려오는 오복五福중의 하나인 고종명考終命을 떠 올린 바람이 아녔을까? 그러나 집에는 그를 간호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객사나 비명非命이 아닌 편안하고 사랑 받는 장소에서 죽음을 맞고 싶다는 것, 요즘 말로 품위 있는 죽음을 호소하는 것으로 각인된다. 선진화된 호주濠洲에서는 환자의 아픔을 돌보며 가족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다소간 가볍게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호스피스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호스피스마저 턱없이 부족하여 언감생심. 거이 대부분은 홀로 찬바람이 으스스 깔린 어느 병원의 언저리에서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섭고 외로운 정신적 혼란에 몸부림치며 맞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거쳐야 하는 처절한 삶의 마무리의 모습인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20.8%인 138만 명이 가족 없이 홀로 사는 홀몸 노인들이다. 한해 4% 넘게 늘어나고 지난해는 노인 고독사가 835명으로 최근 4년간 80%나 크게 늘어났단다. 노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서도 자살이나 홀몸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다 준비 없이 100세 시대를 맞는 오늘의 노년은 거이 10년 여의 세월 동안에 병원을 드나들며 서서히 기운을 잃고 쇠약해지면서 가늠키 어렵고 지겨운 나날을 이어 갈 뿐인 것이다. 그들은 마지못해 법적이고 가족, 친지, 주변의 버거운 어려움을 알면서도 자살이라는 유혹에 홀리게 되었으리라. 죽는 길마저 자유롭지 못하여 괴롭고 슬픈 지경인 것이다.
그나마 이러한 환경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는 마지막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1998년 최종현 SK회장이 재발한 폐렴의 항암 치료를 거부한 채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였고, 소설가 박경리는 항암치료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시詩를 써서 임종한 그 해에 시집을 출간했다.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일체의 생명연장 조치를 거부했다.“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인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도 피부암이 악화되자 10여 일 동안 곡기를 끊고 삶을 마무리했다. 또한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장례식도, 수의壽衣도, 관도, 자기 저서의 발간도 모두 거부하는가 하면 죽으면 곧바로 화장을 주문하면서 삶을 마무리한 법정스님도 있었다.
며칠 전 “104세의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 베토벤 9번을 들으며 잠들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그는 아직도 병은 없지만 건강이 갑자기 약해졌다며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해서 조력사가 인정되는 머나먼 스위스로 갔다. 가까운 가족, 친지들과 베토벤 9번을 틀고 고별 연을 갖는 자리에서 병원이 처방한 치사 약을 주사기에 연결된 밸브를 손수 열어 삶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죽는 것보다 죽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게 진짜 슬픈 일”이라며 “노인의 조력자살 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조언助言을 남겼다. 이를 계기로 조력자살을 비윤리적이고 생명경시輕視라는 반론을 잠재우고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고종명 보다 더 진화된, 품위 있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폭제起爆劑가 되기를 기대하며 두 손을 모은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낙경의 다른 기사
(더보기.)
최낙경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