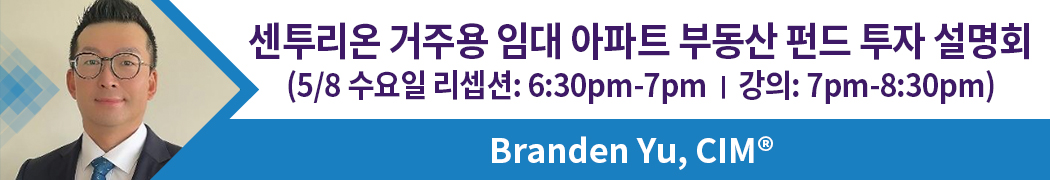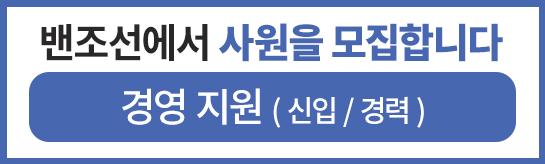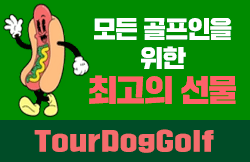아청 박혜정 / 한국문인협회 밴쿠버지부 회원
반 백 년 정도의 숨 가쁜 세월을 살다 보니 누나, 언니의 호칭이 어느 새 할머니라는 호칭으로까지 달라져 있었다. 결혼 전에는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단순했다. 동생들이 누나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우리 엄마가 낯선 느낌의 친정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으니 내가 엄마가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해서 언니라고 불리면 딱 좋을 것 같았다. 둘째가 엄마라 부르니 그때쯤에야 익숙해졌다.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인데 우리 아이들은 남들보다 일찍 하다 보니 금세 할머니가 되었다. 아직 엄마 역할도 다 못한 것 같은데 벌써 할머니 역할까지 해야 하니 적응이 잘 안 된다. 처음 손녀가 말을 하면서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깜짝 놀랐다. 어렸을 때는 할머니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우리 딸이 막내 외삼촌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전화를 했다가 “잘못 걸었어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경우가 생각이 나서 빙그레 웃음이 났다. 아마도 외사촌이 초등학생일 때니까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것을 상상도 못하셨을 것 같다.
대학 동문회에 가서 벌써 할머니가 된 것에 적응이 안 된다고 했다가 선배님들께 핀잔을 들었다. 왜냐하면 선배님 아이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얼마나 할머니가 되고 싶은데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또한 배부른 소리구나’라는 생각으로 할머니라는 호칭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호칭엔 왜 이리 적응이 안 되는지…. 아마 ‘마음은 청춘인데….’ 그래서 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남편은 변해가는 호칭을 좋아한다. 아빠가 되었을 때도 해외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아마 지금은 뒤집기를 하고 조금 있으면 걸음마를 하겠지….” 두 딸들이 성장해서 자기 짝과 함께 집을 떠나니 덩그러니 우리 부부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적막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손녀가 태어나면서 다시 활기가 생겼다. 이것이 다 자연의 섭리 같다.
대체로 남자들은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갖게 되면 행복해 한다. 이유인 즉 자기 아이를 키울 때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할 수 없다. 하지만 손자, 손녀는 그냥 예뻐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남편도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꽤나 사랑한다. 손녀가 태어날 때도, 손녀가 커 가면서 아이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할아버지!” 라고 부르면 좋아한다. 아이들이 집에 한 번 오면 집이 엉망이 되지만 조용한 집이 아이들의 쿵쾅거리는 소리로 뒤덮일 때는 시끄러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금방 ‘그래, 다치지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라’ 라는 생각으로 바뀐다.
설날에 두 딸과 사위들이 온다고 했다. 미국에 사는 첫째 딸 가족은 미리 며칠 전에 와서 놀다가 설날 전날에 손녀들과 온 가족이 모여 만두를 빚었다. 설날 아침에는 속이 꽉 찬 어른들이 만든 만두와 고사리 손으로 빚은 속이 헐렁한 만두와 함께 떡국을 먹었다. 손녀가 “설날에는 왜 떡국을 먹어야 해요? 그래야 한 살을 더 먹는단다.” ‘아이들은 한 살을 더 먹을수록 좋아하고 어른들은 글쎄….’ 한복을 입혀놓은 손녀들의 어설픈 절 솜씨에 내게 붙여진 할머니라는 호칭에 좀 더 적응이 된다.
둘째는 일이 있어서 저녁에 늦게 온다고 했다. 둘째 사위는 케네디언인데 한국에서 1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 음식도 좋아한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해 주는 갈비찜이라고 했다. 그래서 장모 호칭에 맞는 일을 해 보려고 미리 갈비를 재어 놓았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등산 팀에서 새해 첫 일몰을 보러 산위에 간다는 번개 모임이 카톡방에 뜨기에 아이들이 온다는 저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따라 나섰다.
일몰을 보고 내려오면서 커피 한 잔을 하고 가자고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가 저녁에 온다고 해서 가야해요’ 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온다는데 산에 왔어요? 나 같으면 음식 준비하고 집에서 아이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라고들 하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준비하고 왔는데, 엄마라는 호칭에 걸 맞는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어리둥절했다.
며칠 전 산악회에서 선샤인코스트에 간다고 해서 그 전 날부터 도시락도 싸고 첫 배를 타야하므로 기대에 부풀어서 일찍부터 잠자리에 들었다. 중간에 잠시 잠이 깨어 셀폰을 보니 딸에게서 온 카톡이 있었다. “엄마, 아이들이 감기가 들어서 열이 나는데 오실 수 없어요?” ‘밤에 온 카톡이니 떠나기 전에 확인을 해보고 괜찮다면 여행을 가야지’
집을 나설 시간쯤에 전화를 했다. 새벽 시간이고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잠이 깊이 들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망설여진다. 어떻게 할까?’ 그래도 아프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배를 타러 갈 수도 없고. 일단 배를 타면 다시 거꾸로 올 수도 없고, 만약 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가 괜찮다면…, 기대했던 여행인데….’ 마음의 갈등을 겪으며 전화를 다시 해 보았다. “아직도 열이 있어요. 그래, 그럼 갈게….” 호칭에 충실 하느라 내가 하고픈 일을 못했다. 거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는 편인데, 어째 점점 자유가 더 없어지는 듯하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새로운 호칭에 적응이 되면서 익숙해져가기까지 한다. 또 가족 간의 호칭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이나 그 외의 호칭에도 경험과 세월이 덧입혀지면서 남의 옷이 아닌 자기에게 맞는 옷처럼 되어 간다. 예를 들면, 선생님, 사장님, 집사님, 권사님 등 등. 그 호칭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호칭을 부르는 사람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나쁜 인상까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호칭에 걸 맞는 행동을 해 나간다면 먼 훗날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아청 박혜정의 다른 기사
(더보기.)
아청 박혜정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