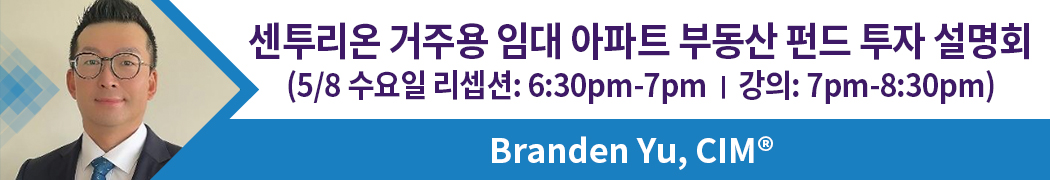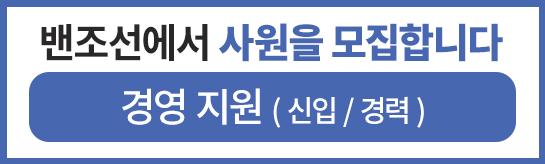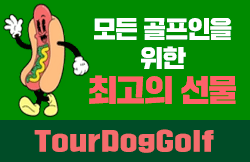한국문협밴쿠버지부 회원기고/수필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도시락가방을 들고 남편이 살고 있는 캐어 라이프 요양원으로 향한다. 그곳은 8개의 집으로 나누어있는데 남편이 있는 곳은 메이플 하우스이다.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분류해 놓은 셈이다. 메이플 하우스에는 인공호흡기를 꽂은 사람들이 산다. 남편처럼 밤에만 인공호흡기를 꽂는 사람도 있지만 24시간을 호흡기에 의존하여 사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메이플 하우스는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병원 중환자실과 연결되어 온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들 대부분은 그 곳에 입원해있을 때 호흡기 제거를 강요당해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서 호흡기를 뗀다는 건 죽음을 의미한다. 사고능력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족이 선택해야한다. 이것이 캐나다 의료정책이라 하니 이곳에 산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중환자실에서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에는 대부분 환자나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다. 처음 왔을 때 잘 웃는 내가 이상했는지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 늘 웃나요?”하고 물었던 간호사가 있었다. “남편과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좋아서 웃지요”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그렇다. 어쨌든 남편이 살아 있어서 매일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물론 환자나 가족이 그 행운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을 돕는 일이 사실 힘 든다. 밤에 운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아예 방 하나를 요양원 바로 뒤에 얻어 지낸다.
남편은 사지마비로 인해 종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요양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호흡과 관계된 석션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즉각 도와주지 못한다. 나는 아침 10시전후로 이곳에 와서 밤 10시가 넘어야 간다.
남편한테 가면 제일 먼저 창문의 커튼을 열어 아침을 알리고 조용히 음악을 틀어 잠을 깨운다. 이미 깨어 어둠침침한 방 침대에서 눈을 깜박거리고 있을 때도 많다. 그 다음은 남편에게 따뜻한 물을 마치 차 한 잔을 대접하듯 주사기로 튜브에 넣는다. 체온과 혈압을 잰 후 이와 얼굴을 닦아주고 운동을 시킨다. 소변은 잘 나오고 있는지 몸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도 살핀다. 한 시간 또는 한 시간 반이 지나면 그때서야 담당 간호사가 남편을 돕기 위해 들어온다. 그는 남편의 몸을 닦고 새 가운으로 갈아입힌 후 몇 군데 드레싱을 한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이 더 들어와 휠체어에 앉히는 걸 돕는다. 나는 잽싸게 남편을 바른 자세로 앉힐 수 있도록 거든다. 남편이 휠체어에 앉고 나면 그 때부터 4시간 동안은 내 몫이다.
나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로비나 휴식공간으로 나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춥지 않은지 수시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점검한다.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체온과 혈압이 낮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하면 저체온이 되기도 하고 저혈압이 되어 정신이 혼미하기도 한다. 남편은 평소 뉴스 듣기를 좋아했는데 여전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국이나 미주 등 세계소식을 듣는다. 그것이 남편에게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이 아닌가 한다. 음악을 들으며 혼자 조용히 있는 걸 편안해한다.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잊기 위해 뭔가를 듣는 것 같다. 나는 곁에서 혈압의 높낮이에 따라 휠체어 위치를 바꾸어준다.
남편은 앉아있는 동안 튜브를 통하여 유동식을 먹는다. 나 역시 옆 테이블에 앉아 점심식사를 한다. 처음엔 그에게 음식냄새를 풍기지 않으려고 도시락뚜껑을 닫아가며 조용히 먹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시도해보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네 달 전 중환자실에 있을 때 몸이 회복되어 가면서 "한 번 시도 해보게 딸기하고 포도, 바나나를 가져와 봐요"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사실 남편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줄은 예상 못 했지만 그리도 갑자기 먹고싶어 할지도 몰랐다.
이곳에 오면 음식을 주는 줄 알고 왔으나 계속 음식을 주지 않자 가족에게 자꾸 역성을 내곤 했다. 오렌지 하나만, 밥 한 수저만, 어느 때는 바나나 반개만 가져와보라고 애원을 했다. 내 눈을 쳐다 보며 약속하라는 그의 눈빛은 애처롭다 못해 슬퍼보였다. 그런 날은 나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 여보, 몇 달 뒤 당신이 음식을 넘길 수 있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볼 테니 그 때 까지만 우리 견뎌봅시다. 지금 당신이 음식을 먹으면 폐로 넘어가 폐렴이 되고 위험해진데요.” 그 뒤로 남편은 다시 음식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더러는 점심을 먹으라 한다. 남편이 하나씩 즐거움을 잃게 된다 생각하니 안쓰럽기 짝이 없다.
나는 이곳에서 남편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던지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간호사들의 손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남편을 닦아놓기도 하고 석션까지도 배워서 한다. 처음엔 문화적 차이와 내 영어의 한계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서로 오해하기 일쑤였다. 우리 부부는 새로운 환경과 그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해져 무기력상태로 한참을 보냈다. 이러던 중 내가 깨닳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 인내, 그 인내는 체념에서 온 것이었다. 남편이 좀 망가지더라도 도와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한다는... 그들은 점점 나를 인정해주고 지금은 자기네 일을 도와주는 것을 고맙게 여긴다. 마치 가족처럼, 동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며 우리를 이해하려는 면이 보인다. 여기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 나 또한 그들의 노고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간호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도 열게 된 셈이다.
‘나는 과연 아내인가 간병인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 간병인이라면 힘들 때 떠날 수도 있으련만 아내는 그렇지 못하다. 고달프지만 남편이 있어 좋다. 이제 가장이 되어 가장으로써 그가 겪었던 어려움도 체험하며 한 생명을 더 아끼게 되었다.
남편에게 아내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젊어서는 가파른 길을 힘있게 올라가라고 재촉하고 늙어서는 늘 옆에서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지팡이. 제 살이 닳아 지팡이는 자꾸 작아지지만 남편이 나의 손을 잡고 있는 한 나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받치고 있을 것이다. 그 인고의 자리로 나는 나아간다.
메이플 하우스는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병원 중환자실과 연결되어 온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들 대부분은 그 곳에 입원해있을 때 호흡기 제거를 강요당해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서 호흡기를 뗀다는 건 죽음을 의미한다. 사고능력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족이 선택해야한다. 이것이 캐나다 의료정책이라 하니 이곳에 산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중환자실에서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에는 대부분 환자나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다. 처음 왔을 때 잘 웃는 내가 이상했는지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 늘 웃나요?”하고 물었던 간호사가 있었다. “남편과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좋아서 웃지요”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그렇다. 어쨌든 남편이 살아 있어서 매일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물론 환자나 가족이 그 행운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을 돕는 일이 사실 힘 든다. 밤에 운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아예 방 하나를 요양원 바로 뒤에 얻어 지낸다.
남편은 사지마비로 인해 종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요양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호흡과 관계된 석션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즉각 도와주지 못한다. 나는 아침 10시전후로 이곳에 와서 밤 10시가 넘어야 간다.
남편한테 가면 제일 먼저 창문의 커튼을 열어 아침을 알리고 조용히 음악을 틀어 잠을 깨운다. 이미 깨어 어둠침침한 방 침대에서 눈을 깜박거리고 있을 때도 많다. 그 다음은 남편에게 따뜻한 물을 마치 차 한 잔을 대접하듯 주사기로 튜브에 넣는다. 체온과 혈압을 잰 후 이와 얼굴을 닦아주고 운동을 시킨다. 소변은 잘 나오고 있는지 몸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도 살핀다. 한 시간 또는 한 시간 반이 지나면 그때서야 담당 간호사가 남편을 돕기 위해 들어온다. 그는 남편의 몸을 닦고 새 가운으로 갈아입힌 후 몇 군데 드레싱을 한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이 더 들어와 휠체어에 앉히는 걸 돕는다. 나는 잽싸게 남편을 바른 자세로 앉힐 수 있도록 거든다. 남편이 휠체어에 앉고 나면 그 때부터 4시간 동안은 내 몫이다.
나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로비나 휴식공간으로 나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춥지 않은지 수시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점검한다.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체온과 혈압이 낮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하면 저체온이 되기도 하고 저혈압이 되어 정신이 혼미하기도 한다. 남편은 평소 뉴스 듣기를 좋아했는데 여전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국이나 미주 등 세계소식을 듣는다. 그것이 남편에게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이 아닌가 한다. 음악을 들으며 혼자 조용히 있는 걸 편안해한다.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잊기 위해 뭔가를 듣는 것 같다. 나는 곁에서 혈압의 높낮이에 따라 휠체어 위치를 바꾸어준다.
남편은 앉아있는 동안 튜브를 통하여 유동식을 먹는다. 나 역시 옆 테이블에 앉아 점심식사를 한다. 처음엔 그에게 음식냄새를 풍기지 않으려고 도시락뚜껑을 닫아가며 조용히 먹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시도해보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네 달 전 중환자실에 있을 때 몸이 회복되어 가면서 "한 번 시도 해보게 딸기하고 포도, 바나나를 가져와 봐요"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사실 남편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줄은 예상 못 했지만 그리도 갑자기 먹고싶어 할지도 몰랐다.
이곳에 오면 음식을 주는 줄 알고 왔으나 계속 음식을 주지 않자 가족에게 자꾸 역성을 내곤 했다. 오렌지 하나만, 밥 한 수저만, 어느 때는 바나나 반개만 가져와보라고 애원을 했다. 내 눈을 쳐다 보며 약속하라는 그의 눈빛은 애처롭다 못해 슬퍼보였다. 그런 날은 나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 여보, 몇 달 뒤 당신이 음식을 넘길 수 있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볼 테니 그 때 까지만 우리 견뎌봅시다. 지금 당신이 음식을 먹으면 폐로 넘어가 폐렴이 되고 위험해진데요.” 그 뒤로 남편은 다시 음식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더러는 점심을 먹으라 한다. 남편이 하나씩 즐거움을 잃게 된다 생각하니 안쓰럽기 짝이 없다.
나는 이곳에서 남편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던지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간호사들의 손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남편을 닦아놓기도 하고 석션까지도 배워서 한다. 처음엔 문화적 차이와 내 영어의 한계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서로 오해하기 일쑤였다. 우리 부부는 새로운 환경과 그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해져 무기력상태로 한참을 보냈다. 이러던 중 내가 깨닳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 인내, 그 인내는 체념에서 온 것이었다. 남편이 좀 망가지더라도 도와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한다는... 그들은 점점 나를 인정해주고 지금은 자기네 일을 도와주는 것을 고맙게 여긴다. 마치 가족처럼, 동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며 우리를 이해하려는 면이 보인다. 여기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 나 또한 그들의 노고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간호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도 열게 된 셈이다.
‘나는 과연 아내인가 간병인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 간병인이라면 힘들 때 떠날 수도 있으련만 아내는 그렇지 못하다. 고달프지만 남편이 있어 좋다. 이제 가장이 되어 가장으로써 그가 겪었던 어려움도 체험하며 한 생명을 더 아끼게 되었다.
남편에게 아내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젊어서는 가파른 길을 힘있게 올라가라고 재촉하고 늙어서는 늘 옆에서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지팡이. 제 살이 닳아 지팡이는 자꾸 작아지지만 남편이 나의 손을 잡고 있는 한 나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받치고 있을 것이다. 그 인고의 자리로 나는 나아간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