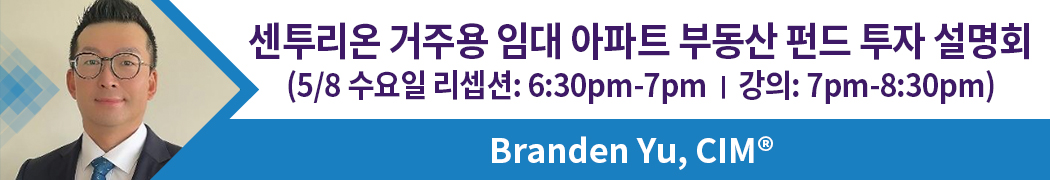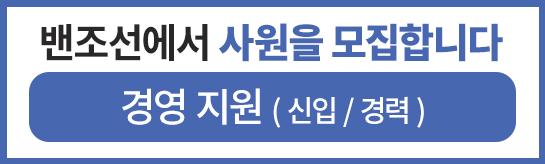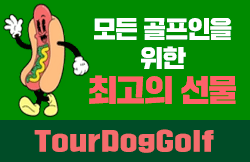휴우! 한 숨이 저절로 나온다. 일 시작하고 부터 끝날 때 까지 등골에 땀을 몇 번이나 흘려 버렷던가. 한 공간 안에서 시간이 멈춘 듯
눈과 코와 입이, 아니 두 손까지 각자 움직여서 만들어낸 음식들은 수고에 비하여 너무 약소해 보이는 것 같다. 음식들을 서버에게 인계하고
나는 잠시 과거로 돌아 간다.
내가 아이들을 키울때는 나의 귀여운 자식들이 쏙쏙 받아 먹는게 신기하고 예뻐서 열심히 요리를 햇다. 제비 새끼같이 받아먹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고 나는 한없는 허전 함에 무얼 할까 참으로 많이 고민을 했다. 고민 이라기 보다 더 이상 쓸모 없는 사람의 나락으로 주저
앉는 불안함 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가 보수를 주는 직업도 아니요, 누가 나에게 평가를 내려주는 직업도 아니었지만 내 일생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이었다. 그리고 남편과 둘만 남은 큰 집에서 덩그마니 냄비의 바닥에 달랑 바닥만 가린 만큼의 찌개를 끓이거나 밥 솥의 바닥에 간신히
씻은 쌀을 앉히고 나면 참으로 재미 없는 일이다 라고 혼자 중얼거렷었다.
영영 다시 올것 같지 않던 행복한 시간에 대한 그리움, 해고 당한 사람같은 소외감 등등 이대로 우울증에 빠져 들것만 같았다. 그래도 시간은
흐른다는 말처럼 그래, 정말 시간은 흘러 수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는 다시 행복을 맛보고 달콤한 칭찬에 귀를 간지르며 살고 잇다. 나는
백에서 백오십의 제비둥지를 책임지고 잇는 쉐프가 되었으니 말이다. 나의 제비 둥지엔 예쁜 할머니와 귀여우신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다.
때로는 불평도, 때로는 칭찬도 듣지만 칭찬은 간직하고 불평은 나를 발전시키는 영양제로 삼으면서 되는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실전에
나갓을때 경험없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조용히 덮어 주시며 나의 음식을 잡수어 주셨던 나의 사랑스런 노인들.
많은 실수가 잇엇지만, 제일 죄송한 사건이 하나 떠오른다. 어느 날 나는 크림 파스타를 너무 메마르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원래는
크리미하고 국물이 자작하도록 해야 노인분들이 잡숫기 부담이 없는데 워낙 많은 종류를 하다보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에는 이런 실수가 자주
일어난다. 서빙시간은 닥쳐 왔는데 다시 베차멜소스를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대로 내보냇다가는 노인들이 잡숫기엔 너무 빡빡한것이
분명한데 어쩐다? 할수 없이 우유에 전분가루를 끓여 농도를 맞추고 하느님께 기도 하엿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시지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 주세요. 다음에 제가 오늘의 이 실수를 잊지 않고 성의를 다하여 다시 멋진 파스타를 만들어 드리겟습니다 라고.
서버들이 다시 주방에 올때까지 나는 안절부절하며 나의 고객들에 대한 죄송함으로 등골에 땀을 주르르 흘렸었다. 다행이 아무도 불만이 없었던 듯 그 날 하루 일과가 무사히 끝났다.
서버들이 다시 주방에 올때까지 나는 안절부절하며 나의 고객들에 대한 죄송함으로 등골에 땀을 주르르 흘렸었다. 다행이 아무도 불만이 없었던 듯 그 날 하루 일과가 무사히 끝났다.
다이닝 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갈때 할머니 한분이 나를 부르신다. 내 손을 꼭 잡으시며 " 당신이 오늘의 쉐프야? ". 하신다. 겁에
질렸지만 웃으며 "네" 라고 하니 "오늘 잘 먹엇어. 혹시 다른 사람이 불평하거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어떤 노인들은 괜히
불평을 해. 당신이 보지 많을 때 그들은 음식을 보면 후르륵 마구 먹으면서 그래." 하신다. 이 말씀 한마디. 가슴 속에 박힌 오물
덩어리를 손가락 집어 넣어 꺼내가신 것 처럼 후련하게 만들어 준다. 또 한번 후끈한 것이 등골에 땀이 흐른다.
바로 이맛이야. 내가 일 하는 맛. 나의 자식들이 입을 쪽쪽 벌려 맛잇게 받아먹던 그 기쁨과 비슷한 맛. 저녁시간 한시간에 전부터 다이닝 룸에 앉아 입 맛을 다시머 기다리시는 나의 고객들. 나는
밥을 짓는 여자가 아니고 사랑을 짓는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 나의 밥을 기다리시는 노인 제비의 입을 벌리게 하는 여자. 집에 까지 따라온
할머니의 칭찬은 꼬오옥 간직한다. 그 힘으로 다시 집에 잇는 남편 제비의 입까지 즐겁게 해 주는 것이다. 나는 밥 짓는 여자.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난호의 다른 기사
(더보기.)
김난호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