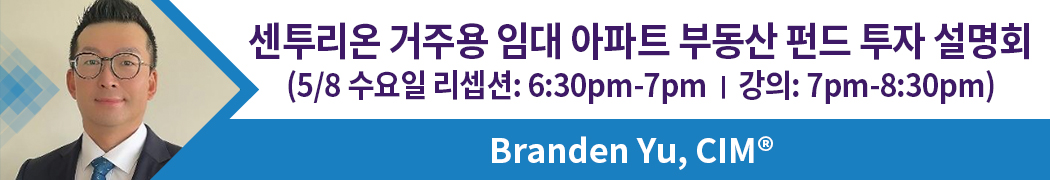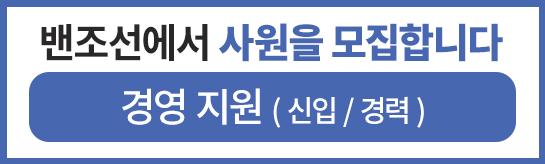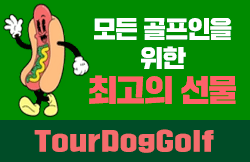할매 피부가 아직도 팽팽하던 50대 초반이었을 테지. 어느 날 한가로이 작은 약국 한 귀퉁이에 잡스런 물건들과 함께 진열대에 걸터앉아 있던 나를 그날 아직도 피부가 팽팽했던 지금의 할매가 나를 사갔다. 그 날 이후로 아줌마, 아니 이젠 할매가 된 이 여인의 화장실 거울 아래 늘 같은 장소에 놓인 작은 주머니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 할매는 길거나 짧거나 여행을 갈 때면 반드시 이 작은 주머니를 챙겼다. 주머니 안에는 나 외에도 끝이 날카로운 가위, 앙증스러운 손톱깎이 그리고 쪼고만 손톱정리 톱이 함께 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자의 소임대로 깎고 자르고 다듬고 뽑고 할매의 얼굴위에서 십 수 년을 함께 일했다. 그래서 우리는 할매의 얼굴을 대하면 금세 할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친숙해 졌다.
할매가 아직 중년이었을 때 우린 참 바빴다. 나는 얼굴 전체에 뽀송뽀송 난 솜털을 말끔히 뽑아내는 작업을 했다. 코 밑, 입술 아래, 또 얼굴 양 옆 볼따구니 아래에 난 복숭아 털 같은 보드라운 솜털을 뽑아내는 작업이었다. 그 일을 할 때 나는 얼마나 신이 났던가! 여인의 손가락 사이에 착 밀착되어 일 할 때는 마치 내가 주인의 손가락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특히 주말 한가한 시간 아침나절에 일 할 때는 멋진 클래식 음악도 흘러나와서 우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즐기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나와 내 친구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 할매가 아직 70이 채 되기 전, 그 해 그리스마스 때, 어느 날 할매는 우리를 버려두고 짐을 챙겨 나갔다. 우리가 사는 이 지갑을 챙기지 않은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라 우린 모두 놀랐고 불안 해졌다. 알고 보니 할배가 위독해서 얼마 못산다고 아예 할매가 병원에서 자느라 우릴 두고 떠난 것이다. 할배가 다신 집에 못 오겠구나, 그럼 할배 죽으면 할매는 어떻게 살지? 그런 이야기를 하며 며칠이 지났다. 그 날은 몹시도 추운 날이었지. 낮 최고가 영하 10도라 했지! 햇빛이 눈동자가 아프도록 쨍 하던 그 날 할매의 아들이 할배의 영정을 들고 앞서고 뒤로 식구들이 우르르 집안을 돌며, “아빠! 우리 집 한테 인사해, 아빠 바이 해!” 한국어가 서투른 할매의 아들이 우리가 있던 화장실까지 들어왔다 나가며 자기 아빠를 안고 말하듯 영정 사진에게 속삭였다. 할매는 우는지 마는지 넋 나간 사람처럼 영정 사진을 뒤쫓아 휘 나갔다.
그날 이후 할매가 우리를 더듬어 찾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할배가 간 후 거의 석 달은 아예 우리 지갑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가끔 손톱깍이만 찾았다. 할매는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 아예 거울을 들여 다 보는 것도 잊은 듯 했다. 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다가오자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우리들을 끄집어내어 작업을 했다.
할배가 간 뒤로 많은 사간이 흘렀다. 제설차가 마구 뿌리고 간 소금을 바가지로 머리에 뒤집어 쓴 듯 백발이 성성한 할매는 예전같이 자주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꺼내어 작업을 했다. 손톱깎이는 여전히 짤각 짤각, 작은 가위는 눈썹 위에서 싹둑싹둑, 전에 나지 않던 원치 않는 긴 눈썹을 한 오래기씩 잘라냈다. 젊어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눈썹이 고르지 않게 삐져나온다고 귀찮아하면서.
나는 점점 일이 뜸해지는가 했지만 가끔 느닷없이 나를 꺼내 들고 턱밑에 난 털 하나를 사정없이 쏙 뽑았다. 할매는 중얼 거렸다. “이 나이에, 아직도 뽑아야 해? 너를 뽑아내면 또 다른 놈이 돋아 나오겠지? 이젠 이놈을 뿌리 채 뽑아버려야지. 뾰족이 나오는 너는 바오로 사도의 가시(고린도 후서 12. 7,8)처럼 내 교만을 일깨우려 내 턱밑에 뿌리 내리고 앉아 나를 괴롭히지만, 네가 나오기 무섭게 나는 너를 뽑아내야 해. 너를 내 턱 밑에 붙이고는 할배를 만나러 갈 수가 없지!” 오늘도 나는 할매의 마음을 읽고 턱 밑에 난 털 하나를 사정없이 쏙- 뽑았다.
김춘희. 수필가
전 몬트리올 공인 통·번역사
현재 밴쿠버 문인협회 회원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춘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김춘희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