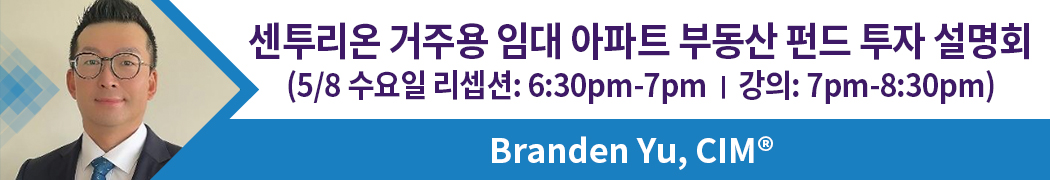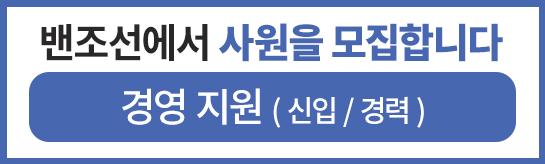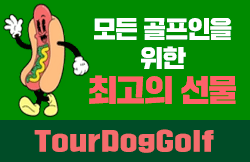우리 여자들은 친정하면 부모님이 떠오른다. 그 중에서도 친정어머니는 친정의 대명사처럼 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있다. 나도 2년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의 큰 딸이었고 어머니가 계신 친정이 있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지금 내게 친정은 어디일까 생각 해 본다. 오빠 한 명에 남동생이 세 명 있으나 핵가족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친정이라고 의지하기는 너무도 미지근하고 어설프다.
세상의 딸들은 친정이 있어서 언제나 든든하고 때로는 부모님께 불효하지 않으려고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살아간다. 우리 세대 여성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한다’는 소리를 몇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친정은 가장 가깝고 허물이 없지만 일단 시집을 가고나면 그리워하면서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친정이기도 하다.
나는 전라도 광주에서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 진해로 시집갔고 그 곳에서 직장생활까지 하다 보니 첫 아이를 낳아 돌이 가까워서야 친정집에 갔다. 진해에서 택시를 대절하거나 버스를 타고 일단 마산 기차역까지 나가야했다. 그 때만해도 영호남을 연결하는 직행열차가 없어 마산에서 대전으로, 다시 대전에서 호남선을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다보니1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이었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자주 가지 못 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 남편 몰래 울기도 했다. 친정은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친정이 가까이 있는 동료들이 부러웠다. 몇 백 년 전 사친(思親)을 쓴 신사임당의 고향 생각하는 그 애절한 심정이 감히 짐작 간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천리 먼 고향 첩첩 산중을 언제나 가고 싶어 꿈을 꾼다고 했을까.
나 역시 본가 생각에 항상 마음이 젖어있으면서도 친정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살아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해산달이 가까워오자 큰 아이를 친정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20대에 두 아이의 엄마와 아내,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을 감당하기에는 내 능력과 체력이 역부족이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힘 든 시기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 친정집에는 오빠가 의대생이다 보니 일곱 명의 형제 모두 학생이었다. 물론 입시생도 있었다. 내 아이 하나가 가 있음으로 그들의 공부에 많은 방해가 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안심하고 맡길 곳이 거기뿐이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동생들에게 미안하다. 부모님은 딸이 송구스러워 할까봐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아이를 돌봐주셨지만 그 애로야말로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그 후에도 버거운 일이 생길 때마다 친정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많이 의지했던 것 같다.
친정 부모님들은 딸자식으로 인하여 행복한 때 보다 노심초사하신 세월이 더 많으셨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 어머니들 시대처럼 출가외인이라는 법도가 엄격했던 때도 딸들이 병이 나 아프거나 남편에게 소박을 당해 쫓겨나면 받아주었던 곳은 친정이었을 것이다.
얼마 전 딸아이가 한국에 다녀왔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 모국 나들이이었다. 이 번 여행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 묘한 기분이었다고 한다. 옛 직장동료, 친구, 지인들과 만나서 반갑고 즐거웠던가하면 ‘할머니’하고 부르며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외가가 없어져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던 모양이다. 아이들에게도 외가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조부모님이 계셔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었나 보다.
나도 6월이면 서울에 갈 일이 있어 오늘 항공표를 예약했다. 나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가는 한국행이다. 그 동안은 어머니가 계셔 서울 가는 발걸음이 늘 가벼웠는데 벌써부터 기운이 빠진다. 이순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도 연로하신 어머니 앞에서는 철없는 자식에 불과했던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 대신 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든다. 딸이 아직 미혼이다 보니 아직껏 친정어머니라는 칭호를 들어보지 못해서인지 '친정어머니'라는 단어가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없어진 친정을 남자 형제들에게 기대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내가 친정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다. 어머니 세대는 갔고 엄마 대신 엄마처럼 따뜻한 친정엄마의 자리를 만들어봐야겠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며느리가 아니겠는가. 작년에 맞아드린 며느리에게 나는 이미 친정엄마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시어머니 보다는 친정어머니가 되어주고 싶다. 이 번에 아들 부부를 위하여 흰색 바탕에 꽃분홍 매화가 활짝 핀 화사한 무늬의 이불커버를 사면서 마치 며늘아기의 친정 엄마인양 행복했다.
먼 캐나다로 혈혈단신 시집 와 옛 날 나처럼 친정이 그리운 사람에게도 친정이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 들이 밝게 이민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나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세상의 딸들은 친정이 있어서 언제나 든든하고 때로는 부모님께 불효하지 않으려고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살아간다. 우리 세대 여성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한다’는 소리를 몇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친정은 가장 가깝고 허물이 없지만 일단 시집을 가고나면 그리워하면서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친정이기도 하다.
나는 전라도 광주에서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 진해로 시집갔고 그 곳에서 직장생활까지 하다 보니 첫 아이를 낳아 돌이 가까워서야 친정집에 갔다. 진해에서 택시를 대절하거나 버스를 타고 일단 마산 기차역까지 나가야했다. 그 때만해도 영호남을 연결하는 직행열차가 없어 마산에서 대전으로, 다시 대전에서 호남선을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다보니1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이었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자주 가지 못 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 남편 몰래 울기도 했다. 친정은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친정이 가까이 있는 동료들이 부러웠다. 몇 백 년 전 사친(思親)을 쓴 신사임당의 고향 생각하는 그 애절한 심정이 감히 짐작 간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천리 먼 고향 첩첩 산중을 언제나 가고 싶어 꿈을 꾼다고 했을까.
나 역시 본가 생각에 항상 마음이 젖어있으면서도 친정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살아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해산달이 가까워오자 큰 아이를 친정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20대에 두 아이의 엄마와 아내,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을 감당하기에는 내 능력과 체력이 역부족이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힘 든 시기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 친정집에는 오빠가 의대생이다 보니 일곱 명의 형제 모두 학생이었다. 물론 입시생도 있었다. 내 아이 하나가 가 있음으로 그들의 공부에 많은 방해가 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안심하고 맡길 곳이 거기뿐이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동생들에게 미안하다. 부모님은 딸이 송구스러워 할까봐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아이를 돌봐주셨지만 그 애로야말로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그 후에도 버거운 일이 생길 때마다 친정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많이 의지했던 것 같다.
친정 부모님들은 딸자식으로 인하여 행복한 때 보다 노심초사하신 세월이 더 많으셨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 어머니들 시대처럼 출가외인이라는 법도가 엄격했던 때도 딸들이 병이 나 아프거나 남편에게 소박을 당해 쫓겨나면 받아주었던 곳은 친정이었을 것이다.
얼마 전 딸아이가 한국에 다녀왔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 모국 나들이이었다. 이 번 여행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 묘한 기분이었다고 한다. 옛 직장동료, 친구, 지인들과 만나서 반갑고 즐거웠던가하면 ‘할머니’하고 부르며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외가가 없어져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던 모양이다. 아이들에게도 외가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조부모님이 계셔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었나 보다.
나도 6월이면 서울에 갈 일이 있어 오늘 항공표를 예약했다. 나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가는 한국행이다. 그 동안은 어머니가 계셔 서울 가는 발걸음이 늘 가벼웠는데 벌써부터 기운이 빠진다. 이순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도 연로하신 어머니 앞에서는 철없는 자식에 불과했던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 대신 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든다. 딸이 아직 미혼이다 보니 아직껏 친정어머니라는 칭호를 들어보지 못해서인지 '친정어머니'라는 단어가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없어진 친정을 남자 형제들에게 기대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내가 친정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다. 어머니 세대는 갔고 엄마 대신 엄마처럼 따뜻한 친정엄마의 자리를 만들어봐야겠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며느리가 아니겠는가. 작년에 맞아드린 며느리에게 나는 이미 친정엄마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시어머니 보다는 친정어머니가 되어주고 싶다. 이 번에 아들 부부를 위하여 흰색 바탕에 꽃분홍 매화가 활짝 핀 화사한 무늬의 이불커버를 사면서 마치 며늘아기의 친정 엄마인양 행복했다.
먼 캐나다로 혈혈단신 시집 와 옛 날 나처럼 친정이 그리운 사람에게도 친정이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 들이 밝게 이민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나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심현숙의 다른 기사
(더보기.)
심현숙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