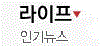
너무 비싼 집값 탓에 '부동산 난민' 된 사람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동부로 가니 기회 보였다, 낯선 땅에 적응하는 것은 숙제”
밴쿠버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부동산 난민'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사연이 CBC를 통해 소개됐다. 주인공은 존 두차우(Duchow)씨와 마리아 클라크(Clarke)씨로, 두 사람은 애초에는 밴쿠버에 집을 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집을 사려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소유할 수 없었다. 집값 상승 속도가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이들 커플은 밴쿠버 주택 시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추방'됐고, 결국 캐나다 동부 세인트존스로 눈을 돌렸다. 그곳 다운타운에 두 사람은 각각 세 개의 방과 욕실을 갖춘 집을 31만달러에 사들였다. 밴쿠버와 비교하면 100만달러 저렴한 가격이었다. 두차우씨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적정할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밴쿠버와 세인트존스의 주택 시장은 집값 면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120만달러를 투자했을 경우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평범한 아파트나 1100스퀘어피트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사는 게 다다. 하지만 세인트존스에서는 대지 1에이커에, 건물 면적 4880스퀘어피트의 단독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클라크씨는 “세인트존스의 생활비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밴쿠버에 있었다면 지금의 집을 영원히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난민'이 된 걸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CBC는 보도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












 인기기사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