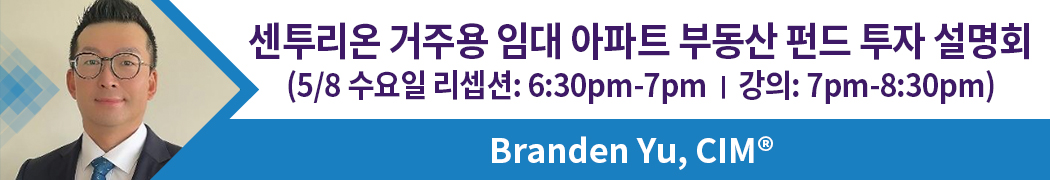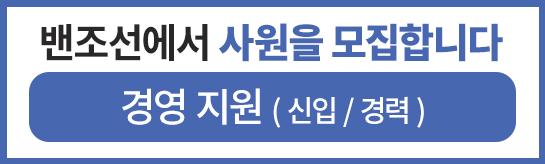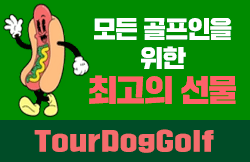1. 생명은 바다에서 와서 바다로
케이프 스캇 트레일 입구(Cape Scott Trailhead)에 닿으니 진흙덩이를 단 여성 하이커 둘이 햇볕 아래 젖은 몸을 뒤척이고 있다.
케이프 스캇 트레일에 이어 노스 코스트 트레일 6km지점까지 갔다가 하도 험해 돌아왔다는 그네들의 볼에 보람이 흥건하게 고여있다.
이어서 달려 내려오는 젊은 하이커 넷. 역시 진흙에 절인 인절미다. 알러지와 땀띠꽃이 붉게 핀 엉덩이를 내놓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그 익살에 마냥 웃을 순 없다. 일 주일 후의 우리 모습이 거기에 오버랩되어서.
데쳐온 다시마로 주먹밥을 싸먹으며 스스로 위로를 한다. 그들은 줄창 비 올 때 트레킹을 한 불운아고, 우린 딱 하루만 비를 만나는 행운을 탔으니 쟤들보다는 낫겠지. 불안을 애써 억누르며 단체사진 한 방을 찍고 트레일에 들어선다.
게시판과 표지는 애들과 왔던 6 년 전 그대로지만 마음은 다르다. 객기 넘치던 그때에 비겨 병든 몸을 끌고 온 오늘, 많이 낮아지고 많이 열려있다. 아니 더 도전적이라 할까? 생과 사의 밧줄을 양손에 잡고 58.1km를 달려간다.
질퍽거리는 숲길. 그러나 수레가 다닐 만큼 널찍한 트레일 중간중간 통나무 다리, 나무 계단을 지나 상쾌한 바람 훅 끼치는 에릭 호수(3km 지점)에 닿는다. 얌전하게 단장된 열두 개의 캠프 패드가 있으나 아무도 묵지 않는다. 경치 좋은 산 조세프 베이 캠프장에 하이커들이 몰려든 탓이리라.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피셔맨 리버(9.3km 지점)에 이르면 다리에 걸터앉아 쉴 수도 있고 물도 보충할 수 있다. 밤길 가다 야영을 하고팠던 강가 모래둑. 어린 자식들을 물 마시러 오는 곰에게 아침식사거리로 내줄 일 있느냐던 아들애의 핀잔이 고스란히 피어난다. 보송보송한 보드왁이 한참 이어진다. 질퍽한 늪지에 노오란 수련이 방싯거리고 길 바쁜 나그네를 유혹한다. 들어가 사진 한 컷을 찍고 나서는데 길섶에 녹슨 농기구와 귀퉁이 떨어져 나간 주전자가 나뒹군다. 1786년부터 덴마크인들이 들어와 살던 흔적이다. 옛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오늘을 터덜터덜 걷는 우리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얼핏 숲 속에 검은 것이 휙 지나간다. 단위 면적당 곰과 쿠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는 케이프 스캇 주립공원의 명성(?)답게 드디어 최상위 포식자와 상면하려는 찰나다. 유난히 곰의 습격이 잦은 해라 머리털이 쭈삣 선다. 곰벨을 울리고 하이킹 스틱을 툭툭 치며 소음을 내기 시작한다. 숫자를 셋까지밖에 세지 못하는 곰에게 일행이 많은 것처럼 허세 부리느라. 다행히 곰은 내 열팍한 속임수에 물러가 숲은 다시 평정을 되찾는다.
13.1km 지점에 삼거리가 나온다. 직진하면 노스 코스트 트레일이 시작하는 니센 바이트. 왼쪽 길을 택하면 한센 라군과 넬스 바이트로 이어지는 케이프 스캇 트레일.
니센 바이트(Nissen Bight,노스 코스트 트레일의 서쪽 기점)로 드는 길이 좁아지며 살풋 내려간다. 2km 정도 진행하는 동안 몇 개의 리본이 보인다. 초기 정착자들의 유적들이 있는 곳- 최초의 교사, 크리슨튼 무덤 등-으로 안내한다. 그러나 갈 길이 바쁜 우린 곧장 GO! 캐나다 와서 산 지 16년이 되었어도 버리지 못하는 ‘빨리빨리’ 근성.
파도소리 흥건하고 바닷내 훅 끼치는 해변에 이르러서 어깨에 딱지처럼 얹힌 배낭을 내던지고픈 벗들을 재촉해 1 km서쪽에 있는 노스 코스트 트레일 입구로 간다. 그곳에 물이 있고, 오늘 한 뼘이라도 더 가 두면 내일의 18km 발품이 조금 덜어지겠기에.
동동쪽 내 조국이 있는 곳에서부터 떠밀려왔을 나무둥치에 무거운 배낭을 벗어두고 묵직한 등산화를 벗는다.
와, 해방이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곳. 자연과 사람이 하나인 곳에서 고된 마음 뭉게구름에 얹어두고 한가를 만끽한다.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 밀려와 세속의 청녹 벗겨내면 빈 마음에 파도 성큼 들아와 순식간에 바다가 되어버린다. 바다와 내가, 하늘과 바다가, 바다와 숲이 하나가 되는 법열. 이 바람 품어가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힌 세상에 풀어내면 그곳에도 열락의 파도 넘실거릴까.
물을 찾아 나섰다가 부표에 그려진 화살표 방향을 잘못 보아 산길에 접어 들었다. 가볍게 생각해서 샌들을 신고 나섰는데 길이 장난이 아니다. 10cm도 못 되는 폭에 나무뿌리, 진흙이 엉켜있어 지옥 가는 길 같다. 휴, 이런 길을 엿새 간 줄차게 달려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산길은 자꾸 높은 데로만 치닫고 물소리는 멀어진다. 아니다 싶어 돌아오다가 역시 물길을 잘못 든 일손 님을 만난다. 여정의 험난함을 탄식하며 내려오다 유기물이 녹아 카키색 된 물을 정수해 들고 돌아온다.
한 편에서는 텐트를 치고, 또 한 팀은 저녁 식사 준비, 다른 한 쪽에서는 모닥불을 피운다.
하늘은 먹구름을 꾸역꾸역 토해놓고 해는 붉은 드레스 자락을 길게 늘어뜨리며 퇴장을 한다. 조신하여 결코 몸매를 다 드러내지 않는 노을. 마치 튿어진 솔기 틈새로 살짝살짝 보이는 여인의 속옷 같다. 그 매혹적인 밤에 어찌 잠들 수 있으랴. 그토록 그립던 파도소리에 젖어 밤새 모닥불 곁을 지키리라.
노을을 냉큼 삼켜버린 하늘이 진한 먹물통이 되어간다. 험난한 내일의 여정을 예고라도 하듯이.
깜빡 잠이 든 신새벽,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은 성싶다. 낮 동안 인간이 뿌려놓은 거짓말을 세탁하는 걸까, 문명이 쏟아놓은 오물을 정화하는 걸까. 바다에서 온 생명이 바다로 돌아가는 뚜벅이 걸음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케이프 스캇 트레일에 이어 노스 코스트 트레일 6km지점까지 갔다가 하도 험해 돌아왔다는 그네들의 볼에 보람이 흥건하게 고여있다.
이어서 달려 내려오는 젊은 하이커 넷. 역시 진흙에 절인 인절미다. 알러지와 땀띠꽃이 붉게 핀 엉덩이를 내놓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그 익살에 마냥 웃을 순 없다. 일 주일 후의 우리 모습이 거기에 오버랩되어서.
데쳐온 다시마로 주먹밥을 싸먹으며 스스로 위로를 한다. 그들은 줄창 비 올 때 트레킹을 한 불운아고, 우린 딱 하루만 비를 만나는 행운을 탔으니 쟤들보다는 낫겠지. 불안을 애써 억누르며 단체사진 한 방을 찍고 트레일에 들어선다.
게시판과 표지는 애들과 왔던 6 년 전 그대로지만 마음은 다르다. 객기 넘치던 그때에 비겨 병든 몸을 끌고 온 오늘, 많이 낮아지고 많이 열려있다. 아니 더 도전적이라 할까? 생과 사의 밧줄을 양손에 잡고 58.1km를 달려간다.
질퍽거리는 숲길. 그러나 수레가 다닐 만큼 널찍한 트레일 중간중간 통나무 다리, 나무 계단을 지나 상쾌한 바람 훅 끼치는 에릭 호수(3km 지점)에 닿는다. 얌전하게 단장된 열두 개의 캠프 패드가 있으나 아무도 묵지 않는다. 경치 좋은 산 조세프 베이 캠프장에 하이커들이 몰려든 탓이리라.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피셔맨 리버(9.3km 지점)에 이르면 다리에 걸터앉아 쉴 수도 있고 물도 보충할 수 있다. 밤길 가다 야영을 하고팠던 강가 모래둑. 어린 자식들을 물 마시러 오는 곰에게 아침식사거리로 내줄 일 있느냐던 아들애의 핀잔이 고스란히 피어난다. 보송보송한 보드왁이 한참 이어진다. 질퍽한 늪지에 노오란 수련이 방싯거리고 길 바쁜 나그네를 유혹한다. 들어가 사진 한 컷을 찍고 나서는데 길섶에 녹슨 농기구와 귀퉁이 떨어져 나간 주전자가 나뒹군다. 1786년부터 덴마크인들이 들어와 살던 흔적이다. 옛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오늘을 터덜터덜 걷는 우리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얼핏 숲 속에 검은 것이 휙 지나간다. 단위 면적당 곰과 쿠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는 케이프 스캇 주립공원의 명성(?)답게 드디어 최상위 포식자와 상면하려는 찰나다. 유난히 곰의 습격이 잦은 해라 머리털이 쭈삣 선다. 곰벨을 울리고 하이킹 스틱을 툭툭 치며 소음을 내기 시작한다. 숫자를 셋까지밖에 세지 못하는 곰에게 일행이 많은 것처럼 허세 부리느라. 다행히 곰은 내 열팍한 속임수에 물러가 숲은 다시 평정을 되찾는다.
13.1km 지점에 삼거리가 나온다. 직진하면 노스 코스트 트레일이 시작하는 니센 바이트. 왼쪽 길을 택하면 한센 라군과 넬스 바이트로 이어지는 케이프 스캇 트레일.
니센 바이트(Nissen Bight,노스 코스트 트레일의 서쪽 기점)로 드는 길이 좁아지며 살풋 내려간다. 2km 정도 진행하는 동안 몇 개의 리본이 보인다. 초기 정착자들의 유적들이 있는 곳- 최초의 교사, 크리슨튼 무덤 등-으로 안내한다. 그러나 갈 길이 바쁜 우린 곧장 GO! 캐나다 와서 산 지 16년이 되었어도 버리지 못하는 ‘빨리빨리’ 근성.
파도소리 흥건하고 바닷내 훅 끼치는 해변에 이르러서 어깨에 딱지처럼 얹힌 배낭을 내던지고픈 벗들을 재촉해 1 km서쪽에 있는 노스 코스트 트레일 입구로 간다. 그곳에 물이 있고, 오늘 한 뼘이라도 더 가 두면 내일의 18km 발품이 조금 덜어지겠기에.
동동쪽 내 조국이 있는 곳에서부터 떠밀려왔을 나무둥치에 무거운 배낭을 벗어두고 묵직한 등산화를 벗는다.
와, 해방이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곳. 자연과 사람이 하나인 곳에서 고된 마음 뭉게구름에 얹어두고 한가를 만끽한다.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 밀려와 세속의 청녹 벗겨내면 빈 마음에 파도 성큼 들아와 순식간에 바다가 되어버린다. 바다와 내가, 하늘과 바다가, 바다와 숲이 하나가 되는 법열. 이 바람 품어가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힌 세상에 풀어내면 그곳에도 열락의 파도 넘실거릴까.
물을 찾아 나섰다가 부표에 그려진 화살표 방향을 잘못 보아 산길에 접어 들었다. 가볍게 생각해서 샌들을 신고 나섰는데 길이 장난이 아니다. 10cm도 못 되는 폭에 나무뿌리, 진흙이 엉켜있어 지옥 가는 길 같다. 휴, 이런 길을 엿새 간 줄차게 달려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산길은 자꾸 높은 데로만 치닫고 물소리는 멀어진다. 아니다 싶어 돌아오다가 역시 물길을 잘못 든 일손 님을 만난다. 여정의 험난함을 탄식하며 내려오다 유기물이 녹아 카키색 된 물을 정수해 들고 돌아온다.
한 편에서는 텐트를 치고, 또 한 팀은 저녁 식사 준비, 다른 한 쪽에서는 모닥불을 피운다.
하늘은 먹구름을 꾸역꾸역 토해놓고 해는 붉은 드레스 자락을 길게 늘어뜨리며 퇴장을 한다. 조신하여 결코 몸매를 다 드러내지 않는 노을. 마치 튿어진 솔기 틈새로 살짝살짝 보이는 여인의 속옷 같다. 그 매혹적인 밤에 어찌 잠들 수 있으랴. 그토록 그립던 파도소리에 젖어 밤새 모닥불 곁을 지키리라.
노을을 냉큼 삼켜버린 하늘이 진한 먹물통이 되어간다. 험난한 내일의 여정을 예고라도 하듯이.
깜빡 잠이 든 신새벽,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은 성싶다. 낮 동안 인간이 뿌려놓은 거짓말을 세탁하는 걸까, 문명이 쏟아놓은 오물을 정화하는 걸까. 바다에서 온 생명이 바다로 돌아가는 뚜벅이 걸음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글 김해영, 사진 백성현의 다른 기사
(더보기.)
글 김해영, 사진 백성현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