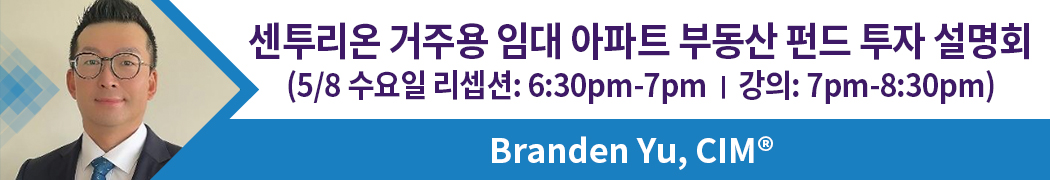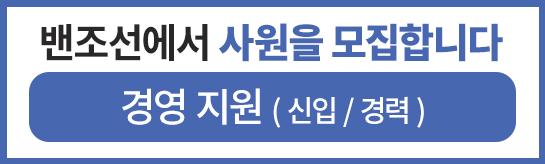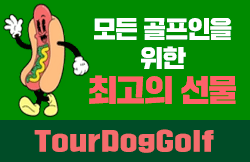이른바 직배, 그러니까 미국 영화사들이 한국 극장에 영화를 배급하는 일까지 도맡아버리기 전에는 많은 한국영화사들이 한국영화를 만드는 일보다는 미국영화를 수입해서 한국극장에 배급하는 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일은 우선 흥행이 될만한 영화를 골라 되도록 싼 가격에 사오는 수완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중요한 일이 영화의 제목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거나 혹은 영어발음 그대로 쓰기도 했지만, 때로 그러기에 너무 생소한 경우에는 아예 전혀 다른 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 바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가 그 경우입니다.
이 영화의 원 제목은 <Bonnie and Clyde> 입니다. 미국에 실존했던 인물들의 이름인데 미국사람들에게는 무척 유명한 이름이지만 우리는 알 길이 없는 이름이어서 그대로 쓰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은 일본에서 만든 이름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이 영화와 아주 비슷한 경우로 <내일을 향해 쏴라>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Butch Cassidy And The Sundance Kid> 인데 이 역시 미국의 실존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두 영화에 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재미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두 영화가 다 유명한 강도들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한 영화에는 <내일>은 없고 다른 영화에는 <내일>을 쏩니다. 뭐 그게 그거지요.
<내일>을 쏘는 영화도 무척 좋은 영화입니다. 과장표현이 넘치는 시절이어서 그저 무척 좋다고 하니까 별로 좋다는 느낌이 안 드는군요. 그냥 엄청나게 좋은 영화라고 해둘까요? 여하튼 안 보셨으면 꼭 보십시오. <폴 뉴만>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함께 나온다는 사실 하나로도 볼 까닭은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지난번에 이야기한대로 이른바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대표작입니다.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강도행각을 벌이다가 처참하게 총 맞아 죽는 이야기입니다. 아서 펜(Arthur Penn) 이 감독했으며 <워렌 비티(Warren Beatty)>, <페이 더너웨이(Faye Dunaway)>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워렌 비티>는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가운데 연기 뿐이 아니라 감독, 제작 등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몇 있는데 언뜻 생각나는 사람으로 <크린트 이스트우드>, <로버트 레드포드>가 있는데 <워렌 비티>는 그 원조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뉴 아메리카 시네마>의 대표작 3개 가운데 가장 재미있습니다. 일단 스토리가 강도이야기이니까요. 총도 심심치 않게 쏘고 추격 신 같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총을 맞고 죽어가는 장면은 명장면 중의 하나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척 잔인하고 섬뜩하기조차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총을 많이 맞고 죽어갑니다. 속된 말로 벌집이 되지요.
감독은 이 장면을 일부러 잔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장면을 월남전과 연결시켜 생각했는데 감독도 그 생각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영화는 이야기는 1930년대의 젊은 남녀의 강도행각이지만 그 속에 이른바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범죄자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 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그 범죄자들과 함께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강도 편을 들고 있고 이른바 공권력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감정이입은 물론 충분히 계산된 것으로 사실 영화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이렇게 강도, 범법자들을 상쾌하게 다룬 영화는 없었습니다. 물론 범법자 편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영화는 있었지만 그 경우 대부분 억울함이나 동정심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강도들은 참으로 <쿨>합니다. 닮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멋진 범법자들은 뒤에 <대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것은 기존 사회질서를 흔들려는 불순한 음모였고, 기존가치에 대한 반항이며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미국 젊은이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항의 시대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교육방송 피디(PD)협회장을 역임했다.
2001년 미국 Chapman University Film School MFA 과정을 마쳤고
서울예술대학 겸임교수를 지냈다
| 칼럼니스트: 배인수 | Tel:604-430-2992 | Email: bainsoo@yahoo.com |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컬럼
(더보기.)
밴쿠버 조선의 다른 컬럼
(더보기.)
|

|
|
|